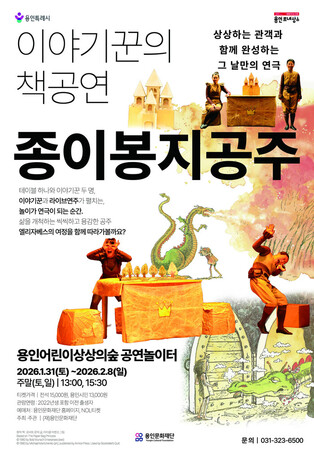[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리스로 빌린 물건을 제때 못 받아도 소비자는 리스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리스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리스업체와 B씨는 2016년 1월 어린이집에서 활용될 교육 콘텐츠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가 매달 600만원씩, 총 36개월간 임대료를 A리스업체에 지급하고, A리스업체는 사전 계약을 맺은 C업체의 교육 콘텐츠를 B씨에게 공급하는 내용이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교육 콘텐츠 소유권은 B씨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콘텐츠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B씨가 C업체에 직접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임대료 입금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C업체의 콘텐츠는 B씨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개선 요구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약을 해지했고, A리스업체는 B씨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리스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콘텐츠의 사후관리 불만 등으로 임대료 입금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전 약정을 근거로 B씨가 A리스업체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결함 보수 불이행 등 A리스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계약자가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을 근거로 B씨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금융리스 계약에서 리스업자는 계약자가 렌털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 공급할 의무는 없다며 A 리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심이 B씨 승소 근거로 제시한 약정은 결함 보수 의무에 관한 것이며 렌탈 물건의 공급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리스 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리스업체가 어린이집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리스업체와 B씨는 2016년 1월 어린이집에서 활용될 교육 콘텐츠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가 매달 600만원씩, 총 36개월간 임대료를 A리스업체에 지급하고, A리스업체는 사전 계약을 맺은 C업체의 교육 콘텐츠를 B씨에게 공급하는 내용이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교육 콘텐츠 소유권은 B씨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콘텐츠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B씨가 C업체에 직접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임대료 입금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C업체의 콘텐츠는 B씨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개선 요구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약을 해지했고, A리스업체는 B씨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리스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콘텐츠의 사후관리 불만 등으로 임대료 입금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전 약정을 근거로 B씨가 A리스업체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결함 보수 불이행 등 A리스업체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계약자가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을 근거로 B씨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금융리스 계약에서 리스업자는 계약자가 렌털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 공급할 의무는 없다며 A 리스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원심이 B씨 승소 근거로 제시한 약정은 결함 보수 의무에 관한 것이며 렌탈 물건의 공급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리스 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