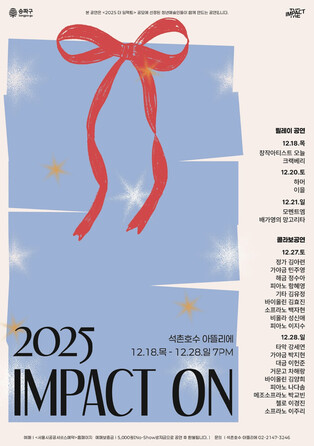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13) 7년 가꾼 순정의 꽃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하니 예쁜 여자아이처럼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짙은 안개속을 헤집으며, 이만성의 코앞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 7년전의 김종선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친형제 못지 않게 가까이 지냈던 막역한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으니….
“음, 그때의 그 얼굴 떠올랐어. 김종선, 그 사람은 둘도 없는 나의 친한 친구였다구.
‘영재의숙’ 1년 후배였지만, 우리 두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절친한 사이였지. 헤어진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군, 내가 객지에서 정신 없이 쫓기는 생활을 하다보니 연락도 취하지 못했어.
그런데, 아가씨가 종선의 여동생이 된다구?”
감상적인 목소리로, 소년시절의 동화 같은 회고담을 늘어놓다 이만성은 갑자기 생각난 듯, 정색을 하며 물었다.
“네, 제가 바로 여동생이에요”
들뜬 목소리로 김영선이 대꾸했다.
“그럴수가…꿈도 아니고, 아가씨가 종선군의 누이동생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군! 그리고, 뜻하지 않게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이만성은 잠꼬대하듯 중얼거렸다. 김종선과 헤어진 것이 엊그제 일 같건만, 어느덧 춘풍추우(春風秋雨) 7개 성상(星霜)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인간사 그토록 허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만성이 ‘영재의숙’ 6학년 재학당시 종선이는 5학년이었고, 영선이는 3학년이었지? 종선이와는 워낙 친숙한 사이였으므로, 그때의 얼굴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여자애라고는 해도 젖비린내 나는 영선이어서, 그녀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7년전 얼굴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전혀 가늠이 되지를 않는다.
“아가씨 이름이 영선이라고? 그래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어디를 가는 길인가?”
“어디를 가는 길이 아니고 여기까지 왔다구요. 선생님, 아니 오빠를 만나 뵙고 싶어서, 만사 제쳐놓고 단숨에 뛰어온거란 말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종선이가 보내서 온건가? 내가 한남마을에 왔다가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구…?”
“우리 오빠의 심부름이 아니고, 제가 그냥 뛰어왔다니까요. 오빠께서 저녁때 영재의숙에서 야학강사로 나오시게 되었다면서, 취임인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2백여명의 학생들 속에 끼여있었거든요”
“아, 그랬어? 나는 모르고 있었지, 그러면 앞으로 자주 교실에서 만나게 되겠군! 그렇다면 오늘밤 이렇게 뒤쫓아오지 않아도 될 것을….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어? 영재의숙에서 아는체 했더라면 좋았을 것 아냐”
“오빠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7년 동안 오매불망 하루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단 말예요. 7년 만에 뵙게 된 오빠를 어떻게 놓쳐버릴 수 있겠어요? 고정관 선생님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보고, 한참 기다리고 있었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야 맞나요?”
“그랬었나?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은밀히 만나서 꼭 전해야겠다는 비밀스런 사연이라도 있었다면 모르지만 귀신이 나오는 깊은 밤에 혼자서 모험할 필요 없을 텐데 말야”
“그게 왜 모험이에요? 7년 동안 참으며 기다린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7년 동안 기다리다니… 왜 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면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다. 머리가 홱 돌아버린 정신병환자가 아닐진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여자애라면 어떻게 괴상망측한 소리를 지껄여댈 수 있단 말인가?
“제 얘기 이해가 안되시나보죠? 사랑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사모했다는 말로 바꿔야 될까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 금방 대성통곡이라도 할 것처럼 복받치는 가락으로 쏘아붙였다. 당장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는 그녀의 코앞으로 이만성이 성큼 다가섰다.
독수리가 병아리 채가듯이 확 낚아채려는 순간, 벼락같이 그녀가 육탄공격을 퍼부었다. 역습을 당한 이만성은 속수무책, 눈 깜짝하는 사이 함정에 빠진 몸이 되고 말았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하니 예쁜 여자아이처럼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짙은 안개속을 헤집으며, 이만성의 코앞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 7년전의 김종선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친형제 못지 않게 가까이 지냈던 막역한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으니….
“음, 그때의 그 얼굴 떠올랐어. 김종선, 그 사람은 둘도 없는 나의 친한 친구였다구.
‘영재의숙’ 1년 후배였지만, 우리 두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절친한 사이였지. 헤어진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군, 내가 객지에서 정신 없이 쫓기는 생활을 하다보니 연락도 취하지 못했어.
그런데, 아가씨가 종선의 여동생이 된다구?”
감상적인 목소리로, 소년시절의 동화 같은 회고담을 늘어놓다 이만성은 갑자기 생각난 듯, 정색을 하며 물었다.
“네, 제가 바로 여동생이에요”
들뜬 목소리로 김영선이 대꾸했다.
“그럴수가…꿈도 아니고, 아가씨가 종선군의 누이동생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군! 그리고, 뜻하지 않게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이만성은 잠꼬대하듯 중얼거렸다. 김종선과 헤어진 것이 엊그제 일 같건만, 어느덧 춘풍추우(春風秋雨) 7개 성상(星霜)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인간사 그토록 허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만성이 ‘영재의숙’ 6학년 재학당시 종선이는 5학년이었고, 영선이는 3학년이었지? 종선이와는 워낙 친숙한 사이였으므로, 그때의 얼굴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여자애라고는 해도 젖비린내 나는 영선이어서, 그녀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다. 7년전 얼굴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전혀 가늠이 되지를 않는다.
“아가씨 이름이 영선이라고? 그래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어디를 가는 길인가?”
“어디를 가는 길이 아니고 여기까지 왔다구요. 선생님, 아니 오빠를 만나 뵙고 싶어서, 만사 제쳐놓고 단숨에 뛰어온거란 말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종선이가 보내서 온건가? 내가 한남마을에 왔다가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구…?”
“우리 오빠의 심부름이 아니고, 제가 그냥 뛰어왔다니까요. 오빠께서 저녁때 영재의숙에서 야학강사로 나오시게 되었다면서, 취임인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2백여명의 학생들 속에 끼여있었거든요”
“아, 그랬어? 나는 모르고 있었지, 그러면 앞으로 자주 교실에서 만나게 되겠군! 그렇다면 오늘밤 이렇게 뒤쫓아오지 않아도 될 것을….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어? 영재의숙에서 아는체 했더라면 좋았을 것 아냐”
“오빠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7년 동안 오매불망 하루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단 말예요. 7년 만에 뵙게 된 오빠를 어떻게 놓쳐버릴 수 있겠어요? 고정관 선생님과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걸보고, 한참 기다리고 있었죠.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야 맞나요?”
“그랬었나?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은밀히 만나서 꼭 전해야겠다는 비밀스런 사연이라도 있었다면 모르지만 귀신이 나오는 깊은 밤에 혼자서 모험할 필요 없을 텐데 말야”
“그게 왜 모험이에요? 7년 동안 참으며 기다린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7년 동안 기다리다니… 왜 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면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다. 머리가 홱 돌아버린 정신병환자가 아닐진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여자애라면 어떻게 괴상망측한 소리를 지껄여댈 수 있단 말인가?
“제 얘기 이해가 안되시나보죠? 사랑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사모했다는 말로 바꿔야 될까요?”
울음이 섞인 목소리, 금방 대성통곡이라도 할 것처럼 복받치는 가락으로 쏘아붙였다. 당장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는 그녀의 코앞으로 이만성이 성큼 다가섰다.
독수리가 병아리 채가듯이 확 낚아채려는 순간, 벼락같이 그녀가 육탄공격을 퍼부었다. 역습을 당한 이만성은 속수무책, 눈 깜짝하는 사이 함정에 빠진 몸이 되고 말았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