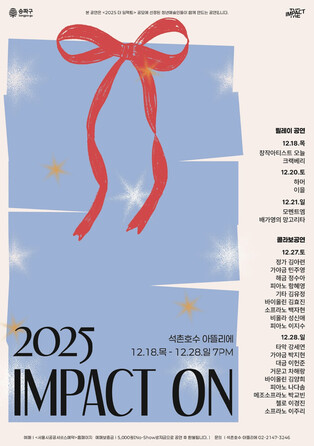권위적이고 전체적인 조직에서는 흔히 ‘예스 맨’들이 양산되기 쉽다.
상하간의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사나 선배의 명령에 후배의 복종이 있을 뿐이다. 하기 싫은 일도 예스, 가기 싫은 술자리도 예스. 속으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어찌 소화가 될 것인가. 소화불량에 걸리고 겉으로 내색은 못하고, 이른바 ‘화병’이란 게 생겨난다.
물론 조직도 상사도 이런 순종적인 사원을 그리 반기지만은 않는다. 시키는 일은 그럭저럭 하는데 알아서 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처럼 새로운 것, 반짝이는 것이 칭송받게 된 시대에는 ‘노 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노 맨’… 일견 멋있어 보인다. 상하 가리지 않고 자기 할 말은 할 줄 아는 사원, 줏대 있고 의식 있는 사원, 능력이 출중한 사원….
하지만 ‘노 맨’은 잘난체, 아는체, 싸가지 없는 사원으로 통하기도 쉽다. 요즘같이 각박한 때 자칫 왕따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래서 ‘예스 벗 노’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은 서로간에 (-)전류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방이 가장 잘 이해되는 경우는, 1)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때이며, 2) 나도 상대방같은 말과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을 때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부딪혔을 때, 한마디로 ‘노’를 접했을 때, 사람은 정신적 당황에 잠깐 빠지게 된다.
물론,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서로간의 약속(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지만, 다르다는 사실이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예스 벗 노’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간의 대화에서 나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은 서로간에 (+)전류를 만든다. 위와 똑같은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난다.
그래서 내가 ‘노’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사고 속에서 ‘예스’라는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멘트를 뱉은 다음에 ‘노’로 이어지는 멘트를 날린다면, 앞의 (+)전류에 의해 뒤의 (-)전류는 충분히 중성화 될 수 있고, 나는 나의 실속을 차릴 수 있다.
‘노’를 말한다는 것은 내 주장을 쫓아가는 것이며,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여러가지로 인해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나의 이익을, 실속을 잊어버리게 될 때, ‘예스 벗 노’를 생각하라.
아니면 말고… 준사마
위 글은 6월1일자 시민일보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상하간의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사나 선배의 명령에 후배의 복종이 있을 뿐이다. 하기 싫은 일도 예스, 가기 싫은 술자리도 예스. 속으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어찌 소화가 될 것인가. 소화불량에 걸리고 겉으로 내색은 못하고, 이른바 ‘화병’이란 게 생겨난다.
물론 조직도 상사도 이런 순종적인 사원을 그리 반기지만은 않는다. 시키는 일은 그럭저럭 하는데 알아서 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처럼 새로운 것, 반짝이는 것이 칭송받게 된 시대에는 ‘노 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노 맨’… 일견 멋있어 보인다. 상하 가리지 않고 자기 할 말은 할 줄 아는 사원, 줏대 있고 의식 있는 사원, 능력이 출중한 사원….
하지만 ‘노 맨’은 잘난체, 아는체, 싸가지 없는 사원으로 통하기도 쉽다. 요즘같이 각박한 때 자칫 왕따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래서 ‘예스 벗 노’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나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은 서로간에 (-)전류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상대방이 가장 잘 이해되는 경우는, 1)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때이며, 2) 나도 상대방같은 말과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을 때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충족되지 않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부딪혔을 때, 한마디로 ‘노’를 접했을 때, 사람은 정신적 당황에 잠깐 빠지게 된다.
물론,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은 당연하다는 서로간의 약속(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지만, 다르다는 사실이 (-)에너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예스 벗 노’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간의 대화에서 나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은 서로간에 (+)전류를 만든다. 위와 똑같은 두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난다.
그래서 내가 ‘노’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사고 속에서 ‘예스’라는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멘트를 뱉은 다음에 ‘노’로 이어지는 멘트를 날린다면, 앞의 (+)전류에 의해 뒤의 (-)전류는 충분히 중성화 될 수 있고, 나는 나의 실속을 차릴 수 있다.
‘노’를 말한다는 것은 내 주장을 쫓아가는 것이며,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여러가지로 인해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나의 이익을, 실속을 잊어버리게 될 때, ‘예스 벗 노’를 생각하라.
아니면 말고… 준사마
위 글은 6월1일자 시민일보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