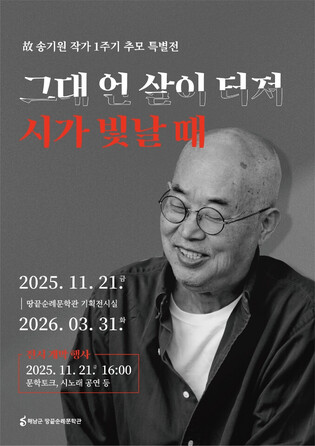{ILINK:1}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이 봉기 직전까지 갔다. 1987년 6.29선언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민주화 데모 직전의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선언으로도 분노한 시민들의 봉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경찰도 시민봉기를 막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탄생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가 15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후속정책 발표직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던 열린우리당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신당은 동력을 잃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생명도 부동산 정책과 함께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열린우리당에서 말하는 통합신당보다는 완전 새로운 분위기의 신당 건설이 맞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는 이같은 관측과 전망을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만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언론인 출신의 그가 바라본 관점이라면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 그동안 참여정부의 말만 믿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만 기다리면 집을 구입하지 않았던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더구나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면할 수 없다”는 청와대 경고 메시지를 쓴 책임자인 이백만 홍보수석이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 부인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그가 무려 24억원이라는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소식까지 접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허탈감이 언제 분노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특히 이 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54평형 아파트(분양가 10억8000만원)의 중도금을 내기 위해 총 8억4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대출금의 순 이자만도 월 406만원(연리 5.8% 가정시)이나 된다.
그런데도 이 수석은 계약금 1억 1000만원만 저축해 둔 돈으로 냈을 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대출로 해결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 수석은 집값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는 “아직 집을 살 때가 아니다”는 식의 홍보를 했으니, 어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는가.
사실 이날 발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믿을 수 없다.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장기과제로 미뤄지는 등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으로 지적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금융규제를 강화해 주택 실수요자들만 집을 구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실제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고분양가 규제방안은 이번 11.15 대책에서 장기적 과제로 넘겨졌다.
나아가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킨 건설업체의 택지비나 건축비 부풀리기 등의 관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건설업체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정부가 보장하고, 이에 따른 고분양가 문제를 당분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줄을 죄어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전략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자금 동원력이 취약한 사람들은 당장 주택 구입이 힘들어지는 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집값을 급등시키는 역효과를 낼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만일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정말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과연 어떤 지혜로 막아야할지, 그리고 처방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나 않았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탄생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가 15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후속정책 발표직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던 열린우리당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 중심의 통합신당은 동력을 잃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생명도 부동산 정책과 함께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열린우리당에서 말하는 통합신당보다는 완전 새로운 분위기의 신당 건설이 맞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는 이같은 관측과 전망을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만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언론인 출신의 그가 바라본 관점이라면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 그동안 참여정부의 말만 믿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만 기다리면 집을 구입하지 않았던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더구나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면할 수 없다”는 청와대 경고 메시지를 쓴 책임자인 이백만 홍보수석이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 부인 명의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그가 무려 24억원이라는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소식까지 접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허탈감이 언제 분노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특히 이 수석은 강남구 역삼동 54평형 아파트(분양가 10억8000만원)의 중도금을 내기 위해 총 8억4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대출금의 순 이자만도 월 406만원(연리 5.8% 가정시)이나 된다.
그런데도 이 수석은 계약금 1억 1000만원만 저축해 둔 돈으로 냈을 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대출로 해결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이 수석은 집값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는 “아직 집을 살 때가 아니다”는 식의 홍보를 했으니, 어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는가.
사실 이날 발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믿을 수 없다.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장기과제로 미뤄지는 등 최근 집값 상승의 근원으로 지적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금융규제를 강화해 주택 실수요자들만 집을 구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실제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고분양가 규제방안은 이번 11.15 대책에서 장기적 과제로 넘겨졌다.
나아가 고분양가 논란을 촉발시킨 건설업체의 택지비나 건축비 부풀리기 등의 관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건설업체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정부가 보장하고, 이에 따른 고분양가 문제를 당분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돈줄을 죄어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전략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자금 동원력이 취약한 사람들은 당장 주택 구입이 힘들어지는 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집값을 급등시키는 역효과를 낼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만일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정말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과연 어떤 지혜로 막아야할지, 그리고 처방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나 않았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