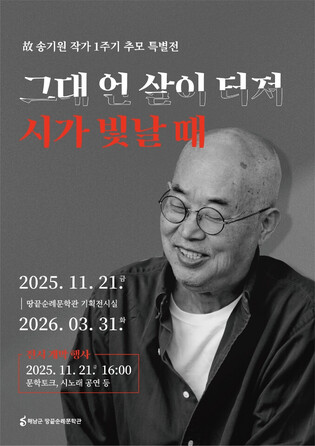{ILINK:1} 서울시의 ‘노점특별대책’과 ‘현장시정추진단계획’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노점특별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물론 둘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 계획 사이에 뭔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왜일까?
우선 노점특별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의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자치구별로 1곳의 노점시범거리를 선정한다.
자율위원회는 노점 배치, 영업시간, 취급 품목 등 제반 준수사항을 정하게 된다.
현재 차량도로는 그런대로 넓은 편인 데 비해, 사람이 걷는 보행로는 턱없이 좁기만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타계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고, 이런 면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마땅히 환영받을만한 사안이다.
특히 시내 가판대 노점상 중 28명이 종합 부동산세 납부기준인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 중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만 해도 무려 7명이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이어서 서울시의 노점상특별대책을 나무라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억 이상~4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390명, 4억 이상~6억원 미만은 93명, 6억 이상~10억원 미만은 21명, 10억원 이상은 7명에 달한다고 하니 노점상을 정비할만한 충분한 명분이 생긴 셈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 만큼은 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은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계획’ 때문이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최근 부서별 강제할당에 의거한 ‘3% 무능공무원 퇴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13일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을 좀먹고 있는 극소수의 부적격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를 거부한다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결과 고육지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3% 추가 전보인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3%라는 규모를 추가해 인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문제 있는 직원들을 직접 골라내야 하는 실·국·과장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자칫 온정주의에 치우쳐 모처럼의 기회를 상실치 않게 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서장이 단지 자신과 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권을 전횡하거나 정작 선별돼야 할 대상자들을 감싸고 도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오 시장의 정책은 한번 시도해볼만한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야 ‘철밥통’이라는 인식하에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른바 ‘무능공무원 퇴출제’라고 불리는 ‘현장시정추진단’을 통해 노점을 단속하게 하고 단속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처럼 ‘자신의 손으로 퇴출한 사회적 약자를 통해 또 다른 약자를 관리통제하게 하면서 상호간 사회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사실 퇴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이 살수만 있다면, 노점상 퇴출에 더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만일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짠 것이라면 비열한 것이다.
특히 대책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당사들인 노점상들이나 공무원들과 사전 대화 한 번 나눈 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설득하면 충분히 이해 할 수도 있는 대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같은 민주적 절차를 모두 생략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나 계획이라도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오 시장이 미리 ‘노점특별대책’과 ‘현장시정추진단계획’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두 가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의심을 받을만한 사안이 돌출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것은 서울시다. 따라서 이런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 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 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노점특별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물론 둘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이 두 가지 계획 사이에 뭔가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왜일까?
우선 노점특별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의원,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자치구별로 1곳의 노점시범거리를 선정한다.
자율위원회는 노점 배치, 영업시간, 취급 품목 등 제반 준수사항을 정하게 된다.
현재 차량도로는 그런대로 넓은 편인 데 비해, 사람이 걷는 보행로는 턱없이 좁기만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타계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고, 이런 면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마땅히 환영받을만한 사안이다.
특히 시내 가판대 노점상 중 28명이 종합 부동산세 납부기준인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 중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노점상만 해도 무려 7명이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이어서 서울시의 노점상특별대책을 나무라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억 이상~4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한 노점상은 390명, 4억 이상~6억원 미만은 93명, 6억 이상~10억원 미만은 21명, 10억원 이상은 7명에 달한다고 하니 노점상을 정비할만한 충분한 명분이 생긴 셈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 만큼은 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은 서울시의 ‘현장시정추진단 운영계획’ 때문이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최근 부서별 강제할당에 의거한 ‘3% 무능공무원 퇴출’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13일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을 좀먹고 있는 극소수의 부적격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를 거부한다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결과 고육지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3% 추가 전보인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3%라는 규모를 추가해 인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문제 있는 직원들을 직접 골라내야 하는 실·국·과장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이 자칫 온정주의에 치우쳐 모처럼의 기회를 상실치 않게 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서장이 단지 자신과 친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권을 전횡하거나 정작 선별돼야 할 대상자들을 감싸고 도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오 시장의 정책은 한번 시도해볼만한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야 ‘철밥통’이라는 인식하에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른바 ‘무능공무원 퇴출제’라고 불리는 ‘현장시정추진단’을 통해 노점을 단속하게 하고 단속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처럼 ‘자신의 손으로 퇴출한 사회적 약자를 통해 또 다른 약자를 관리통제하게 하면서 상호간 사회적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사실 퇴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이 살수만 있다면, 노점상 퇴출에 더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만일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짠 것이라면 비열한 것이다.
특히 대책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당사들인 노점상들이나 공무원들과 사전 대화 한 번 나눈 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설득하면 충분히 이해 할 수도 있는 대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같은 민주적 절차를 모두 생략해버리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나 계획이라도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면,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오 시장이 미리 ‘노점특별대책’과 ‘현장시정추진단계획’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두 가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의심을 받을만한 사안이 돌출적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것은 서울시다. 따라서 이런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 역시 서울시에 있다. 시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 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