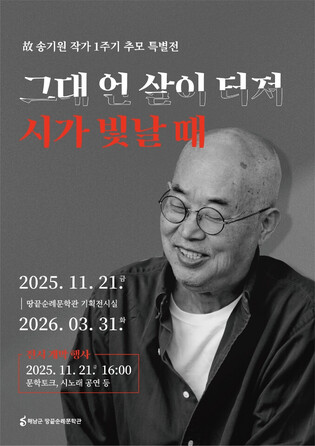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원칙대로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실제 원칙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보다 변칙을 구사하는 정치인들이 더 빨리 뜬다.
그래서 국회에 갓 들어온 새내기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탈 없는 변칙’을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가운데는 이런 변칙으로 승승장구해 어느덧 3선 의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그들은 이미 변칙적인 방법으로 오를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부류의 정치인들은 필자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그들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원칙대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좀처럼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좀처럼 뜨지 못한다.
하지만 내공이 쌓이면, 기자들의 신뢰를 받게 되고 결국 그의 곁에는 기자들이 들끓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 격인 정치인이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일 것이다.
사실 그의 행보는 정치부 기자들에게 그리 매력적이 아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과감하게 피력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들의 워딩 하나하나가 곧 기사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의 발언 속에서 월척(?)을 낚는 일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너무나 조용하다.
기껏해야 한 두 마디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발언 수준을 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런데도 그의 주변에는 기자들이 떼로 몰려다닌다.
그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다.
물론 그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원칙’이 갖는 힘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18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변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다툼이다.
실제 권영세-박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즉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경선을 하도록 돼 있는 만큼, 경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국 의원도 같은 입장인 것 같다.
이에 대한 홍준표 원내대표의 답변이 걸작이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장은 아마 당헌에 경선을 하도록 되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아마’라는 아리송한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선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 관례를 보면 거의 원내대표단에서 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선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라는 조건으로 ‘변칙’을 사용했다는 해명인 셈이다.
물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필자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알 이유도 없다.
다만 한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지나치게 ‘변칙’을 애용(?)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결과만을 위해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변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변칙’이 난무하는 정치, 그리고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원칙’을 구사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모두 건강해 지는 것이다.
원칙을 강조하는 한 정치인은 지난 11일 베이징 올림픽에서 잇따라 들려오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을 듣고 “메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온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나저나 ‘과정’을 중시하는 ‘원칙’과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변칙’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느 손을 들어줄까?
특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실제 원칙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보다 변칙을 구사하는 정치인들이 더 빨리 뜬다.
그래서 국회에 갓 들어온 새내기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탈 없는 변칙’을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 가운데는 이런 변칙으로 승승장구해 어느덧 3선 의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그들은 이미 변칙적인 방법으로 오를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부류의 정치인들은 필자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그들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원칙대로”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 정치인들에게는 좀처럼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좀처럼 뜨지 못한다.
하지만 내공이 쌓이면, 기자들의 신뢰를 받게 되고 결국 그의 곁에는 기자들이 들끓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 격인 정치인이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일 것이다.
사실 그의 행보는 정치부 기자들에게 그리 매력적이 아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과감하게 피력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들의 워딩 하나하나가 곧 기사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의 발언 속에서 월척(?)을 낚는 일도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너무나 조용하다.
기껏해야 한 두 마디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발언 수준을 넘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런데도 그의 주변에는 기자들이 떼로 몰려다닌다.
그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다.
물론 그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원칙’이 갖는 힘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18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변칙’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다툼이다.
실제 권영세-박진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즉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경선을 하도록 돼 있는 만큼, 경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국 의원도 같은 입장인 것 같다.
이에 대한 홍준표 원내대표의 답변이 걸작이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장은 아마 당헌에 경선을 하도록 되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아마’라는 아리송한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선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 관례를 보면 거의 원내대표단에서 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선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라는 조건으로 ‘변칙’을 사용했다는 해명인 셈이다.
물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필자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알 이유도 없다.
다만 한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지나치게 ‘변칙’을 애용(?)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결과만을 위해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변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변칙’이 난무하는 정치, 그리고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정치 지도자들이 ‘원칙’을 구사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모두 건강해 지는 것이다.
원칙을 강조하는 한 정치인은 지난 11일 베이징 올림픽에서 잇따라 들려오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을 듣고 “메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온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나저나 ‘과정’을 중시하는 ‘원칙’과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변칙’ 사이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느 손을 들어줄까?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