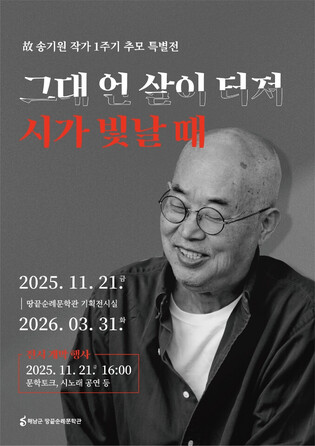이명박 정권 이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계획과 관련, ""3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통폐합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앞서 임 의장은 앞서 민영화 대상, 민간매각 대상, 통폐합 대상, 경영 기능조정에 관한 것들을 1차선진화 방안으로 발표했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민영화’로 집약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민영화가 정답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그렇다”거나 혹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과 같은 공익성격이 강한 공기업은 절대로 민영화를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공기업의 민영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도 공기업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행정(서비스)과 이익을 동시에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단순한 경영평가만으로 민영화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경영이나 아웃소싱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다.
실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경영을 하는 게 좋다”며 “이게 민영화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위탁경영의 경우, 소유주가 정부라는 점에서 분명히 민영화하고는 다르다.
하지만 민간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업체가 기업정신(?)에 따라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위탁경영은 결과적으로 가격상승과 품질하락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빤하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가 지금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주 신중하게 공기업 하나하나를 놓고 면밀하게 경영평가를 하는 등 살펴가며, 민영화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데 지금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전체 공기업을 통째로 놓고,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부가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등 4대 부문에 대해서는 절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점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위탁경영이니, 아웃소싱이니 하며 부분적으로 민영화와 비슷한 방안들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다.
경영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경영에 대해 아주 문외한인 낙천-낙선 정치인들을 공기업 사장 자리에 무더기로 내보내고 있는 게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실제 조폐공사나 신용보증기금,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방송광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낙천 낙선한 정치인들이나 이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인사들을 내려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외한들을 공기업 사장 자리에 임명해 놓고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지금은 조급하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방만한 경영,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어디까지나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돼야만 한다.
그러자면 공기업 하나하나를 케이스 별로 신중히 검토하고 난 후에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좋다.
영국에서 서둘러 철도 민영화를 실시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 매각당시 대금의 두배 이상을 물어주고 다시 철도를 국유화했던 과오를 기억하기 바란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계획과 관련, ""3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통폐합되는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앞서 임 의장은 앞서 민영화 대상, 민간매각 대상, 통폐합 대상, 경영 기능조정에 관한 것들을 1차선진화 방안으로 발표했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민영화’로 집약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민영화가 정답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그렇다”거나 혹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과 같은 공익성격이 강한 공기업은 절대로 민영화를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공기업의 민영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도 공기업은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행정(서비스)과 이익을 동시에 창출해야 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단순한 경영평가만으로 민영화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경영이나 아웃소싱 역시 별반 다를 바 없다.
실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경영을 하는 게 좋다”며 “이게 민영화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위탁경영의 경우, 소유주가 정부라는 점에서 분명히 민영화하고는 다르다.
하지만 민간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업체가 기업정신(?)에 따라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위탁경영은 결과적으로 가격상승과 품질하락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빤하다는 말이다.
특히 정부가 지금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주 신중하게 공기업 하나하나를 놓고 면밀하게 경영평가를 하는 등 살펴가며, 민영화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데 지금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전체 공기업을 통째로 놓고,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부가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등 4대 부문에 대해서는 절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점을 믿을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최근 위탁경영이니, 아웃소싱이니 하며 부분적으로 민영화와 비슷한 방안들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다.
경영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경영에 대해 아주 문외한인 낙천-낙선 정치인들을 공기업 사장 자리에 무더기로 내보내고 있는 게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실제 조폐공사나 신용보증기금,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방송광고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낙천 낙선한 정치인들이나 이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인사들을 내려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외한들을 공기업 사장 자리에 임명해 놓고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지금은 조급하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방만한 경영,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어디까지나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돼야만 한다.
그러자면 공기업 하나하나를 케이스 별로 신중히 검토하고 난 후에 서서히 추진하는 것이 좋다.
영국에서 서둘러 철도 민영화를 실시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 매각당시 대금의 두배 이상을 물어주고 다시 철도를 국유화했던 과오를 기억하기 바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