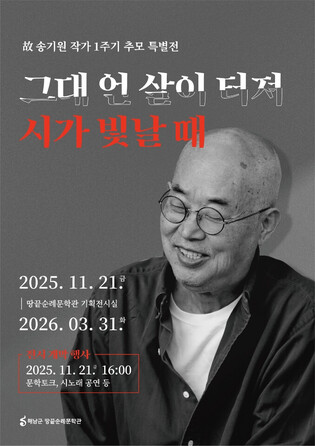지구상에 존재하는 선진국 중에 우리와 같은 극심한 승자독식사회는 없다. 우리는 십대 후반 경까지 목숨을 건 경쟁을 한 다음, 그때의 성적 서열에 따라 평생 동안 갈 학벌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때의 성적 서열에 의해 사람의 지위가 갈려야 한다는 것을 집요하게 세뇌 당한다. ‘지금 한 시간 더 공부하면 아파트 평수가 달라진다’ 같은 식의 가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중고등학교의 급훈이 그것을 말해준다.
사회, 언론, 부모, 교사 등 모든 통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십대 후반 입시 성적 서열이 곧 평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서열이 될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위 서열의 인간들이 군림하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나라가 된다. 승자독식사회가 형성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 학벌 중심체제는 더 강화됐다. 이것은 승자독식구조의 심화를 의미한다.
승자독식구조는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 과실을 소수가 독식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이, 개인 중에서는 중상층이, 대학 중에서는 일류대가,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즉 강자가, 즉 승자가 모든 과실을 독식하고 패자, 약자는 점차 고사해가는 나라가 된다.
승자독식 체제에서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점차 일반인들이 지배층, 부자들을 증오하는 사회가 된다. 한 신문사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67%가 ‘부자가 밉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가통합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떤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불신과 원망이 자리하게 되면 그 사회의 안정성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하기도 힘든 나라가 된다. 정치적인 불안정, 극단적인 투쟁의 일상화로 대화와 타협의 선진적인 정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승자독식 구조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거시지표가 호전 되도 모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어차피 모든 과실이 승자집단에게 독점되기 때문에 거시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지표와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이 서로 반비례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경제위기시엔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리더십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갖자거나, 희망을 갖자고 해도 오히려 정치에 대한 냉소만 커진다. 와해된 리더십으로는 절대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 서울 강부자편이라고 인식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그러므로 승자독식 구조는 우리 공동체의 자해행위다. 하지만 정부는 승자독식 구조를 교육과 사회경제부문에서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입시경쟁과 양극화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위기 탈출은커녕 오히려 위기만 심화될 뿐이다.
폭풍이 몰려오는데 선원들이 선장을 신뢰하지 못해 배가 표류하게 된 판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수월성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며 엘리트주의를 고수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엘리트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강부자와 엘리트만을 위하는 국가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하는 국가라는 신뢰가 회복돼야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다.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그런 리더십을 형성하기 전까진 어떤 정책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다.
사회, 언론, 부모, 교사 등 모든 통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십대 후반 입시 성적 서열이 곧 평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서열이 될 것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위 서열의 인간들이 군림하는 것을 모두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나라가 된다. 승자독식사회가 형성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고위 학벌 중심체제는 더 강화됐다. 이것은 승자독식구조의 심화를 의미한다.
승자독식구조는 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 과실을 소수가 독식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이, 개인 중에서는 중상층이, 대학 중에서는 일류대가,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즉 강자가, 즉 승자가 모든 과실을 독식하고 패자, 약자는 점차 고사해가는 나라가 된다.
승자독식 체제에서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점차 일반인들이 지배층, 부자들을 증오하는 사회가 된다. 한 신문사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 중 67%가 ‘부자가 밉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가통합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떤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불신과 원망이 자리하게 되면 그 사회의 안정성도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하기도 힘든 나라가 된다. 정치적인 불안정, 극단적인 투쟁의 일상화로 대화와 타협의 선진적인 정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승자독식 구조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거시지표가 호전 되도 모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어차피 모든 과실이 승자집단에게 독점되기 때문에 거시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지표와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이 서로 반비례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경제위기시엔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민이 신뢰할 만한 리더십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갖자거나, 희망을 갖자고 해도 오히려 정치에 대한 냉소만 커진다. 와해된 리더십으로는 절대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 서울 강부자편이라고 인식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그러므로 승자독식 구조는 우리 공동체의 자해행위다. 하지만 정부는 승자독식 구조를 교육과 사회경제부문에서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입시경쟁과 양극화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위기 탈출은커녕 오히려 위기만 심화될 뿐이다.
폭풍이 몰려오는데 선원들이 선장을 신뢰하지 못해 배가 표류하게 된 판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수월성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며 엘리트주의를 고수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엘리트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강부자와 엘리트만을 위하는 국가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하는 국가라는 신뢰가 회복돼야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다.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그런 리더십을 형성하기 전까진 어떤 정책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