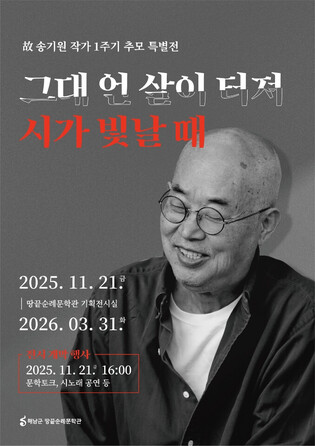“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은 중학생 정도면 들어서 알고 있는 익숙한 슬로건이다.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의회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 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18세기 중반에 영국 의회가 북미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자 식민지에 정착한 영국인들이 자신들은 영국 의회 의원을 뽑는 투표권이 없으니까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낼 수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다. 당시 영국 본국에서는 식민지에 사는 영국인들은 영국 의회에 관념적으로 대표되어 있다(‘virtual representation’)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인들이 항거한 것이다. 미국 독립은 식민본국인 영국의 부당한 과세권에 대한 항거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슬로건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이 슬로건은 세금은 의회가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원칙으로 발전되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을 순서를 바꾸면 “납세 없이 대표 없다(No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이 되는데, 현대적 상황에서는 이 슬로건이 오히려 중요하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문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실패한 국가들(failed states)’의 경우이다. 이런 나라들은 유엔과 외국의 지원으로 국민들이 기아(饑餓)를 간신히 면하는 한심한 상태에 있어, 세금을 내는 국민이란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냉전이 끝난 후에 이런 나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 지구 차원의 안보(global security)를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천연자원 덕분에 정부가 구태여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등 산유(産油)국가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나 나우루 같은 나라도 목재나 광물자원을 외국에 팔아서 세금을 걷지 않고도 나라 살림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수요를 충족해 준다. 주택에서 교육 의료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나라에선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같은 공공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유일한 관심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산유국(産油國)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얼마 전에 타계한 새무엘 헌틴텅 교수는 “납세 없이 대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유국들이 ‘석유의 저주(Curse of Oil)’에 걸려 있다고 했다.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것은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 투표권을 주기로 여야(與野)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입맛이 쓰기 때문이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학생, 군인 그리고 이들의 가족처럼 국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우리 정부에 내는 사람들은 선거 때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영주권을 갖고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모든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납부하고 국내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국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 주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여성도 자신의 아들, 남편, 오빠 동생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고통과 명예를 향유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산업화를 통해서 중산층이 두터워 졌고, 그로 인해 세금을 내는 계층이 많아졌다. 그리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야말로 당당하게 투표하고, 정부에 대해 주권자로서 요구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조치 덕분에 저소득층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간접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은 비록 그들의 국적이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등 모든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낸다.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짊어질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한, 이들이 본국 정치에 참여하는 명분은 희박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자기 의사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다.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는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들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화’를 내걸고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심지어 재외국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자는 등 무지개 같은 이야기가 많았다. (미국시민으로서 미국법을 위반한 로버트 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논의도 그런 정서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원칙을 살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투표는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 국방 의무를 다하거나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들의 특권이고 의무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을 순서를 바꾸면 “납세 없이 대표 없다(No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이 되는데, 현대적 상황에서는 이 슬로건이 오히려 중요하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문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실패한 국가들(failed states)’의 경우이다. 이런 나라들은 유엔과 외국의 지원으로 국민들이 기아(饑餓)를 간신히 면하는 한심한 상태에 있어, 세금을 내는 국민이란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냉전이 끝난 후에 이런 나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 지구 차원의 안보(global security)를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두 번째는 천연자원 덕분에 정부가 구태여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에미레이트 등 산유(産油)국가들이 대표적인 경우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나 나우루 같은 나라도 목재나 광물자원을 외국에 팔아서 세금을 걷지 않고도 나라 살림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수요를 충족해 준다. 주택에서 교육 의료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국민들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나라에선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같은 공공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유일한 관심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산유국(産油國)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얼마 전에 타계한 새무엘 헌틴텅 교수는 “납세 없이 대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유국들이 ‘석유의 저주(Curse of Oil)’에 걸려 있다고 했다.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것은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 투표권을 주기로 여야(與野)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입맛이 쓰기 때문이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학생, 군인 그리고 이들의 가족처럼 국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우리 정부에 내는 사람들은 선거 때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영주권을 갖고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모든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납부하고 국내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국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는 주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여성도 자신의 아들, 남편, 오빠 동생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고통과 명예를 향유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산업화를 통해서 중산층이 두터워 졌고, 그로 인해 세금을 내는 계층이 많아졌다. 그리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야말로 당당하게 투표하고, 정부에 대해 주권자로서 요구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 조치 덕분에 저소득층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간접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은 비록 그들의 국적이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등 모든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낸다.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방을 짊어질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한, 이들이 본국 정치에 참여하는 명분은 희박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자기 의사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이다.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다. 물론 이는 결코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들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화’를 내걸고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심지어 재외국민에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자는 등 무지개 같은 이야기가 많았다. (미국시민으로서 미국법을 위반한 로버트 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논의도 그런 정서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원칙을 살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투표는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 국방 의무를 다하거나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들의 특권이고 의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