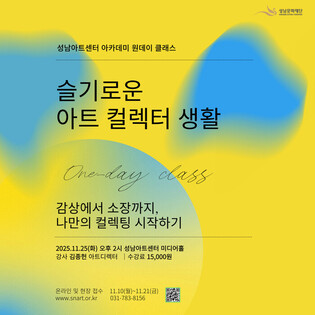편집국장 고하승
세계는 지금 바야흐로 ‘마담 프레지던트’ 시대가 활짝 열렸다.
실제 남미 최대국 브라질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는 남성 우월주의 전통이 강한 브라질 사회에서 "여성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이뤄낸 혁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지 시각 31일 실시된 제40대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집권 노동자당(PT) 후보인 지우마 호세프(62.여)가 제1 야당인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후보 조제 세하(68)를 무려 12% 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압승했다.
호세프 당선자는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현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게 된다.
브라질에서 여성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왕정 폐지 및 공화정 출범 121년 만에 호세프 당선자가 처음이다.
호세프 당선자는 브라질에서 21년간의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고, 지난 1985년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래 네 번째로 선출된 대통령이 됐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후보 당선 소식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브라질과 우리나라는 유사한 점이 참 많다.
우리나라 역시 ‘여성은 안 된다’는 편견이 브라질 못지않게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또 군사독재 정권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는 점도 브라질과 닮았다.
브라질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나서 네 번째로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노 정권과 결탁,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을 사실상 5년 더 연장시키고 말았다.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도 민주화 회복 이후 네 번째로 치러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여성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20명중 3명(독일, 아르헨티나, 호주)이 여성이다.
우선 지난 2007년 12월10일 57대 대통령에 취임한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57)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아르헨티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여장부’로 불리는 호주의 줄리아 길러드(49) 총리는 호주 최초의 여성 총리는 지난 2010년 6월 24일 27대 총리로 취임했다.
또 ‘독일판 철의 여인’으로 통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56) 총리는 지난 2005년 11월22일 8대 총리로 취임해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최연소 총리가 됐다.
뿐만 아니라,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여성이 최고지도자인 나라는 이번에 당선된 브라질 호세프를 포함해 17개국으로 역대 최다다.
실제 이원집정제 국가인 핀란드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여성이다.
특히 ‘핀란드의 아줌마’로 통하는 할로넨 대통령은 여성 특유의 소박하고 친근함을 앞세워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했고, 결국 핀란드를 국가 청렴도, 경쟁력, 학력평가, 환경 지수 1위에 올려놨다.
이밖에 아일랜드의 메리 매컬리스도 1997년부터 13년째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우먼파워’다. 뉴질랜드는 헬렌 클라크가 1995년이후 총리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엘런 존슨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됐다. 아시아에서도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키르기스스탄의 로자 오툰바예바 대통령이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로 꼽힌다.
특히 미래학자들 모임인 토플러협회는 최근 “향후 3년내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리더십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포함될지도 모른다.
실제 유력한 여성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여야 다른 대권주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2012년 대선에서 브라질처럼 "여성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혁명적인 선거 결과가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
세계는 지금 바야흐로 ‘마담 프레지던트’ 시대가 활짝 열렸다.
실제 남미 최대국 브라질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는 남성 우월주의 전통이 강한 브라질 사회에서 "여성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이뤄낸 혁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지 시각 31일 실시된 제40대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집권 노동자당(PT) 후보인 지우마 호세프(62.여)가 제1 야당인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후보 조제 세하(68)를 무려 12% 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누르고 압승했다.
호세프 당선자는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현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게 된다.
브라질에서 여성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왕정 폐지 및 공화정 출범 121년 만에 호세프 당선자가 처음이다.
호세프 당선자는 브라질에서 21년간의 군사독재정권이 종식되고, 지난 1985년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래 네 번째로 선출된 대통령이 됐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후보 당선 소식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브라질과 우리나라는 유사한 점이 참 많다.
우리나라 역시 ‘여성은 안 된다’는 편견이 브라질 못지않게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또 군사독재 정권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는 점도 브라질과 닮았다.
브라질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나서 네 번째로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노태우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노 정권과 결탁,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을 사실상 5년 더 연장시키고 말았다.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도 민주화 회복 이후 네 번째로 치러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여성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주요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 20명중 3명(독일, 아르헨티나, 호주)이 여성이다.
우선 지난 2007년 12월10일 57대 대통령에 취임한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57)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아르헨티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여장부’로 불리는 호주의 줄리아 길러드(49) 총리는 호주 최초의 여성 총리는 지난 2010년 6월 24일 27대 총리로 취임했다.
또 ‘독일판 철의 여인’으로 통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56) 총리는 지난 2005년 11월22일 8대 총리로 취임해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최연소 총리가 됐다.
뿐만 아니라,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여성이 최고지도자인 나라는 이번에 당선된 브라질 호세프를 포함해 17개국으로 역대 최다다.
실제 이원집정제 국가인 핀란드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여성이다.
특히 ‘핀란드의 아줌마’로 통하는 할로넨 대통령은 여성 특유의 소박하고 친근함을 앞세워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했고, 결국 핀란드를 국가 청렴도, 경쟁력, 학력평가, 환경 지수 1위에 올려놨다.
이밖에 아일랜드의 메리 매컬리스도 1997년부터 13년째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우먼파워’다. 뉴질랜드는 헬렌 클라크가 1995년이후 총리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엘런 존슨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됐다. 아시아에서도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키르기스스탄의 로자 오툰바예바 대통령이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로 꼽힌다.
특히 미래학자들 모임인 토플러협회는 최근 “향후 3년내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리더십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포함될지도 모른다.
실제 유력한 여성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여야 다른 대권주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2012년 대선에서 브라질처럼 "여성은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혁명적인 선거 결과가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