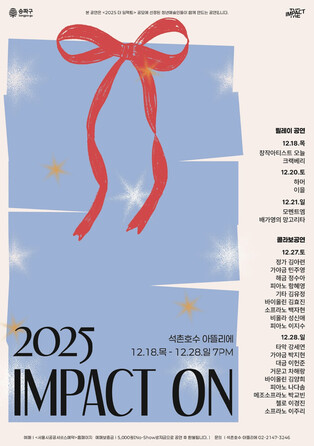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 ▲ 김흥수 한국체육철학회 회장 | ||
밖으로 나가 보았다. 포근한 봄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 속에 은은한 꽃 향기가 풍긴다. 완연한 봄 바람이다.
겨울 바람이 메마른 것에 비해, 봄 바람은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아마 며칠 간격으로 내린 비 때문 이리라.
바람의 강도도 겨울에는 세찬데 비해, 봄에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며칠 새 올라간 기온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봄 바람에는 이처럼 꽃 향기가 스미어 있다.
꽃들은 엄동부터 봄을 준비한다.
이번 겨울에 그 것을 제대로 체험했다. 눈 내리던 12월 부터 매일 학교 교정을 오가며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교정에는 내가 좋아하는 나무들이 꽤 있다.
체육관 뒷쪽 출입문 옆에 우람하게 서 있는 벗나무는 한 아름이 넘는 크기이다. 밑의 가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부부수라고도 불린다. 그 옆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목련이 서 있다.
목련은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가지 끝마다에 버들강아지같은 싹을 돋우고 있었다. 연구실 건너 편에는 매화 두 그루가 사이를 두고 자리잡고 있다. 그 건너편에는 등나무 여섯 그루가 차일처럼 올려진 버팀목에 줄기를 질펀하게 올려놓고는 자기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버팀목 밑에는 몇 개의 벤치가 놓여져 있다.
지난 주부터 매화가 피기 시작했다. 고목나무같은 모습의 매화나무가 겨우내 만들어 온 조그만 봉우리는 점차 바알갛게 부풀더니 어느 날 한 두 개의 매화가 먼저 피고 있었다. 마치 척후병처럼, 맞다, 척후병처럼 한 두 송이가 먼저 피었다. 아직은 세찬 바람이 불던 날 용감하게 활짝 몸을 젖히고 꽃을 피웠다. 겨우내 기다려 온 나는 그 용감한 척후병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낮에 살펴보니 벗나무 가지 끝의 봉우리들이 많이 부풀어 올랐다. 목련 가지 끝의 봉우리들도 몰라보게 커져 있었다.
다만 등나무는 아직도 모른체하며 자기 모습에 변화를 주지 않는 듯이 보인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는가? 아둔한 내 눈에나 그렇게 보일 뿐이겠지. 아마 무심한 척하는 등나무도 속으로는 열심히 싹 틔울 시간을 카운트 다운 하고 있을게다. 이처럼 꽃을 피우기 위해 엄동 설한부터 쉼없는 노력으로 오랜 겨울을 인고忍苦해 온 꽃나무들이 가상하게 여겨진다.
이번 주에 만개한 매화에는 손님들이 잔뜩 몰려와서 소란스러웠다. 조그만 일벌들이, 만화영화에서나 볼듯 싶은 조그만 꿀벌들이 이 꽃 저 꽃을 분주하게 날아 다니고 있었다. 그들의 날갯짓 소리가 흰 꽃 무리 가득한 속에서 교향악처럼 들렸다. 수 많은 벌들이 내는 날갯짓 소리는 매우 힘차고 건강한 느낌을 주었다. 봄이다.
하기야 이 조그만 숲에는 입춘이 지나면서 새 소리도 달라 짐을 느꼈다. 겨울에는 조금은 메마른 색조였는데 한결 밝은 음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좀 수다스러워 졌고, 우스운 것은 건너 편 산에서 들리는 꿩의 소리였다. "꿩~ 꿩~"하며 우는 숫꿩의 목소리였다. 아직 변성기를 지나지 않은 앳된 목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직 어린 녀석이 짝을 찾느라 덜 된 목소리로 우는 모습에 빙그레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꿩의 산란기가 6월이니 5월에 짝짓기를 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짝을 찾아야 할 테니 덜 된 목소리라고 폄훼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빔 깊은 이 시각, 어제가 그믐 밤이어선지 달빛도 없다. 구름이 짙어서인지 별빛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스치는 바람에 꽃내음만이 아득하게 스며온다.
겨우내 준비를 하던 꽃나무들이 이제 자기의 계절이 왔다고 이 새벽에 짙은 향기를 내 뿜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겨우내 저 매화만큼이나 노력을 했는가, 봄을 맞을 준비를 저 봉우리들 만큼이나 치열하게 했었는가를 반성해 본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한 그루의 나무들이다. 나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 시간을 아끼며 진력을 경주해야 하리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