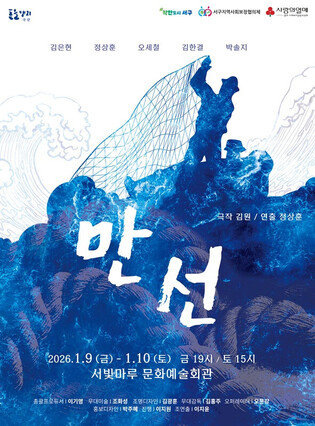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감사원이 9일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은 치매관리와 장기요양 서비스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보건복지부(15건) ▲국민건강보험공단(5건) 등 총 2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 적인 사항도 적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확진자 61만명 중 32만명(52.4%)만 치매 상담센터에 등록됐으며, 나머지 47.6%는 누락됐다.
또 치매환자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도 찾아오는 노인 위주로 시행하다보니 전체 노인인구 대비 미수검률이 최근 5년간 8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치매환자 관리체계가 미비해 치매 관리 단계별(조기검진→등록→사후관리)로 치매 고위험군을 비롯한 치매환자 관리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치매상담센터가 홀몸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검사하지 않고 보건소에 올 수 있는 노인이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만 찾아가 검사를 하다보니 전체 60세 이상 노인 중 80% 이상이 검사를 아예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만 60세 이상 인구 974만6000명 중 16.5%인 161만2000명만 치매 선별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83.5%인 813만4000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선별검사를 통해 15만6000명이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상담센터의 담당자가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미의뢰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입력한 사람은 8만300명으로, 나머지 7만3000명에 대해서는 의뢰 여부 정보 자체가 입력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61만8000여명 중 52.4%인 32만4000여명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됐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치매상담센터에 등록을 하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의 연계와 방문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치매노인 배회인식표 발급 등 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은 지자체의 인지재활 프로그램 수급률이 저조한 점과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 시설기준이 불합리한 점, 공립요양병원의 전문인력(전문의·전담간호) 확보율이 낮은 점, 치매가족 휴가제의 이용 자격과 절차가 불합리한 점 등도 지적했다.
전문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립요양병원 79곳의 환자 12만53명 중 치매환자는 8124명에 달했지만 의사 404명 가운데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는 39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명에 불과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지난해 30조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3% 차지했으며, 그 중 치매 등 만성질환 관련 비용은 17조원(56%)에 달했다. 노인치매환자는 2015년 기준 64만8000여명으로, 2050년에는 2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조사결과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 중 75%인 190곳은 치매진료중단자 관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치매상담센터가 활동성이 낮아 검사를 받기 어려운 노인을 직접 찾아가 치매 선별검사를 할 것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된 노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치매확진을 한 병원이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안내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통보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병원의 치매진단 결과를 관할 치매상담센터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진료중단자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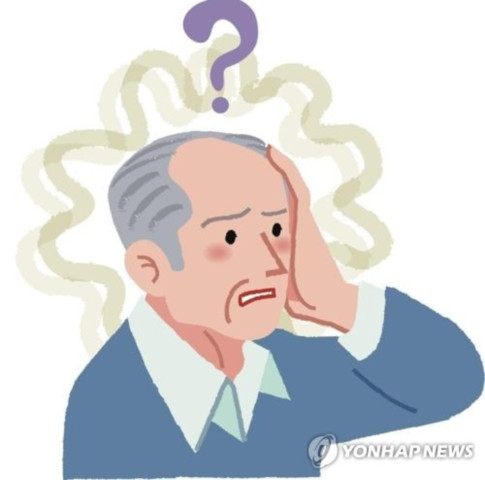 |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은 치매관리와 장기요양 서비스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보건복지부(15건) ▲국민건강보험공단(5건) 등 총 2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 적인 사항도 적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확진자 61만명 중 32만명(52.4%)만 치매 상담센터에 등록됐으며, 나머지 47.6%는 누락됐다.
또 치매환자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도 찾아오는 노인 위주로 시행하다보니 전체 노인인구 대비 미수검률이 최근 5년간 8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치매환자 관리체계가 미비해 치매 관리 단계별(조기검진→등록→사후관리)로 치매 고위험군을 비롯한 치매환자 관리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치매상담센터가 홀몸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검사하지 않고 보건소에 올 수 있는 노인이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만 찾아가 검사를 하다보니 전체 60세 이상 노인 중 80% 이상이 검사를 아예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만 60세 이상 인구 974만6000명 중 16.5%인 161만2000명만 치매 선별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83.5%인 813만4000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선별검사를 통해 15만6000명이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상담센터의 담당자가 정밀검사를 의뢰하거나 미의뢰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에 입력한 사람은 8만300명으로, 나머지 7만3000명에 대해서는 의뢰 여부 정보 자체가 입력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61만8000여명 중 52.4%인 32만4000여명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됐고, 나머지는 등록이 안 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치매상담센터에 등록을 하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의 연계와 방문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치매노인 배회인식표 발급 등 서비스가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감사원은 지자체의 인지재활 프로그램 수급률이 저조한 점과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 시설기준이 불합리한 점, 공립요양병원의 전문인력(전문의·전담간호) 확보율이 낮은 점, 치매가족 휴가제의 이용 자격과 절차가 불합리한 점 등도 지적했다.
전문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립요양병원 79곳의 환자 12만53명 중 치매환자는 8124명에 달했지만 의사 404명 가운데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는 39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1명에 불과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지난해 30조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3% 차지했으며, 그 중 치매 등 만성질환 관련 비용은 17조원(56%)에 달했다. 노인치매환자는 2015년 기준 64만8000여명으로, 2050년에는 2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 조사결과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 중 75%인 190곳은 치매진료중단자 관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치매상담센터가 활동성이 낮아 검사를 받기 어려운 노인을 직접 찾아가 치매 선별검사를 할 것 ▲인지기능 저하자로 확인된 노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밀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치매확진을 한 병원이 치매상담센터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안내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통보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병원의 치매진단 결과를 관할 치매상담센터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해 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진료중단자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