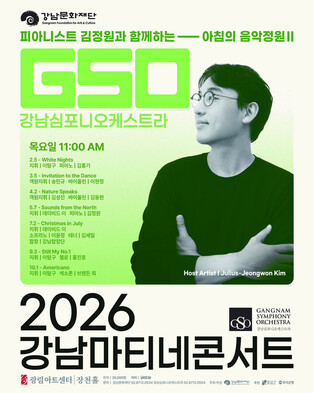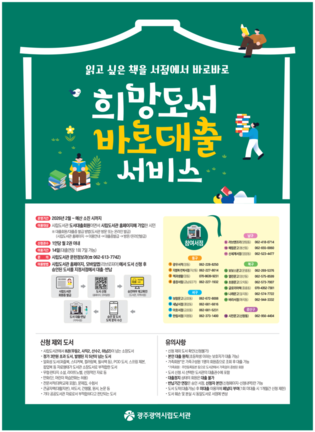| ▲ 정남철 까띠끌레융바이오 대표(임학박사) |
이 때문에 수목의 뿌리조직의 섬유소가 짧아져서 물리적인 인장력이 감소하게 되고, 토양으로 유입된 폭우가 임계점 이상의 중력이 뿌리조직에 힘을 가하면 짧은 섬유소 조직이 쉽게 끊여져 토양 덩어리를 잡아 주지 못하고 산사태를 일으킨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이 예단 되는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산사태 예상지역 식생의 뿌리조직 섬유소 길이를 증가시키고, 인장강도를 높여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임업적 시업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제안해 본다.
최근 폭우에 의해서 울창한 산림지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그 토석류에 의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까지 밀려와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우리에게 알려진 산림의 공익적 기능 중 하나는 산림이 폭우에 의해 쏟아지는 많은 빗물을 산림토양에 저장했다가 서서히 계류로 내려 보냄으로써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근래에 들어 울창한 산림지대에서 폭우에 의해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임도를 개설하고 절개지와 성토지 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폭우에 의한 토양 물리성의 연약화와 식생의 의한 증발산 작용의 부재로 높아진 지하수면으로 인해 조그만 틈으로 유입된 강수가 토양층을 지지하지 못해 중력에 의해 식생 잔존물과 토석의 혼합물이 아래로 떠내려가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필자는 여기서 역설적이게도 울창한 산림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사태 발생기작에 대해서 최근 과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가설적인 원인과 그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산사태(landslide)는 얕은 산사태(shallow landslide), 깊은 산사태(deep-seated landslide)로 구분한다. 얕은 산사태는 수목이 자라는 토양층에서 두께가 2m 미만인 토양덩어리들이 토양 단면이나 기반암 접촉부에서 불연속성을 만들어 표면 위로 미끄러지는 과정이다(Phillips et al., 2021; Washington Geological Survey Fact Sheet, 2017). 이로 인해 빠르게 이동하는 토석류가 발생한다.
깊은 산사태는 기반암에서 발생하고, 느리게 이동한다. 넓은 지역을 덮을 수 있고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얕은 산사태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식물이 생육하고 있는 언덕 경사면의 토양 내에 분포하는 뿌리가 토양강성을 강화해 산사태를 예방한다(Wu et al., 1979; Waldron & Dakessian, 1981; Bathurst et al., 2010)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연에서 뿌리에 의해 얕은 경사면의 토양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크게 수문학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으로 분류한다(Nilaweera & Nutalaya 1999). 수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식생의 존재는 광합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산 작용에 의해서 토양의 수분함량을 감소시킨다(Wu 1984).
그러나 토양 내에서 사멸한 뿌리는 토양에 큰 공극을 생성시켜, 더 많은 수분 침투능력을 제공한다(Greenway 1987). 이와 같이 높은 수분 침투 율은 지하수면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삼출압력을 증가시켜, 더 높은 산사태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Cammeraat et al., 2005; Nyssenet et al., 2002).
물리적인 측면과 관련해 식생의 근계는 뿌리 조직의 인장력, 마찰력, 접착성분으로 인해 토양강성을 강화시켜 산사태를 방지한다(Ekanayake et al. 1997; Greenway 1987). 토양 표면을 향해 수직으로 뻗어 있는 뿌리는 토양 덩어리의 전단력(剪斷力)을 증가시켜 토양의 전단된 표면을 강화한다.
흙과 평행하게 자라는 뿌리는 근권(根圈)의 인장력을 증가시켜 토양 표면을 강화시켜 산사태를 방지한다(Zhou et al. 1998). 전체적인 뿌리 조직의 물리적인 효과는 뿌리 조직의 인장력에서 뿐만 아니라 토양 내에서 뿌리의 분포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Nilaweera & Nutalaya, 1999).
토양 내 세근(細根)의 함량이 높을수록 토양의 지지력이 증가돼 산사태를 예방한다고 증명됐다(Operstein & Frydman, 2000; Reubens et al., 2017). Schwarz et al.(2015)의 연구에 의하면 직경이 6~28mm인 10개의 뿌리가 존재하면 0.72m x 0.25m의 직사각형 토양 프로파일에서 토양의 압축 강도가 뿌리가 없는 토양에 비해 약 40%(2.5kN) 증가했다. 토양을 잡아 주는 현성강성은 뿌리가 없는 토양보다 38%나 높아졌다. 토양 내 분포하는 뿌리조직의 인장력에 의해 얕은 산사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Giadrossich et al., 2017).
최근, Marzini 등(2023)의 유럽의 산림과학자들이 이탈리아 투스카니의 고산지대 독일가문비, 밤나무, 너도밤나무, 참나무 류가 우점 하는 산림지대에서 발생한 얕은 산사태 지역에서 수목의 뿌리 강성과 화학적 성분과의 관계를 발표했다.
이곳에서 산사태 발생한 곳, 산사태 인접한 곳, 산사태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미 발생 장소의 뿌리를 채취해 뿌리조직의 인장력과 인과관계가 있는 뿌리 조직 내 셀룰로스, 리그린, 헤미셀룰로스와 같은 긴사슬의 중합체 성분 함량을 FTIR과 Raman분광기로 측정했다. 그리고 레이저유도플라즈마분광기(LIBS)로 영양염류인 미네랄(C, Si, Fe, AL, Ca, Mg, Na, Mn)함량을 측정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의 뿌리조직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곳에서 채취한 뿌리 조직과 비교해 뿌리 조직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벽 구성 물질인 목질섬유인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과 같은 중합체의 C=C결합이 감소했다.
광합성 세포 소기관인 엽록소의 구성성분인 마그네슘(Mg)과 세포내 물질 수송에 관여하는 칼슘(Ca)의 함량도 줄어들었다. 식물 생장의 필수 영양성분인 질소(N)의 흡수도 감소했다. 이들 성분 모두 공생 균근 균에 의해 흡수되는 양분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사태 발생한 곳의 토양은 질소(N)가 과다하게 축적돼, 토양 산성화가 이뤄 졌으며, 수목의 뿌리에 공생하는 공생균근의 형성 율이 감소하고, 영양염류와 질소(N), 인산(P)을 정상적으로 흡수하지 못해 수목들은 영양 불균형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산림에서는 질소성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빗물과 대기로부터 강하된 질소가 비료로써 작용해 식물의 성장을 돕는다. 또한 토양으로부터 질소, 인산, 미네랄을 흡수해 식물에 전달하는 공생균근균의 균사 생장 또한 증가시킨다.
그러나 고농도의 질소가 지속적으로 산림에 유입될 경우, 오히려 토양과 식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영양염류가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에는 산림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질소포화(nitrogen saturation)’가설이 제시됐다(Skeffington & Wilson 1988; Aber et al. 1989).
이 가설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대기로부터 유입된 질소는 초기에는 저농도로 토양에 유입되기 때문에 식물, 공생균근균, 분해 미생물에게 흡수돼 그 성장을 도와 식물과 공생균근균의 바이오매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20kgN/ha/yr이상(초기단계)~40kgN/ha/yr이하(만성단계)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는 질소포화 상태에서 특히, 잉여 암모니아의 경우는 질산화 과정(nitrification)을 거쳐 질산으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소가스[아산화질소(N2O),산화질소(NO)]가 발생하며, 이동성이 큰 질산은 지하수나 지표수를 통해 호수나 하천과 같은 수계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토양의 산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두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첫 째는 질산화 과정 자체에서 수소이온이 발생해(① NH4++O2-→ NO2-+4H++2e) 토양 pH를 낮추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질산이 물을 따라 이동하며 칼슘(Ca2+), 마그네슘(Mg2+), 칼륨(K+)과 같은 이온들을 함께 이동시키며 토양 내의 염기성 양이온 농도를 감소시켜(② NO2-+H2O-→NO3-+2H+) 토양 pH를 낮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토양의 무기물질에 강력하게 흡착 돼 있던 알루미늄(Al3+)같은 독성이온 역시 유동화 하는 현상도 일어나게 된다. 결론적으로 식생의 입장에서는 생장에 필요한 양이온 영양소의 결핍, 독성이온의 유동화, 토양의 산성화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생장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는 산림쇠퇴의 결과로 이어진다.
산림토양 내 질소의 과잉축적은 외생균근균의 자실체 형성과 균사 분포 및 생장을 저해 한다(Wallenda & Kottke, 1998). 지하부 외생균근균의 군락구조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Lillescov et al. 2001, 2002). Lillescov et al.(2002)에 의하면, 알라스카 화이트가문비나무(Picea glauca) 임분의 지하부 외생균근균 군락이 질소농도에 의해 변화됐다.
질소비료((NH4)2SO4)의 공급에 의해 외생균근균 형성 률은 감소됐다(Menge et al., 1977; Tétrault et al., 1978; Arnebrant & Söderström, 1994). 12년 동안 질소비료를 총 1,200kg/ha (120kg/ha/year) 공급한 독일가문비나무 임분의 토양 내 외생균근균 균사생산 량이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지역보다 50% 감소했다.
수목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는 토양간극으로 침투한 외생균근균의 균사들이 무기인산(inorganic phosphate(PO4-))과 결합된 형태로 흡수해 균사의 세포 내 액포에 저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 무기인산이 축합반응을 거쳐 폴리인산(polyphosphate)을 형성한다.
이들 폴리인산은 PO4-의 음이온 작용기가 강력하게 작용해 금속성 양이온(Mg, K, Na, Zn, Ca, Mo, Mn, B)을 흡착한다. 따라서 산림토양에서는 이러한 금속성 양이온 양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수목의 대부분은 생장에 필요한 금속성 양이온을 외생균근균에 의해 얻는다고 할 수 있다.
농경지에서 사용된 농업용 질소비료의 탈질작용으로 생성되는 아산화질소(N2O), 질소(N2)와 자동차‧공장 매연, 난방용 연료로부터 방출되는 질소산화물(NO×)이 수증기와 함께 대기로 휘산 된다.
이들은 산림지대로 이동하며 안개성 구름으로 생성되고 그에 포함된 질소강하물( NH4+과 NO3-)에 의해 잎 조직 내에 과잉 축적된 질소는 광합성과정에서 생성된 탄소원을 수목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과 탄소중합체의 생성이 아닌 단백질의 생성에 사용되게 한다.
폴리페놀이 결핍되면 금속성 양이온 미량원소(Mg, Ca, K, Zn, Na 등)를 토양에서 흡수해 식물체에 전달하는 공생균을 유인하거나 균사 생장을 촉진하는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잎 조직 내 Ca과 Mg의 결핍으로 엽록소합성이 저해 돼 잎의 크기가 작아지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 건전한 뿌리조직의 세포벽 구성 물질인 목질섬유인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과 같은 중합체 생성을 저해해 토양 안정성을 높여주는 뿌리조직의 인장 력을 감소시켜 오히려 수목의 무게가 중력으로 작용해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울창한 산림지대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은 토양에 환경오염과 농작물 재배에 이용된 질소가 순환과정을 거쳐 산림에 축적돼 토양이 산성화 되고, 그로 인해 수목의 균근 형성 율이 감소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광합성 효율이 떨어져 긴사슬의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짧은 사슬의 중합체만 만들어져 세포벽이 약해져서 뿌리조직의 물리적인 인장력이 감소하게 된다.
폭우에 의해 토양으로 유입된 강수가 임계점 이상의 중력으로 뿌리조직에 힘이 가해지면 쉽게 뿌리조직이 끊여져 토양 덩어리를 잡아 주지 못하고 산사태가 일어난다. 건강한 인장강도를 갖는 근계를 가지고 있다면 산림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공익적 기능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겠지만 약해진 뿌리조직의 인장강도를 갖는 수목은 오히려 그 무게로 인해 산사태를 가속화시켜 인간을 향한 창끝으로서 울창한 산림이 환경재앙의 역습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림으로 과도한 질소 유입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보다 더 산림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변화된 기후환경으로 인해 울창한 산림으로 환경오염의 산물인 질소가 과다하게 유입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산사태의 역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림관리기법이 요구된다.
빈번해지는 울창한 산림에서의 얕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천근성인 침엽수 임분에서 심근성 활엽수로 생태 복원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현존 침엽수 임분의 뿌리조직의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임업적 시업도 필요하다.
2) 산사태 예상 지역의 침엽수 임분은 낙엽을 걷어내서 토양으로 부식산과 유기산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화칼슘 즉, 소석회(Ca(OH)2)를 시용해 산도를 약산성과 중성 토양으로 유지함으로써 균근균에 의해 건강한 영양염류의 흡수를 도와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한다.
4) 관목층 이하는 숲가꾸기로 벌채하지 말고 뿌리가 2m이상 깊게 침투하는 관목류를 유지해 교목성 침엽수 임분의 약해진 뿌리조직 인장력을 상쇄할 수 있는 토양 강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5) 임도를 개설할 때 발생하는 절개지와 성토지 사면은 일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류 뿌리의 사멸로 인한 토양 공극발생으로 산사태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녹화공법보다는 뿌리가 2m이상 깊게 침투하는 관목류 식재를 통해 토양 지지력을 높여주는 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6) 목재를 수확한 벌채지에서는 관목들을 벌채하지 말고 잔존시켜서 토양 강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이 예단 되는 상황에서 산림당국은 산사태 예상지역 식생의 뿌리조직 섬유소 길이를 증가시켜 인장강도를 높여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임업적 시업이 필요할 것으로 필자는 제안해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