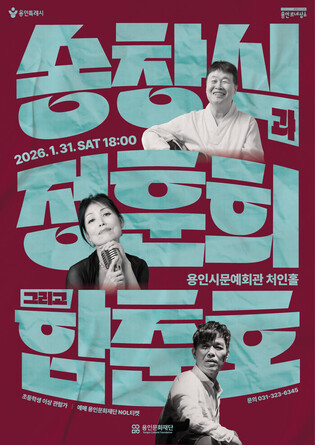法 "퇴직·면직등 사유 안돼"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쟁 상황에서 강제로 북으로 끌려간 공무원의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해 7월 북한군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그는 이후 북한에서 생활하며 B씨와 결혼했고, 1996년 사망했다.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지난해 3월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A씨가 공무원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짚었다.
또한 "납북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금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