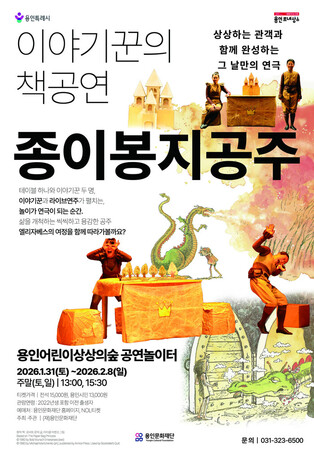[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사망자 A양(2002년생)의 부모와 여동생이 B군(2001년생)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B군은 2018년 휴대폰 앱으로 A양을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A양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3회 촬영했다.
2주 가량이 지난 뒤 B군은 A양과 연락이 되지 않자 메신저로 당시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과 욕설을 했다. 협박을 받은 A양은 12시간가량 지난 시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B군을 성폭력처벌법,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B군을 소년부에 송치한 뒤 보호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양의 부모와 여동생은 B군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액과 위자료 등 총 4억3000여만원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군의 아버지는 2004년 협의이혼 이후 전 부인(B군의 어머니)과 연락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에게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B군이 A양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유포 협박을 한 것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라면서 A양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단, 당시 다른 성추행 사건 등으로 심리적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60%로 봤다.
B군과 함께 살던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B군이 학교생활 중 큰 문제를 보이지 않은 사정을 들어 4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B군의 아버지에 대한 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협의이혼한 아들과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행하고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법 913조상 자녀의 보호·교양이 친권자의 권리의무로 지정돼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권리 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라며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에게도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지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며 1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진 2심에서는 손해배상 액수가 다시 선정됐지만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비양육친인 B씨 아버지에게 감독 의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오늘 대법원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