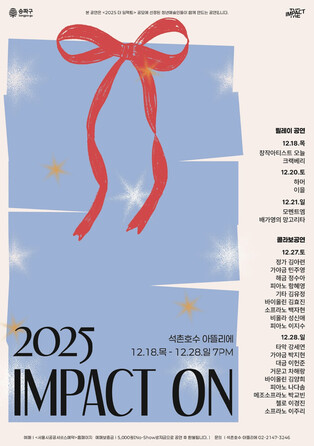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10) 銃대 멘 젊은 ‘괸당'들
한남마을은 1∼2리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말미동은 운청동, 활오동, 천외동 등 4개동이 하나로 묶인 ‘한남2리’ 가운데서 노른자로 꼽히는 동네였다.
동북 3백여m 지점에는 1백여폭짜리 병풍을 떠올리는 총천연색 병풍바위, 속칭 ‘올한디’가 휘무듬히 둘러쳐져 있다. 그리고 동쪽에는 ‘월출(月出)오름’이 우람한 모습으로 도사리고 앉았는가 하면, 뒤켠으로는 울창한 숲속을 꿰뚫고 ‘악근천’ 상류가 굽이돌며 동네를 감싸않은 형국을 이루고 있다.
속세에서 멀리 떨어진 별천지 같은 동네다. 고정관과 조용석은 숙연함을 느끼면서 동네 안으로 들어섰다. 이만성의 집은 동네 한복판 길가에 자리잡은 초가집이지만, 소위 고래등 같은 3채의 집이었다.
첫눈에 동네 안에서는 첫 손을 꼽는 부유층 소유의 집임믈 알 수 있었다. 부유층인데… 과연 포섭이 가능할까? 두 사람은 굳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때마침 마당 한복판에서 기웃거리고 있던 이만성(李晩成)이 눈을 크게 뜨며 비호같이 달려나왔다.
“여, 형님들! 기어코 와 주셨군요, 두시간 전부터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당 한복판에서 벌을 서보긴 난생 처음입니다.”
이만성은 다짜고짜 한 손에 하나씩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세차게 흔들어대며 호들갑을 떨었다.
“미안하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약속시간 못 지키고 지각을 한 셈일세, 본의 아니게 벌을 세게 해서 면목이 없네, 사과함세, 그러니까 쪽지는 제대로 전달이 된 셈이었군!
혹시 쪽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자네가 외출이라도 해버렸다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었는데…. 정말 반가우이.
도대체 이게 몇 년만인가? 조국이 해방된 뜻깊은 시기에 우리 세사람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건 예삿일이 아니라구. 이보다 더 값진 만남이 어디 있겠어?”
고정관이 자지러지게 감격해하며 걱쭉하니 떠들어댔다.
“자네 얼굴 자네 집에서 대하고 보니 더욱 감회가 새롭구먼, 8·15해방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실감이 나네 그려, 사실은 자네가 내려와 주지 않을까하고 은근히 기다렸었는데…무심한 친구 같으니라구!”
조용석은 스스럼없이 씨부렁거렸지만, 언중유골(言中有骨) 다분히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죄송합니다. 두 형님께서 어려운 걸음 하실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며칠 전부터 찾아뵈야겠다고 별러왔습니다만, 짬을 낼 형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휴학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지는 4개월 남짓 되었지요, 두 형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은 때여서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지 형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얘기 한마디 나눌만한 친구 하나 없기 때문이었지요”
이만성은 겸연쩍어 하면서도 하소연하는 목소리로, 슬그머니 변명과 곁들여서 고충을 털어놓았다.
“용석이 이사람 말은 그런 뜨이 아니고, 농담이라니까 농담! 설령 그 사이 자네가 먼저 찾아왔었다 해도 만나기 어려웠을 걸세, 용석이는 늘 서귀포와 제주성내를 들락거리느라 바빴었고, 나는 귀국한지는 20일 남짓 되지만 집에 돌아온지는 5일 밖에 안됐으니까, 그런 그렇고, 부모님은 나가시고 안계신가? 특히 아버님은 꼭 뵈야 할 터인데…”
“여독이 채 풀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시다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가 게셨 더라면 무척 기뻐하실 터인데…마침 문중회 일로 제주성내에 가 계시거든요, 사나흘 후에나 오시게 될 것 같네요, 자, 들어오시지요. 누추한 방입니다만…”
두 사람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막내 동생 같은 수더분함을 이만성은 숨김없이 보여 주었다.
“잠깐! 용석이 자네가 저걸 내려놓구…”
고정관이 한쪽 손을 내밀어 자전거 쪽을 가리켰다, 그제서야 조용석도 생각난 듯 자전거가 세워진 지점을 향해 휘적휘적 걸어갔다.
“막걸리를 구할 수 있을까? 변변치는 않아도 안주감으로 세불곶 포구에 내려가서, 자리돔을 구해가지고 왔네만…. 사실은 늦게 입항한 ‘태우’를 기다리느라고 지각을 했지 뭔가”
“정말 이 못난 동생 쥐구멍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까? 몸 둘 곳을 모르게 하시다니…”
세사람은 곧 방안으로 들어섰다. 이만성의 서재였다. 3면이 책으로 가득 채워진 방-작은 도서관을 떠올리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서재였다. 두 사람은 책장 쪽으로 눈을 돌렸다. 5백여권이 됨직한 이 책들 속에 공산주의 서적은 몇 권이나 끼어 있을까?
한남마을은 1∼2리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말미동은 운청동, 활오동, 천외동 등 4개동이 하나로 묶인 ‘한남2리’ 가운데서 노른자로 꼽히는 동네였다.
동북 3백여m 지점에는 1백여폭짜리 병풍을 떠올리는 총천연색 병풍바위, 속칭 ‘올한디’가 휘무듬히 둘러쳐져 있다. 그리고 동쪽에는 ‘월출(月出)오름’이 우람한 모습으로 도사리고 앉았는가 하면, 뒤켠으로는 울창한 숲속을 꿰뚫고 ‘악근천’ 상류가 굽이돌며 동네를 감싸않은 형국을 이루고 있다.
속세에서 멀리 떨어진 별천지 같은 동네다. 고정관과 조용석은 숙연함을 느끼면서 동네 안으로 들어섰다. 이만성의 집은 동네 한복판 길가에 자리잡은 초가집이지만, 소위 고래등 같은 3채의 집이었다.
첫눈에 동네 안에서는 첫 손을 꼽는 부유층 소유의 집임믈 알 수 있었다. 부유층인데… 과연 포섭이 가능할까? 두 사람은 굳어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때마침 마당 한복판에서 기웃거리고 있던 이만성(李晩成)이 눈을 크게 뜨며 비호같이 달려나왔다.
“여, 형님들! 기어코 와 주셨군요, 두시간 전부터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당 한복판에서 벌을 서보긴 난생 처음입니다.”
이만성은 다짜고짜 한 손에 하나씩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세차게 흔들어대며 호들갑을 떨었다.
“미안하네, 급한 사정이 있어서 약속시간 못 지키고 지각을 한 셈일세, 본의 아니게 벌을 세게 해서 면목이 없네, 사과함세, 그러니까 쪽지는 제대로 전달이 된 셈이었군!
혹시 쪽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자네가 외출이라도 해버렸다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었는데…. 정말 반가우이.
도대체 이게 몇 년만인가? 조국이 해방된 뜻깊은 시기에 우리 세사람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 이건 예삿일이 아니라구. 이보다 더 값진 만남이 어디 있겠어?”
고정관이 자지러지게 감격해하며 걱쭉하니 떠들어댔다.
“자네 얼굴 자네 집에서 대하고 보니 더욱 감회가 새롭구먼, 8·15해방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실감이 나네 그려, 사실은 자네가 내려와 주지 않을까하고 은근히 기다렸었는데…무심한 친구 같으니라구!”
조용석은 스스럼없이 씨부렁거렸지만, 언중유골(言中有骨) 다분히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
“죄송합니다. 두 형님께서 어려운 걸음 하실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며칠 전부터 찾아뵈야겠다고 별러왔습니다만, 짬을 낼 형편이 못 되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휴학을 하고 고향에 돌아온지는 4개월 남짓 되었지요, 두 형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은 때여서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지 형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얘기 한마디 나눌만한 친구 하나 없기 때문이었지요”
이만성은 겸연쩍어 하면서도 하소연하는 목소리로, 슬그머니 변명과 곁들여서 고충을 털어놓았다.
“용석이 이사람 말은 그런 뜨이 아니고, 농담이라니까 농담! 설령 그 사이 자네가 먼저 찾아왔었다 해도 만나기 어려웠을 걸세, 용석이는 늘 서귀포와 제주성내를 들락거리느라 바빴었고, 나는 귀국한지는 20일 남짓 되지만 집에 돌아온지는 5일 밖에 안됐으니까, 그런 그렇고, 부모님은 나가시고 안계신가? 특히 아버님은 꼭 뵈야 할 터인데…”
“여독이 채 풀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시다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가 게셨 더라면 무척 기뻐하실 터인데…마침 문중회 일로 제주성내에 가 계시거든요, 사나흘 후에나 오시게 될 것 같네요, 자, 들어오시지요. 누추한 방입니다만…”
두 사람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막내 동생 같은 수더분함을 이만성은 숨김없이 보여 주었다.
“잠깐! 용석이 자네가 저걸 내려놓구…”
고정관이 한쪽 손을 내밀어 자전거 쪽을 가리켰다, 그제서야 조용석도 생각난 듯 자전거가 세워진 지점을 향해 휘적휘적 걸어갔다.
“막걸리를 구할 수 있을까? 변변치는 않아도 안주감으로 세불곶 포구에 내려가서, 자리돔을 구해가지고 왔네만…. 사실은 늦게 입항한 ‘태우’를 기다리느라고 지각을 했지 뭔가”
“정말 이 못난 동생 쥐구멍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까? 몸 둘 곳을 모르게 하시다니…”
세사람은 곧 방안으로 들어섰다. 이만성의 서재였다. 3면이 책으로 가득 채워진 방-작은 도서관을 떠올리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서재였다. 두 사람은 책장 쪽으로 눈을 돌렸다. 5백여권이 됨직한 이 책들 속에 공산주의 서적은 몇 권이나 끼어 있을까?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