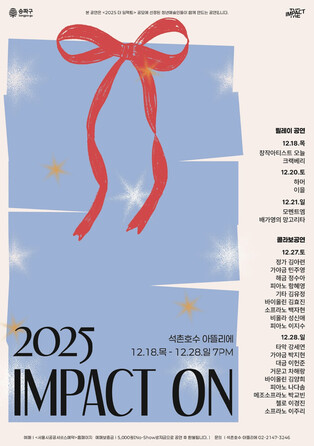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5) 웅변왕, 그 공포의 입
밤 11시(23시)가 넘었는데도 외출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감과 초조감은 더해가기만 했다.
납치-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해도 신경은 납치쪽을 향해 줄달음 칠 뿐이었다. 숨깨나 쉴 줄 아는 외톨이 자식새끼 낳아 기른 죄밖에 없는데, 정체불명의 악당은 어머니를 납치하다니 평화로운 제주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오늘밤 우리 교대로 불침번을 서기로 하세! 납치범은 궁금해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슬그머니 나타나 기웃거릴지도 모른다구. 내가 먼저 눈을 붙어야겠어, 웬일인지 머리가 지끈지끈 깨질 것 같아서, 앉아있을 수가 없네, 새벽 1시까지만 자네가 망을 보다 나를 깨워주게. 그럼, 수고해요!”
고정관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네활개를 뻗어버렸다.
호신용 무기라고는 팔뚝 굵기의 참나무 몽둥이 2개가 준비되어 있을 뿐이었다. 조용석은 한 손으로 몽둥이를 거머쥐었다. 백만대군을 거느린 것처럼 마음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불쑥 고개를 내민 패거리 2∼3명쯤 때려잡는 건 식은죽 먹기와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조용석은 봉창의 창호지에다. 침을 발라 손가락 끝으로 구멍을 뚫었다 망원경을 들이댄 것처럼 어둠 속에 펼쳐지고 있는 10리밖 풍경까지 훤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탐정놀이를 하다니! 천하의 웅변왕이 명탐정으로 직업전환을 하게될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참에 톡톡히 뭔가를 체험하고 터득해 보는 것도 값진 일이라고 생각되자, 졸음도 괴로움도 먼지 털 듯 말끔히 떨어버릴 수가 있었다.
고정관은 어지간히 지치고 피곤한 탓인지 잠버릇이 그래서 그런지, 몸을 자꾸 비비꼬며 품무질을 떠올릴 정도로 요란하게 코를 골아대곤 했다.
잠자는 모습은 눈에 거슬릴 정도로 험상굿은 편이었다.
그러나 잠깐 곁눈질로 살펴보고 이맛살을 찌푸렸을 뿐, 봉창 구멍에서 눈을 떼는 짓 따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땡땡이를 부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되어서 잠들어 있는 고정관을 깨우려는 순간이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소름 끼치는 작은 소리가 퍼뜩 고막 속으로 파고들었다.
흑… 으흐흑… 끊겼다. 이어졌다 하면서 들려오고 잇는 귀기어린 유령의 신음소리! 조용석은 온 신경을 청각에 모으고 있었지만, 봉창에 기울인 눈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상대는 귀신이 아니고 인간일터이기 때문이었다.
흑… 으흐흑… 혹시 환청(幻聽)? 조용석은 넓적다리를 꼬집어 보았다.. 따끔, 번쩍! 살점이 잘려나간 것처럼 아팠고, 두 눈에서는 번갯불이 번쩍거렸다. 환청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다.
그렇다면 어디서 들려오는 무슨 소리란 말인가? 출처와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조용석은 후닥닥 봉창구멍에서 눈을 떼었다. 아직도 험상굿게 잠들어 있는 고정관에게로 성큼 다가섰다.
손가락 끝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다. 꼼짝도 않는다. 두 번째로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아 탄력있게 콱 찍었다. 그제서야 고정관은 불에 덴 듯 화닥닥 뛰어일어났다.
“안면방해를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괴상망측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심상치가 않다구요!”
조용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정관의 귀에다 바싹 입을 대고 말했다.
잠귀가 빠른 고정관은 곧 정색을 한 다음, 소리나는 쪽을 향해 빳빳이 귀를 세웠다가 왕방울만큼 눈을 크게 뜨며 벌떡 일어섰다.
“자, 나를 따라오게, ‘괴팡(庫房)’쪽 이라구”
고정관이 플래시라이트를 집어들고 앞장을 섰다. 곧 ‘괴팡’ 문을 열어 젖히고 불빛을 비췄다. 시커먼 2개의그림자-저쪽 구석에 팽개쳐진 2개의 그림자, 그것은 사람이었다.
순간, 고정관도 조용석도 넋을 잃고 까무러칠 뻔했다. 고정관의 어머니와 조용석의 어머니, 그들의 손과 발은 결박되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었다.
“저녁 6시께 3명의 괴한들이 쳐들어와서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아들을 육지로 내보내지 않으면 다음은 돌 매달아 바다에 쳐넣겠다고 그러더라니까”
고정관의 어머니 윤여인이 헐떡거리며 격한 목소리로 끔찍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밤 11시(23시)가 넘었는데도 외출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감과 초조감은 더해가기만 했다.
납치-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해도 신경은 납치쪽을 향해 줄달음 칠 뿐이었다. 숨깨나 쉴 줄 아는 외톨이 자식새끼 낳아 기른 죄밖에 없는데, 정체불명의 악당은 어머니를 납치하다니 평화로운 제주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오늘밤 우리 교대로 불침번을 서기로 하세! 납치범은 궁금해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슬그머니 나타나 기웃거릴지도 모른다구. 내가 먼저 눈을 붙어야겠어, 웬일인지 머리가 지끈지끈 깨질 것 같아서, 앉아있을 수가 없네, 새벽 1시까지만 자네가 망을 보다 나를 깨워주게. 그럼, 수고해요!”
고정관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네활개를 뻗어버렸다.
호신용 무기라고는 팔뚝 굵기의 참나무 몽둥이 2개가 준비되어 있을 뿐이었다. 조용석은 한 손으로 몽둥이를 거머쥐었다. 백만대군을 거느린 것처럼 마음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불쑥 고개를 내민 패거리 2∼3명쯤 때려잡는 건 식은죽 먹기와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조용석은 봉창의 창호지에다. 침을 발라 손가락 끝으로 구멍을 뚫었다 망원경을 들이댄 것처럼 어둠 속에 펼쳐지고 있는 10리밖 풍경까지 훤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졌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탐정놀이를 하다니! 천하의 웅변왕이 명탐정으로 직업전환을 하게될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참에 톡톡히 뭔가를 체험하고 터득해 보는 것도 값진 일이라고 생각되자, 졸음도 괴로움도 먼지 털 듯 말끔히 떨어버릴 수가 있었다.
고정관은 어지간히 지치고 피곤한 탓인지 잠버릇이 그래서 그런지, 몸을 자꾸 비비꼬며 품무질을 떠올릴 정도로 요란하게 코를 골아대곤 했다.
잠자는 모습은 눈에 거슬릴 정도로 험상굿은 편이었다.
그러나 잠깐 곁눈질로 살펴보고 이맛살을 찌푸렸을 뿐, 봉창 구멍에서 눈을 떼는 짓 따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땡땡이를 부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되어서 잠들어 있는 고정관을 깨우려는 순간이었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소름 끼치는 작은 소리가 퍼뜩 고막 속으로 파고들었다.
흑… 으흐흑… 끊겼다. 이어졌다 하면서 들려오고 잇는 귀기어린 유령의 신음소리! 조용석은 온 신경을 청각에 모으고 있었지만, 봉창에 기울인 눈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상대는 귀신이 아니고 인간일터이기 때문이었다.
흑… 으흐흑… 혹시 환청(幻聽)? 조용석은 넓적다리를 꼬집어 보았다.. 따끔, 번쩍! 살점이 잘려나간 것처럼 아팠고, 두 눈에서는 번갯불이 번쩍거렸다. 환청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었다.
그렇다면 어디서 들려오는 무슨 소리란 말인가? 출처와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조용석은 후닥닥 봉창구멍에서 눈을 떼었다. 아직도 험상굿게 잠들어 있는 고정관에게로 성큼 다가섰다.
손가락 끝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다. 꼼짝도 않는다. 두 번째로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아 탄력있게 콱 찍었다. 그제서야 고정관은 불에 덴 듯 화닥닥 뛰어일어났다.
“안면방해를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괴상망측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심상치가 않다구요!”
조용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정관의 귀에다 바싹 입을 대고 말했다.
잠귀가 빠른 고정관은 곧 정색을 한 다음, 소리나는 쪽을 향해 빳빳이 귀를 세웠다가 왕방울만큼 눈을 크게 뜨며 벌떡 일어섰다.
“자, 나를 따라오게, ‘괴팡(庫房)’쪽 이라구”
고정관이 플래시라이트를 집어들고 앞장을 섰다. 곧 ‘괴팡’ 문을 열어 젖히고 불빛을 비췄다. 시커먼 2개의그림자-저쪽 구석에 팽개쳐진 2개의 그림자, 그것은 사람이었다.
순간, 고정관도 조용석도 넋을 잃고 까무러칠 뻔했다. 고정관의 어머니와 조용석의 어머니, 그들의 손과 발은 결박되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었다.
“저녁 6시께 3명의 괴한들이 쳐들어와서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아들을 육지로 내보내지 않으면 다음은 돌 매달아 바다에 쳐넣겠다고 그러더라니까”
고정관의 어머니 윤여인이 헐떡거리며 격한 목소리로 끔찍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