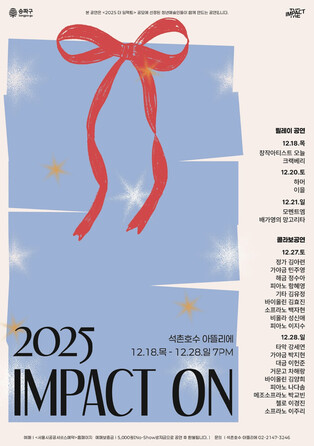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14) 웅변왕, 그 공포의 입
“관광면장 타도! 제 1단계 작전계획은 세워졌어. 자, 이제 한잔씩 할까?”
고정관의 제안에, “좋습니다. 역사적인 거사를 앞두고 한잔 안 할 수 없지요”
조용석이 들 뜬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건배!”
이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모두들 술잔을 들어올려 딸그락 부딪치며 ‘건배’를 복창했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갔을 때, “어이, 김군! 방준태는 어떤 인간이었나?” 하고, 김순익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조용석이었다.
“내손에 백번 죽어 싼 놈이지요.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해외로 내빼려다 나에게 덜미 잡힌거요. 방정맞게 해녀하나가 나타나 구출작전을 폈잖아. 해녀를 붙잡으려는 순간, 자리돔 사러 간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우리는 부리나케 뺑소니를 치고 말았지만, 녀석의 생사문제가 궁금해요. 해녀 덕에 목숨을 부지했을 수도…”
김순익은 치를 떨다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은 어제 형님과 내가 그 장면을 목격했었다구, 녀석은 어쩌면 구사일생으로 되살아났을게야. 해녀가 구세주노릇 했을 테니까”
김순익의 말에 동조하면서 조용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애(金貞愛)라고 그년이 방준태를 살렸고, 동행한 여인은 손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회생을 못 했다지 뭔가. 내가 다 알아보았다니까”
이현석의 말이었다.
“그럼, 방준태는 병원에 가 있나?”
김순익이 와들와들 몸을 떨며 험악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퉁명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입원하지 않고, 그 화냥년의 집 안방 아랫목에서 제구실은 포기한 채 호강을 하고 있어.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구”
이현석이 가시 돋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 당장 연놈들을 끌어내 요절을 내고 말겠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니, 김정애 그 년의 오동포동 살찐 아랫도리 홀딱 벗겨 넓적다리 밑동을 갈가리 찢어발기지 못하면, 성을 갈고 말테니까.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구!”
김순익은 벌떡 일어섰다. 광적인 흥분상태였다. 세사람은 그를 주저앉히는 데 진땀을 뺐다.
“이것봐, 김군! 개인행동은 금물일세. 냉정하고 침착하고 지혜로워야 할 때잖아? 우리 다같이 뜻을 모으고 행동통일하자 이 말일세”
고정관이 어깨를 토닥이며 차분히 타일렀다.
“자, 한잔 쭈욱 들라구! 벌레하나잡기 위해 소 잡는 큰 칼을 휘둘러서야 되겠어? 그나저나 방준태, 그자는 어떤자인데…좀 얘기해주게. 참고로 듣고 싶구. 어떻습니까 형님은…?”
조용석이 미심쩍은 듯 고정관의 동의를 구했다.
“좋아, 우리 그 얘기 듣기로 하세, 대충은 알 것 같네만, 김군, 자네 입으로 직접 들려주었으면 좋을 것 같네”
고정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김순익은 단숨에 술 한잔을 비우고 나서, “방준태, 그 놈은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철천지원수랍니다. 아버지를 징용으로 내보내 북해도 탄광에서 돌아가시게 했고, 누이동생까지 죽인 놈이 그놈이란 말입니다.”
입에 게거품 물고 몸을 떨며 울먹거렸다.
“아버님에 관한 얘긴 알고 있었네만, 누이동생까지 죽게 하다니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 그 관계는 모르고 있었잖아”
이현석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덩달아 몸을 떨었다.
“16살밖에 안된 누이동생을 짓밟아 죽여버렸지 뭔가. 면소재지 ‘연성소’에 강제로 집어넣어 훈련받게 만들고, 저녁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덮쳐서 몸을 빼앗아 버린게야. 여동생은 나에게 하소연하면서 밤새 울부짖다가 뒤뜰 감나무에 목을 매고 말았어. 내 가슴속엔 온통 피로 응어리가 지고 말았지. 그냥 안둘게야”
김순익은 복받쳐 울기 시작했다. 슬픔과 분함과 아픔이 뒤얽힌 그야말로 오뉴월 서릿발 같은 눈물이었다.
세사람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곧 있을 역사적인 거사, 그것의 성공만이 값진 처방전임을 다짐하고, 세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한남마을로 되돌렸다.
“관광면장 타도! 제 1단계 작전계획은 세워졌어. 자, 이제 한잔씩 할까?”
고정관의 제안에, “좋습니다. 역사적인 거사를 앞두고 한잔 안 할 수 없지요”
조용석이 들 뜬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건배!”
이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모두들 술잔을 들어올려 딸그락 부딪치며 ‘건배’를 복창했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갔을 때, “어이, 김군! 방준태는 어떤 인간이었나?” 하고, 김순익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조용석이었다.
“내손에 백번 죽어 싼 놈이지요. 경계가 느슨한 틈을 타서 해외로 내빼려다 나에게 덜미 잡힌거요. 방정맞게 해녀하나가 나타나 구출작전을 폈잖아. 해녀를 붙잡으려는 순간, 자리돔 사러 간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우리는 부리나케 뺑소니를 치고 말았지만, 녀석의 생사문제가 궁금해요. 해녀 덕에 목숨을 부지했을 수도…”
김순익은 치를 떨다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은 어제 형님과 내가 그 장면을 목격했었다구, 녀석은 어쩌면 구사일생으로 되살아났을게야. 해녀가 구세주노릇 했을 테니까”
김순익의 말에 동조하면서 조용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애(金貞愛)라고 그년이 방준태를 살렸고, 동행한 여인은 손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회생을 못 했다지 뭔가. 내가 다 알아보았다니까”
이현석의 말이었다.
“그럼, 방준태는 병원에 가 있나?”
김순익이 와들와들 몸을 떨며 험악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퉁명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입원하지 않고, 그 화냥년의 집 안방 아랫목에서 제구실은 포기한 채 호강을 하고 있어.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구”
이현석이 가시 돋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 당장 연놈들을 끌어내 요절을 내고 말겠어.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다니, 김정애 그 년의 오동포동 살찐 아랫도리 홀딱 벗겨 넓적다리 밑동을 갈가리 찢어발기지 못하면, 성을 갈고 말테니까.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구!”
김순익은 벌떡 일어섰다. 광적인 흥분상태였다. 세사람은 그를 주저앉히는 데 진땀을 뺐다.
“이것봐, 김군! 개인행동은 금물일세. 냉정하고 침착하고 지혜로워야 할 때잖아? 우리 다같이 뜻을 모으고 행동통일하자 이 말일세”
고정관이 어깨를 토닥이며 차분히 타일렀다.
“자, 한잔 쭈욱 들라구! 벌레하나잡기 위해 소 잡는 큰 칼을 휘둘러서야 되겠어? 그나저나 방준태, 그자는 어떤자인데…좀 얘기해주게. 참고로 듣고 싶구. 어떻습니까 형님은…?”
조용석이 미심쩍은 듯 고정관의 동의를 구했다.
“좋아, 우리 그 얘기 듣기로 하세, 대충은 알 것 같네만, 김군, 자네 입으로 직접 들려주었으면 좋을 것 같네”
고정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김순익은 단숨에 술 한잔을 비우고 나서, “방준태, 그 놈은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철천지원수랍니다. 아버지를 징용으로 내보내 북해도 탄광에서 돌아가시게 했고, 누이동생까지 죽인 놈이 그놈이란 말입니다.”
입에 게거품 물고 몸을 떨며 울먹거렸다.
“아버님에 관한 얘긴 알고 있었네만, 누이동생까지 죽게 하다니 그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 그 관계는 모르고 있었잖아”
이현석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덩달아 몸을 떨었다.
“16살밖에 안된 누이동생을 짓밟아 죽여버렸지 뭔가. 면소재지 ‘연성소’에 강제로 집어넣어 훈련받게 만들고, 저녁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덮쳐서 몸을 빼앗아 버린게야. 여동생은 나에게 하소연하면서 밤새 울부짖다가 뒤뜰 감나무에 목을 매고 말았어. 내 가슴속엔 온통 피로 응어리가 지고 말았지. 그냥 안둘게야”
김순익은 복받쳐 울기 시작했다. 슬픔과 분함과 아픔이 뒤얽힌 그야말로 오뉴월 서릿발 같은 눈물이었다.
세사람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곧 있을 역사적인 거사, 그것의 성공만이 값진 처방전임을 다짐하고, 세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을 한남마을로 되돌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