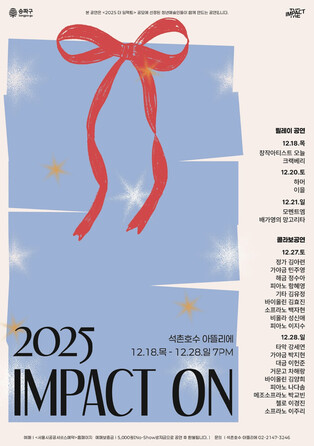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7) 7년 가꾼 순정의 꽃
괴한들은 그날 밤 동서로 쭉 뻗은 널따란 길 위를 거드름 피우며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었다.
이만성은 미행거리를 좁혔다.
동남마을 중심부 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괴한들은 홱 몸을 돌려 북쪽으로 트인 뒷골목안으로 그림자를 감췄다.
그러나 이만성은 그들을 놓칠 리 없었다. 네 굽을 놓아 바싹 다가갔다.
조그마한 갈림길이 나왔고, 바로 모퉁이에는 구멍가게 하나가 자리잡고 있었다.
괴한들은 구멍가게에서 30m쯤 떨어진 지점의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음, 저 집이 그치들의 본거지였구나! 이만성은 다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신발을 신고, 천천히 구멍가게 쪽으로 걸어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경질적인 여인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이만성은 입맛을 다시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먹고 싶지도 않은 과자와 음료수를 샀다. 여인에게 말을 걸고 환심을 사기 위해 택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
“저, 아주머니! 말씀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서귀포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마을에 왔거든요. 그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고 누구를 만나야겠다면서 저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구요. 이 마을에서 몇째 안가는 부잣집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이 살고 있는 집인가요? 짜아식들! 묻는 말에 대꾸도 않고 사라져버렸으니…”
지나가는 식으로 던진 질문이었지만, 여인은 예감이 안 좋은 듯, 아래위를 싹 훑어보고 나서, “함께 온 친구들이 저 집으로 들어갔다구요? 그리고…서귀포에서 왔다구요?”
말꼬리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을 낌새다.
“혹시 이 마을 구장님 댁인가요?”
쫓기는 심정이 된 이만성은 임기응변식으로 다급하게 되물었다.
“서귀포 사람들은 저 집을 모르지 않는데…? 함께 온 친구들 무턱대고 들어갔나요?”
다분히 시비쪼에 가까운 껄끄러운 말투다.
‘주객전도’라더니, 질문을 던진 쪽이 오히려 되받는 입장으로 그 위치가 반전되고 만 셈이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라고 깔보며 무시하는 모양인데, 넘어야 할 고비는 이런 곳에도 가로놓여있었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에잇, 더러워서….
저걸 그냥! 그러나 이만성은 참는 것만이 미덕임을 문득 깨닫고는 히죽 웃어버렸다.
“강영범(姜英範-28)씨라고 유명한 분이죠. 서귀포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요? 동경제국대학에 수석입학, 수석 졸업한 수재 강영범하면 일본에서도 다 알고 있나봐요. 일본의 총리대신이 친히 제국대학에 찾아가서 격려까지 해줬다는 얘기 신문에도 났었다잖아요”
여인은 오만방자한 목소리로 눈알까지 부라리며 기염 아닌 기염을 토했다. 흥, 웃기고 있네! 죽는 날까지 구멍가게 신세 면치 못하겠다는 신음소리로 밖에 이만성의 귀엔 들리 않았다.
“아, 그래요? 나는 무식해놔서 알 턱이 없지요. 알려고도 안했구…. 그렇게 훌륭한 사람의 집일 줄이야. 그래 그 양반 요즈음 8·15해방을 맞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보나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니…? 아무리 무식하다 한들 함부로 악담을 …. 매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바람에 집을 비울 겨를이 없었다잖아요. 새 시대를 맞아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큰 일 해볼 모양이던데…”
“아, 그래요? 나와 함께 온 그 친구들 그 집으로 들어간지 2시간도 더 되었거든요. 아까 들어간 3명의 청년들은 가족들인가요? 그 청년들의 얼굴 보셨겠지요? 아주머니도…”
“봤어요. 가족이 아니라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죠. 강선생의 한쪽팔이나 다름없는…”
“세 사람 모두 동남마을 청년들입니까?”
“두 사람은 가까운 괸당들이고, 하나는 사돈뻘되는 청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친구들 왜 나오지 않고 뭘 하고 있나? 의리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구!”
이만성은 입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때였다. 문제의 괴한들이 대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이만성은 번개같이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다. 네거리로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자 괴한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만성은 히죽 웃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괴한들은 그날 밤 동서로 쭉 뻗은 널따란 길 위를 거드름 피우며 휘적휘적 걸어가고 있었다.
이만성은 미행거리를 좁혔다.
동남마을 중심부 네거리에 이르렀을 때, 괴한들은 홱 몸을 돌려 북쪽으로 트인 뒷골목안으로 그림자를 감췄다.
그러나 이만성은 그들을 놓칠 리 없었다. 네 굽을 놓아 바싹 다가갔다.
조그마한 갈림길이 나왔고, 바로 모퉁이에는 구멍가게 하나가 자리잡고 있었다.
괴한들은 구멍가게에서 30m쯤 떨어진 지점의 거대한 기와집 대문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음, 저 집이 그치들의 본거지였구나! 이만성은 다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신발을 신고, 천천히 구멍가게 쪽으로 걸어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경질적인 여인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이만성은 입맛을 다시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먹고 싶지도 않은 과자와 음료수를 샀다. 여인에게 말을 걸고 환심을 사기 위해 택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
“저, 아주머니! 말씀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서귀포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마을에 왔거든요. 그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고 누구를 만나야겠다면서 저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구요. 이 마을에서 몇째 안가는 부잣집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이 살고 있는 집인가요? 짜아식들! 묻는 말에 대꾸도 않고 사라져버렸으니…”
지나가는 식으로 던진 질문이었지만, 여인은 예감이 안 좋은 듯, 아래위를 싹 훑어보고 나서, “함께 온 친구들이 저 집으로 들어갔다구요? 그리고…서귀포에서 왔다구요?”
말꼬리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을 낌새다.
“혹시 이 마을 구장님 댁인가요?”
쫓기는 심정이 된 이만성은 임기응변식으로 다급하게 되물었다.
“서귀포 사람들은 저 집을 모르지 않는데…? 함께 온 친구들 무턱대고 들어갔나요?”
다분히 시비쪼에 가까운 껄끄러운 말투다.
‘주객전도’라더니, 질문을 던진 쪽이 오히려 되받는 입장으로 그 위치가 반전되고 만 셈이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라고 깔보며 무시하는 모양인데, 넘어야 할 고비는 이런 곳에도 가로놓여있었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 에잇, 더러워서….
저걸 그냥! 그러나 이만성은 참는 것만이 미덕임을 문득 깨닫고는 히죽 웃어버렸다.
“강영범(姜英範-28)씨라고 유명한 분이죠. 서귀포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요? 동경제국대학에 수석입학, 수석 졸업한 수재 강영범하면 일본에서도 다 알고 있나봐요. 일본의 총리대신이 친히 제국대학에 찾아가서 격려까지 해줬다는 얘기 신문에도 났었다잖아요”
여인은 오만방자한 목소리로 눈알까지 부라리며 기염 아닌 기염을 토했다. 흥, 웃기고 있네! 죽는 날까지 구멍가게 신세 면치 못하겠다는 신음소리로 밖에 이만성의 귀엔 들리 않았다.
“아, 그래요? 나는 무식해놔서 알 턱이 없지요. 알려고도 안했구…. 그렇게 훌륭한 사람의 집일 줄이야. 그래 그 양반 요즈음 8·15해방을 맞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보나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니…? 아무리 무식하다 한들 함부로 악담을 …. 매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바람에 집을 비울 겨를이 없었다잖아요. 새 시대를 맞아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큰 일 해볼 모양이던데…”
“아, 그래요? 나와 함께 온 그 친구들 그 집으로 들어간지 2시간도 더 되었거든요. 아까 들어간 3명의 청년들은 가족들인가요? 그 청년들의 얼굴 보셨겠지요? 아주머니도…”
“봤어요. 가족이 아니라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죠. 강선생의 한쪽팔이나 다름없는…”
“세 사람 모두 동남마을 청년들입니까?”
“두 사람은 가까운 괸당들이고, 하나는 사돈뻘되는 청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친구들 왜 나오지 않고 뭘 하고 있나? 의리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구!”
이만성은 입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때였다. 문제의 괴한들이 대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이만성은 번개같이 가게 밖으로 뛰쳐나왔다. 네거리로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자 괴한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만성은 히죽 웃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