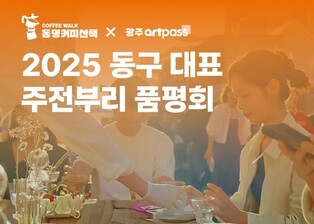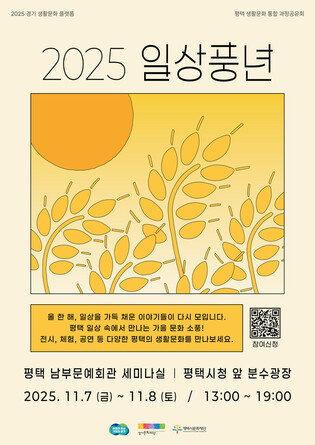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마지막 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다.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쌀 개방카드를 꺼내들었고, 지금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최종협상에서는 이 쌀 개방을 더욱 밀어붙일 태세이다. 우리의 협상카드를 익히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쌀을 지렛대로 쇠고기 개방 등
한국에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일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노 대통령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FTA를 체결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의 말을 진실에 가깝게 해석하려면 협상이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은 정반대로 진행되어 빅딜을 위한 종착역이 눈앞에 와있는 시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농업, 섬유, 자동차, 방송통신 등의 쟁점이 남아있으나 협상팀에게 이것저것 눈치보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충고로 다가온다.
필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40여명은 지난 16일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고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100개 넘는 국내법을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밀스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왜 관련사업의 피해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협상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정부는 통상협상의 준비는 물론이고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규모와 대책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로 농업생산이 최소 2조원 감소하고 대미수입이 189%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농업인은 농업이 붕괴한다고 외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농민 14만명이 거덜나고, 피해규모가 수십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을 농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동안 정부는 농업정책과 농민정책을 구분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농업정책은 산업정책으로, 농민정책은 사회복지적 정책으로서 말이다. 이런 시각에서 농업정책은 대농과 전업농을 집중 지원해 왔고, 농민정책은 소득이 낮고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영세소농과 고령 농가는 털어내고 정예부대만 키워도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처럼 고령농가가 순순히 퇴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퇴출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정부는 60세가 넘은 농업인이 60퍼센트가 넘으므로 10년 이내에는 고령농의 은퇴로 농업구조에 빅뱅이 올 것을 기대하겠지만, 정부계획은 기대로 끝날 것이다. 그들이 은퇴하고 그 경작지를 다른 사람들이 늘려간다고 치자. 그래도 고작 1000평 남짓 늘어난다. 이게 과연 규모의 농업경제라 할 수 있는가? 영세 고령농이 농업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정책적 판단은 오류다. 최고의 농촌복지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젊고, 지식으로 무장한 농가들이 경영마인드로 무장해 농촌을 이끌고, 고령의 영세농가들이 그 틈을 메우면 농촌은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령농가들은 농촌의 자원이 된다. 농업, 농민정책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쌀 개방카드를 꺼내들었고, 지금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최종협상에서는 이 쌀 개방을 더욱 밀어붙일 태세이다. 우리의 협상카드를 익히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쌀을 지렛대로 쇠고기 개방 등
한국에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일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노 대통령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FTA를 체결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의 말을 진실에 가깝게 해석하려면 협상이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은 정반대로 진행되어 빅딜을 위한 종착역이 눈앞에 와있는 시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농업, 섬유, 자동차, 방송통신 등의 쟁점이 남아있으나 협상팀에게 이것저것 눈치보지 말고 밀어붙이라는 충고로 다가온다.
필자를 포함한 국회의원 40여명은 지난 16일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고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100개 넘는 국내법을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밀스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왜 관련사업의 피해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협상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정부는 통상협상의 준비는 물론이고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규모와 대책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로 농업생산이 최소 2조원 감소하고 대미수입이 189%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농업인은 농업이 붕괴한다고 외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농민 14만명이 거덜나고, 피해규모가 수십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을 농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동안 정부는 농업정책과 농민정책을 구분하는 정책을 구사했다. 농업정책은 산업정책으로, 농민정책은 사회복지적 정책으로서 말이다. 이런 시각에서 농업정책은 대농과 전업농을 집중 지원해 왔고, 농민정책은 소득이 낮고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영세소농과 고령 농가는 털어내고 정예부대만 키워도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처럼 고령농가가 순순히 퇴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퇴출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정부는 60세가 넘은 농업인이 60퍼센트가 넘으므로 10년 이내에는 고령농의 은퇴로 농업구조에 빅뱅이 올 것을 기대하겠지만, 정부계획은 기대로 끝날 것이다. 그들이 은퇴하고 그 경작지를 다른 사람들이 늘려간다고 치자. 그래도 고작 1000평 남짓 늘어난다. 이게 과연 규모의 농업경제라 할 수 있는가? 영세 고령농이 농업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정책적 판단은 오류다. 최고의 농촌복지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젊고, 지식으로 무장한 농가들이 경영마인드로 무장해 농촌을 이끌고, 고령의 영세농가들이 그 틈을 메우면 농촌은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령농가들은 농촌의 자원이 된다. 농업, 농민정책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