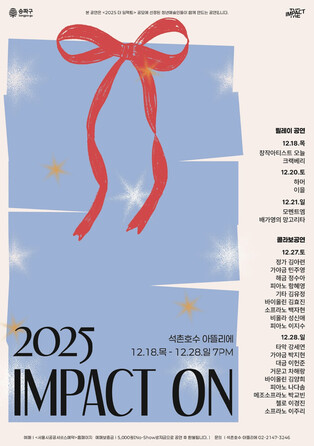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 임학박사 정남철 |
산림을 벌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벌채방법을 택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늘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시각적으로 안정적이면서 탄소저장능력과 계류수의 수질환경, 종(種) 다양성, 임업적인 생산성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인위적 임업활동 등 인간의 간섭 없이 발아, 생장, 경쟁, 천이, 고사의 산림생태계 과정이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원시림‧천연림을 장생림(長生林, Old-growth-forests)이라 부른다.
오늘날 전 세계 산림 면적의 23%만이 온전한 장생림으로 분류돼 있고, 대부분 열대우림과 한대림에 남아 있다(Green-peace, 2006). 장생림은 원시자연의 심미적 경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전자원 보존, 목재 외 임산부산물 생산, 야생동물 서식지(사냥 및 생태 관광)제공, 탄소저장, 홍수 및 침식 방지의 역할을 한다.
산림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극상림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산림생태복원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오늘 날 우리 산림에는 인간의 개입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그에 따라 생태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림의 생태 복원 과정에서 장생림은 동일한 위도와 고도에서 원시 생태계의 전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전까지 연구에서 장생림은 전지구적 탄소수지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서로 같아 중립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수간에서 0.4±0.1 tC/ha/yr, 수목잔재목에서 0.7±0.2 tC/ha/yr, 뿌리와 토양유기물에서 1.3±0.8 tC/ha/yr인 약간의 탄소저장격리를 한다고 밝혀졌다(Lsuysaert et al. 2008. Nature letters). 대표적인 침엽속성수인 테다소나무가 14.1 tC/ha/yr와 활엽속성수 유칼리나무가 19.7 tC/ha/yr (Silveira et al. 2020)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분류기준에 적합한 장생림은 전체 산림의 24.6%에 해당하며 국립공원, 유전자원보전림, 수자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사찰림, 어부림, 당숲 등 공익용보전산지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나머지 75%인 임업용보전산지(50%), 준보전산지(25%)에서만 산림사업이 가능하다. 산림의 지속적인 탄소저장능력을 위해서는 미미한 수준의 기능을 해내는 장생림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임업용보전산지·준보전산지에서 산림사업을 통해 탄소격리저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탄소저장능력이 우수한 수종을 선발해 조림과 벌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림녹화의 성과를 통해 이룩한 녹색환경에서 국민은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벌채를 이행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산림청, 지자체 산림부서, 임업인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업인과 일반국민 또는 환경론자 모두가 수용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벌채방법, 즉 탄소저장격리능력을 유지하면서,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심미적이고, 종(種)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는 벌채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산림을 벌채해 수관 틈(Gap)을 형성시켜 뿌리를 인위적으로 전부 제거한 뒤, 산림토양에서 공기 중으로 유출돼 나오는 CO2(SEC, Soil Efflux Carbon)를 측정해 봤다.
원래 수목의 뿌리에서 발생하는 토양유출CO2량(SEC)이 각각 독일의 너도밤나무에서는 40%, 일본의 낙엽활엽수에서는 51%씩 줄어들었다.
일본의 낙엽활엽수림의 경우 토양유출CO2량(SEC)을 산정하기 위해 모두베기(개벌, 皆伐, Clear cutting)한 후 측정해보니 토양 중의 살아 있는 뿌리와 공생균근에 의해 51%, 죽은 뿌리가 있는 토양층 내의 유기물 분해로 21%, 임상(林床, Forest floor)에 쌓인 낙엽의 분해로 28%가 발생했다(Hanson et al. 2000).
산림 벌채 시에는 연간 유기물 유입량에 비해 더 많은 양이 토양에 도달하는데, 동시에 벌채로 수관이 제거돼 근계로 부터 삼출물의 방출이 차단되고 유기물의 유입량이 감소하므로 새로운 수목이 자랄 때까지 토양유출CO2량(SEC)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수관에서 만들어지는 광합성산물을 근계에서 양분으로 사용하는 공생균과 근권 미생물이 개벌로 인해 오히려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토양유출CO2량(SEC)이 40∼51%가 억제되고, 벌채로 노출된 임지가 건조돼 임상층의 낙엽분해로 발생하는 토양유출CO2량(SEC)의 28%가 억제돼, 이론적으로 산림 벌채로 인해 전체 토양유출CO2량(SEC)은 40%∼79%가 다시 숲이 형성될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벌채 후 첫 번째 해에는 벌채로 임상에 유입된 유기물의 분해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탄소량이 지피식물에 의한 유기물 유입량보다 더 많다(Covington 1981). 또한 벌채로 인해 나무 수관이 제거되면 토양 온도와 수분 함량이 증가(Bormann et al. 1974, Toland and Zak 1994)해 미생물의 활동에 좋은 조건이 돼(Gadgil and Gadgil 1978) 유기물 분해가 증가한다.
토양탄소저장량(SCS, Soil Carbon Storage)은 증가된 분해활동과 벌목잔존물이 토양에 유입돼 순증가의 효과를 보인다. 벌채로 인해 유기물의 분해는 증가하고 동시에 뿌리와 근권의 호흡량이 감소한다(Bowden et al. 1993, Nakane et al. 1996). Lytle and Cronan(1998)은 벌채 후 더 높은 토양유출CO2량(SEC)을 보고한 반면 Edwards and Ross-Todd(1983)와 Nakane et al.(1996)은 그 반대의 결과를 발견하기도 했다. Fernandez et al. (1993) 의하면 벌채 후 토양유출CO2량(SEC)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연구결과 구주소나무-독일가문비림에서 개벌과 벌목 잔존물을 모두 제거했을 경우에는 토양표면으로 부터의 CO2(SEC) 순간유출량이 40%까지 감소하기도 했다(Pumpanen et al. 2004). 이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온대림 토양탄소저장 기능에 대한 벌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432개의 연구 자료를 메타분석한 결과, 미벌채 30년∼200년 산림을 대조구로 하고, 벌채된 산림, 즉 간벌 및 개벌로 벌채한 곳에서 토양저장탄소(SCS)인 목재, 낙엽, 풀잎이 완전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유기물 상태로 저장된 것을 측정했다.
그 결과 산림을 벌채하면 임상층 내 유기물의 탄소저장(SCS)량만 30%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상층 내 유기물의 탄소저장(SCS)량은 침활혼효림에서 20%, 활엽수림에서 35% 각각 감소해, 전체적으로 온대림에서 약 30%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토양층 내 탄소저장(SCS)량은 벌채 이후 큰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므로 토양 전체에서의 탄소저장(SCS)량은 벌채 이후 약 7.6%정도만 감소했다.
그리고 임상층 내 유기물의 탄소저장(SCS)량이 벌채 전으로 회복하는 데 한대성 토양(Podsol)은 벌채 이후 80년이 걸렸지만, 온대성 점토질토양(Alfisol), 풍화토(Inceptisol), 적색토(Ultisol)는 벌채 이후 20년 이내에 회복했다.
또한, 임상층 내 유기물의 탄소저장(SCS)량은 토양층 내 유기물의 탄소저장(SCS)량에 비해서 아주 적은 양(4배 차이)이기 때문에 벌채에 의한 전체적인 온대 산림의 탄소저장(SCS)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Nave et al. 2010). 특히, 이 자료에서 한대지역의 자료를 빼면 개벌전후로 온대 산림토양의 탄소저장(SCS) 능력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온대림에서는 개벌과 같은 극단적 산림벌채 전후로 토양저장탄소(SCS)량과 토양유출탄소(SCE)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임업생산성, 탄소저장격리능력 향상, 지위지수를 산정한 식재, 환경친화적 계류보전, 심미적 경관 유지, 종 다양성을 추구하는 생태복원을 고려한 개벌 벌채방법을 제안해 본다.
산림에서는 광합성작용으로 낙엽, 가지, 수피가 매년 지상부 토양에 유입되고 그것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빗물 또는 안개에 포함된 양분이 결합되므로 산림토양은 인공적 시비를 하지 않아도 비옥한 토양으로 변한다. 이것을 자가시비(自家施肥)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은 경사가 급한 산악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인 양분은 빗물에 의해 산능선(산정, 山頂)에서부터 산복(山腹)과 산기슭(산록,山麓)으로 씻겨 내려간 후 축적되므로 산정부에는 양분이 없다.
따라서 산정부에서 자란 나무는 산기슭에서 자란 나무보다 수고가 2∼3배정도 낮게 자란다.
이런 임지는 임업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척박한 토양은 벌채하여 새로운 수종을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조림수종이 잘 자라지 못할 것이므로 그보다는 이미 자라고 있는 수목 아래에 종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식생환경을 고려한 깃대종 복원을 위한 생태복원 시업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곳도 임가(林家)를 위한 벌채면적에 포함시켜, 미 벌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생태복원면적 또한 조림면적에 포함시켜 조림단가를 현실화해 줘야한다.
계류와 인접한 곳은 벌채를 억제해 수질정화와 하천 및 농경지로 부유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경사가 급한 산의 경우 7부 능선 이상은 벌채를 절제해 개벌로 인한 경관의 심미적 상실감을 방지해야 하고, 벌채 시 현존 식생의 생장상태, 지위지수에 의한 토양비옥도와 유효토심을 조사해 벌채지 경계를 획정하고 벌채한다면 산림청, 지자체 산림부서, 환경론자, 임업인, 국민 모두가 만족한 벌채방법이 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