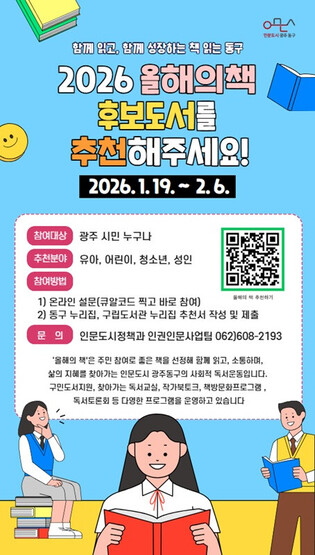|
"혜정아, 보훈청에서 뭐라고 우편이 왔다."
국가유공대상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 가족에게 보훈청에서 문서를 발송했다니,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으나, 이어지는 이야기에 비로소 어떤 공문인지 알 수 있었다.
"네 외할아버지가 참전유공자라고 뭐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처 시절부터 미등록 참전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왔고, 생존해계신 참전유공자의 발굴·등록만이 아니라 등록 전 사망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직권등록을 진행하고 있었다. 비록 등록의 실익은 없을지언정 유족에게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여 참전하신 유공자분들의 공을 기리고 국립묘지 안장이나 지자체 유족수당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었다.
무슨 서류를 어디로 들고 가서 무엇을 발급받아와야 하는지 어머니께 알려드린 후 나는 믿기 어려웠던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외할아버지가 6.25 참전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는 생전에 당신께서 6.25 전쟁에서 군인으로 싸웠노라고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 또한, 자녀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로 발령받아 일하게 되었을 때에도 외할아버지가 참전유공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도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 했지만 그건 아니었단다. 외할아버지께선 총탄에 맞은 상흔도 등과 다리에 두 군데나 있으셨고, (나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직 경상이자 상이등급인 7급도 신설되지 않았고, 참전유공자 등록도 시행되지 않았던 때다) 그 사실을 술에 취했을 때 단 한번, 나의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적 있다고 했다.
"손주들한텐 그런 얘기 하기 싫으셨겠지, 힘들고 아팠던 걸 굳이 얘기하고 싶으셨겠어?"
외할아버지에겐 참전과 부상의 기억이 평생의 아픔이셨을 거라고 했다. 가족들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한 전쟁의 아픔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75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한강에서 낙동강, 다시 한강을 거쳐 압록강, 북위 38선 인근에 이르기까지 숱한 전선의 이동을 반복하였고, 그 격렬한 교전 과정에서 국토와 기간시설이 파괴되고 천만이 넘는 전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유엔군 포함 약 78만명의 한국군이 전사·전상·실종되었다.
그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휴전상태에 이르기까지 이름도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6월 25일을 국가기념일인 6.25전쟁일로 삼아 매년 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2011년 6월부터 매달 ‘이달의 6.25 전쟁영웅’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인물을 조명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25 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특별전 개최하고 ‘보훈퀴즈왕’ 참여형 보훈컨텐츠도 진행한다.
6월25일은 그 역사적·민족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결코 슬프기 만한 날은 아닐 것이다. 수많은 피해와 희생과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영토와 주권을 지켜냈고, 전쟁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전쟁후세대가 물려받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꽃피웠기 때문이다.
6.25전쟁 75주년을 맞이하며 나는, 웃는 얼굴만이 생각 나는 외할아버지를 떠올려본다. 외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의 기억이 그저 고통이기만 했을까, 당신의 손으로 이 땅을 지켜낸 데 대한 보람과 자긍심은 없으셨을까? 어떠한 성취와 성공이 있어도, 전쟁이 우리 민족을 갈퀴고 간 상흔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이 그 아픔보다는 자긍심을 더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여로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