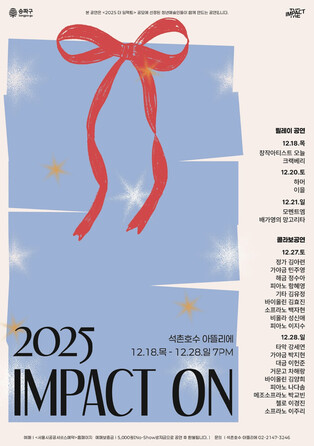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한국형 탐정업!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18년 6월부터 이어진 ‘탐정업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청신호(헌법재판소의 판시 및 경찰청의 행정해석, 신용정보법상 탐정호칭사용금지 해제)’로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는 면면히 이어져 현재 ‘전업탐정(흥신소 등)’ 및 행정사·법무사 등 타 직종 종사자들의 겸업 포함 8000여명이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탐정 직업화’는 가능해졌으나, 아직 탐정(업)을 허용한다거나 지지(支持)한다는 법률적 토대(법제화)를 이루지는 못한 관계로 ‘엉거주춤’ 또는 ‘좌충우돌’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관리법’도 ‘소관청’도 없는 뮤규제 자유업 상태).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남성이 ‘흥신업자에게 50만원을 주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입수, 그 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흉기로 해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탐정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탐정(업)의 일탈 소지(素地)는 동서고금을 통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의 일탈을 원천 차단할 방도를 찾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해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결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9월 8일 이상배 의원이 민간조사업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래 지금까지(17여년 동안) ‘탐정업이 왜 필요한가?’, ‘탐정의 역할 범위’, ‘탐정법 어떻게 제정되야 옳은가?’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국회와 경찰청을 비롯 학계·협회·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53여회에 걸친 공청회·세미나·대토론회 등이 있었다(*소관청 미지정으로 현재 경찰청이 탐정 관련 업무를 잠정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탐정업 도입의 대전제’이자 ‘법제화의 최고 목표’라 할 ‘불법행위 방지’ 관련 묘책은 지금껏 어느 기관, 어느 단체, 누구도 자신 있게 내놓은 게 없다. 통상의 벌칙 외에 ‘상책(上策)이라 할만한 뾰족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입법 주체와 업계·학계 등에서는 탐정(업)을 ‘면허제’ 또는 ‘신고제’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함이 좋을지 등에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있으나, 대중들은 그런 류의 이슈에는 별 관심 없다. 어떤 형태의 법제화가 달성되건 탐정업의 불법·부당을 획기적으로 방지·차단·제어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보는 분위기이다.
위에서 살펴 본 ‘탐정(업)이 지닌 위태성’과 ‘국민적 여망’으로 보아 ‘백 개의 법조문을 잘 다듬었을지라도 알맹이(확고한 불법 차단 장치) 없는 법제화는 그 자체로 두고두고 사회적 우환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필자는 40여년 간의 공·사 정보업무와 탐정학술 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탐정업에서의 ‘불법·부당 등 일탈’ 방지에 엄청난 위력를 발휘할 ‘몰취공탁제’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이 제언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거론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방책이라는 점에서 입법 주체나 업계 그리고 학계의 진지한 검토와 연구를 기대해 본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 공탁소)에 맡기게 함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이며, 몰취공탁(沒取供託)이란 공탁자와 피공탁자 간의 특정 관계에 기인하여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로써 어떤 행위자의 성실한 진술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몰취의 목적물을 국가에 공탁케 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9조②~300조).
즉, ‘몰취공탁제’를 탐정업 관리에도 준용하여, 주무부처의 장(長)이 탐정업자가 영업 개시를 신고 할 때 ‘법률을 준수하여 타인의 권익과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징구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할 공탁금(예: 3000만원 정도)을 국가에 공탁케 하고, 만약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형사처벌(예: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공탁금을 국가에 귀속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 등과는 별개로 취해지는 특단(입법 정책)의 제재로, 탐정활동에 있어 위법행위를 할 경우 한 순간에 거금이 날아가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늘 염두케 하자는 취지이다.
물론 이 방안과 관련,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성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탐정업이라는 직업 자체를 불법시(不法視)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 방지를 위한 업무상 준법 확보 차원의 공탁이라는 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공탁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지 않나 싶다. 또한 ‘공탁금 몰취’도 일방적으로 과해지는 형벌이나 과태료와 달리 계약(합의)의 성격을 띄는 서약에 따라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이중제재(二重制裁)와는 비교된다 하겠다.
특히 이 ‘몰취공탁제’가 도입되면 아무나 탐정업에 진입해 무질서를 낳는 ‘난립’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임은 물론 업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탐정업자’들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준법성과 책임성을 인정 받는 대단한 모멘텀이 되리라 확신한다(미국의 속칭 ‘공인탐정’에 준하는 사회적 인정감). 이와 함께 ‘몰취공탁제’ 적용을 받는 탐정(업)과 ‘제도권 밖의 탐정(무자격·미신고 등)’을 확연히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극 병행되면(‘음성적 탐정 신고포상제’ 등) 한국형 탐정제의 안착은 의외(意外)로 조기 안착이 가능하리라 본다.
한편 탐정업에 있어 ‘신고제’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공인탐정법 열번 만들어도 음성적 탐정 사라질리 만무’하니 차라리 ‘탐정업을 하고 싶은 사람 모두 신고케 하고 이를 엄격히 규율하는 것이 백번 낫다’는 실질론(實質論)과 세계적 경험론에 입각한 탐정업 모델이다(*이 신고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나라가 세계 제1의 탐정업 모범국인 일본이다). 신고제라 하여 아무나 진입할 수 있게 터 놓지 않는다. 특정 범죄 전력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입 차단을 규정해 둘 수 있다. 필자는 이 ‘신고제’에 준법을 담보할 ‘몰취공탁제’의 결합이 한국형 탐정업 모델로 최적할 것임을 거듭 강조해 둔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채용시험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경찰학개론,정보론,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外/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 600여편의 칼럼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