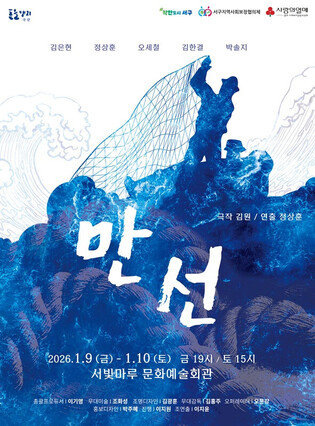{ILINK:1} 시민단체인 한국청년연합회가 최근 서울시 모든 직원에 대해 평소 공무원증을 달지 않고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과에 고발한 것은 전후좌우를 따지기 앞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가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실명제가 대세인 현실에 비춰볼 때 행정서비스를 높인다는 면에서 반드시 패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과 공무원증 규칙에 패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이를 어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철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과 달리 ‘맏형’격인 서울시가 솔선수범하기는 커녕 3년동안 개선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공무원증 패용은 물론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은 투명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민원을 제기했다가 문제가 발생해 책임소재를 가릴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명확히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증 규정 제5조는 공무원증 패용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어겨도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징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부서에 패용하라는 공문을 보내 공무원증 패용을 독려하고 목걸이줄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의 규정, 규칙,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미패용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49조(복종의 의무)와 69조(징계)를 따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체규정에 징계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증 패용은 시민과의 약속이라 볼 수 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갈 때가 진정한 주민행정서비스가 아닐까.
공직자가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실명제가 대세인 현실에 비춰볼 때 행정서비스를 높인다는 면에서 반드시 패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과 공무원증 규칙에 패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이를 어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해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철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과 달리 ‘맏형’격인 서울시가 솔선수범하기는 커녕 3년동안 개선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공무원증 패용은 물론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은 투명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민원을 제기했다가 문제가 발생해 책임소재를 가릴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명확히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무원증 규정 제5조는 공무원증 패용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어겨도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징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각 부서에 패용하라는 공문을 보내 공무원증 패용을 독려하고 목걸이줄을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의 규정, 규칙,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미패용에 대한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49조(복종의 의무)와 69조(징계)를 따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체규정에 징계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증 패용은 시민과의 약속이라 볼 수 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갈 때가 진정한 주민행정서비스가 아닐까.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