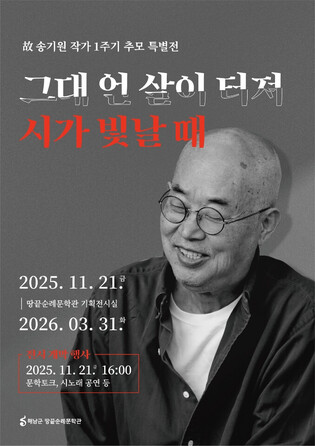{ILINK:1} “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벗어나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의 주장이다.
도대체 ‘로컬 거버넌스’라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역사회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치나 행정을 지방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이 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기업, 학계, NGO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들간에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벗어난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깨어있는 단체장들은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한 각성을 토대로 지역구성 인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모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기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NGO시민단체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로 묶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로컬 거버넌스’의 이름을 ‘지방분권위원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 이름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이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분명한 것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지역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또 지역 관내 대학은 그 이론을 수립해 주고, 시민단체는 기꺼이 지방정부의 사업에 동참,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지방언론은 당연히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방대학,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기능을 맡아주기도 한다.
반면, 이런 개념이 없는 단체장들도 있다.
그들은 지역기업활성화방안에 대해 관심이 없다. 시민단체보다 관변단체를 더 좋아한다. 지방(로컬)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전국지와의 차별성을 모른다.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 말썽을 빚기 일쑤다. 그러니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루어 질리 만무하다.
‘로컬 거버넌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단체장으로 선택한 주민들이 참으로 불쌍타.
전남대 오재일 교수의 주장이다.
도대체 ‘로컬 거버넌스’라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역사회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치나 행정을 지방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실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지역 차원의 새로운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이 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기업, 학계, NGO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들간에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벗어난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깨어있는 단체장들은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한 각성을 토대로 지역구성 인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모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기업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NGO시민단체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로 묶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로컬 거버넌스’의 이름을 ‘지방분권위원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 이름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이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분명한 것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지역기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또 지역 관내 대학은 그 이론을 수립해 주고, 시민단체는 기꺼이 지방정부의 사업에 동참,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한다.
지방언론은 당연히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방대학,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기능을 맡아주기도 한다.
반면, 이런 개념이 없는 단체장들도 있다.
그들은 지역기업활성화방안에 대해 관심이 없다. 시민단체보다 관변단체를 더 좋아한다. 지방(로컬)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전국지와의 차별성을 모른다.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 말썽을 빚기 일쑤다. 그러니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루어 질리 만무하다.
‘로컬 거버넌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단체장으로 선택한 주민들이 참으로 불쌍타.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