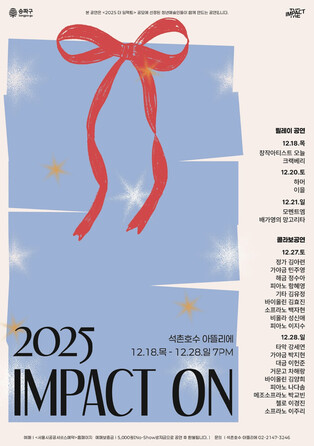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8) 銃대 멘 젊은 ‘괸당'들
이현석은 얼마나 반갑고 기뻤던지 한꺼번에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정신없이 흔들어대며, 굽실거리는 동작 멈추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용석이 이 친구는 가끔 잊을만하면 만나곤 했더랬습니다만, 고정관 선배님은 뵌지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늘 소식은 들었지요. 일본 제 1의 웅변가로서 명성을 떨쳤고, 이왕은(李王垠)이 대학교로 찾아가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는 얘기두요. 그리고 용석이 이 사람도 얼마나 자랑스런 친굽니가?
이 친구는 8·15 해방을 전후해서 조선반도 제 1의 웅변가로 각광을 받아왔잖아요.
여운형 선생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제주여성도 저런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냐고 혀를 내두르며 치켜 세웠을라구요. 우리 한남마을이 낳은 두분께서 새 나라의 대들보가 되어서 제주도는 물론 한남마을을 빛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우연히 노상에서 뵙고 보니 꿈 같기만 합니다”
입에 게거품 물고, 손 아닌 입으로 한꺼번에 두사람을 하늘 높이 헹가래쳤다. 남을 헐뜨긴 쉬워도 칭찬하기란 어려운 것이 세상 인심인데,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예외도 있기야 있겠지?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어렵다 해도, 이현석만은 면종복배(面從腹背)할 그런 사람 같지가 않다.
“자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게,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만 같네, 그리고 더욱 어깨가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다니까. 고맙네. 더욱 노력함세”
조용석이 함박만큼 입을 벌린채 들뜬 목소리로 어설프게 겸손을 떨었다.
“자네는 고향에 남아서 오로지 고향을 위해 몸바쳐 일하고 있다는 얘기 늘 전해듣고 있었더. 맘속으로 건투를 빌며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부모님도 뵙고 그래야 도리인데, 아직 여독도 덜 풀린 상태이고 해서… 양해해 주게. 에또 그건 그렇고, 아까 만났던 그 친구 누구였어? 한남마을 사람 맞지?”
고정관이 얼렁뚱땅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 지나가는 식으로 살짝 핵심을 찔렀다.
“아. 그사람이요? 형님들도 만나보면 잘 아실텐데요. 도선마을에 살고는 잇지만, ‘영재의숙’ 졸업생이지요.
저의 동창이구요. 일행 중 네사람은 면소재지인 ‘관광’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그러던걸요”
이현석은 조금도 망설임없이 본대로 들은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명쾌하게 밝혀주었다.
“아. 영재의숙 출신…? 누구야? 이름이…?”
조용석이 매우 궁금한 듯 다그쳐 캐어 물었다.
“김순익(金順益)이라고 공부도 잘 했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애 있었잖아? 다혈질인데다 정의감을 생활신조로 삼아온 별난 친구-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아. 볼의를 보고는 못 참는 불같은 성격의 사나이라구.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가서 못 돌아오셨다지 뭔가. 전쟁이 끝나자 남들은 살아돌아왔는데도 그의 아버지는 북해도 탄광에서 비명으로 돌아가셨다더군. 자식으로서 얼마나 원통할 일입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얘길 늘어 놓는 것 아니겠어. 정말 측은해 못 보겠더라구요”
이현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었다.
고정관과 조용석은 눈물이 글썽거리려는 것을 꾹 참고, 침통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거렸다.
“정말 슬픈이리이군! 무사히 귀환했다 해도 한이 맺힐 일인데, 목숨을 잃고 영영 돌아오시지 못했으니 가족들의 심정 오죽하겠어?”
“자식된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 전쟁도 원망스럽지만, 친일파? 민족반역자? 고등계형사 끄나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라구”
고정관과 조용석은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다.
“자, 다음 만나세,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노상에서 밑천 떨어질 때까지 회포를 풀 수도 없구.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은 헤어지기로 하세, 금명간 집에서 조용히 만나 많은 얘기 나누기로 하구!”
고정관이 아쉬운 얼굴로 작별할 뜻을 밝히자, “네. 그러지요. 제가 짬을 내어서 두 형님을 집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두사람은 이현석과 헤어졌다. 그리고 자전거에 몸을 싣고 세불곶 쪽으로 내달렸다. 예정대로 포구에 들러 선물용 자리돔을 샀다. 한남 2리의 친구집을 겨냥해서 포섭공작을 펴기 위한 대장정(大長征)의 길에 오를 참이었다.
이현석은 얼마나 반갑고 기뻤던지 한꺼번에 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정신없이 흔들어대며, 굽실거리는 동작 멈추기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용석이 이 친구는 가끔 잊을만하면 만나곤 했더랬습니다만, 고정관 선배님은 뵌지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늘 소식은 들었지요. 일본 제 1의 웅변가로서 명성을 떨쳤고, 이왕은(李王垠)이 대학교로 찾아가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는 얘기두요. 그리고 용석이 이 사람도 얼마나 자랑스런 친굽니가?
이 친구는 8·15 해방을 전후해서 조선반도 제 1의 웅변가로 각광을 받아왔잖아요.
여운형 선생이 얼마나 감동했으면 제주여성도 저런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냐고 혀를 내두르며 치켜 세웠을라구요. 우리 한남마을이 낳은 두분께서 새 나라의 대들보가 되어서 제주도는 물론 한남마을을 빛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우연히 노상에서 뵙고 보니 꿈 같기만 합니다”
입에 게거품 물고, 손 아닌 입으로 한꺼번에 두사람을 하늘 높이 헹가래쳤다. 남을 헐뜨긴 쉬워도 칭찬하기란 어려운 것이 세상 인심인데,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예외도 있기야 있겠지?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어렵다 해도, 이현석만은 면종복배(面從腹背)할 그런 사람 같지가 않다.
“자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게,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만 같네, 그리고 더욱 어깨가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다니까. 고맙네. 더욱 노력함세”
조용석이 함박만큼 입을 벌린채 들뜬 목소리로 어설프게 겸손을 떨었다.
“자네는 고향에 남아서 오로지 고향을 위해 몸바쳐 일하고 있다는 얘기 늘 전해듣고 있었더. 맘속으로 건투를 빌며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부모님도 뵙고 그래야 도리인데, 아직 여독도 덜 풀린 상태이고 해서… 양해해 주게. 에또 그건 그렇고, 아까 만났던 그 친구 누구였어? 한남마을 사람 맞지?”
고정관이 얼렁뚱땅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 지나가는 식으로 살짝 핵심을 찔렀다.
“아. 그사람이요? 형님들도 만나보면 잘 아실텐데요. 도선마을에 살고는 잇지만, ‘영재의숙’ 졸업생이지요.
저의 동창이구요. 일행 중 네사람은 면소재지인 ‘관광’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그러던걸요”
이현석은 조금도 망설임없이 본대로 들은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명쾌하게 밝혀주었다.
“아. 영재의숙 출신…? 누구야? 이름이…?”
조용석이 매우 궁금한 듯 다그쳐 캐어 물었다.
“김순익(金順益)이라고 공부도 잘 했지만, 스포츠를 좋아하는 애 있었잖아? 다혈질인데다 정의감을 생활신조로 삼아온 별난 친구-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아. 볼의를 보고는 못 참는 불같은 성격의 사나이라구.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가서 못 돌아오셨다지 뭔가. 전쟁이 끝나자 남들은 살아돌아왔는데도 그의 아버지는 북해도 탄광에서 비명으로 돌아가셨다더군. 자식으로서 얼마나 원통할 일입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얘길 늘어 놓는 것 아니겠어. 정말 측은해 못 보겠더라구요”
이현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었다.
고정관과 조용석은 눈물이 글썽거리려는 것을 꾹 참고, 침통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거렸다.
“정말 슬픈이리이군! 무사히 귀환했다 해도 한이 맺힐 일인데, 목숨을 잃고 영영 돌아오시지 못했으니 가족들의 심정 오죽하겠어?”
“자식된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 전쟁도 원망스럽지만, 친일파? 민족반역자? 고등계형사 끄나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라구”
고정관과 조용석은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다.
“자, 다음 만나세,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노상에서 밑천 떨어질 때까지 회포를 풀 수도 없구.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은 헤어지기로 하세, 금명간 집에서 조용히 만나 많은 얘기 나누기로 하구!”
고정관이 아쉬운 얼굴로 작별할 뜻을 밝히자, “네. 그러지요. 제가 짬을 내어서 두 형님을 집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두사람은 이현석과 헤어졌다. 그리고 자전거에 몸을 싣고 세불곶 쪽으로 내달렸다. 예정대로 포구에 들러 선물용 자리돔을 샀다. 한남 2리의 친구집을 겨냥해서 포섭공작을 펴기 위한 대장정(大長征)의 길에 오를 참이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