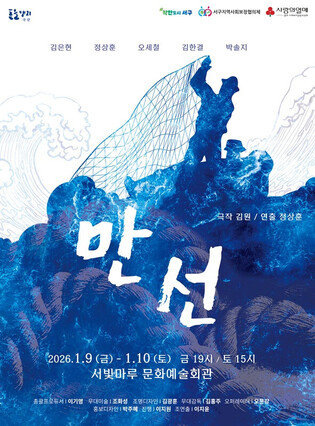{ILINK:1} 얼마 전 포천시청 브리핑 룸에 한 주민이 찾아왔다.
그분은 상기된 얼굴로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여 “기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저희들끼리 돈 벌어 먹기 위해 싸우는데 왜 주민들을 끼워 기사를 쓰느냐”고 따지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요즘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393번지 일대 11필지 총 2만5000여㎡의 농지에 석재가공 폐기물인 석분과 무기성오니를 매립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매립행위는 시에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 높이 5m로 매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업자간 서로의 이권을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싸움은 마치 정치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대방 헐뜯기는 물론이고 허가과정의 문제점과 비리 금품살포, 불법유인물 살포, 없는 말 만들기, 공사현장 감시 등 최대한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 자신들의 치부까지 드러내며 발등을 찍는 일임에도 서슴지 않고 자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오가1·2·3리 이장이나 마을 대표들이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매립공사를 따내지 못한 업체 측의 고자질로 뇌물수수설이 거론되고 있어 요즘 심정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변의 주요골자는 대충 이랬다.
20여년 전 마을에서는 시에 하천부지를 점유할 수 있는 허가를 득했고 엉망이었던 하천부지를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경지정리 한 후 그동안 꼬박꼬박 수십년간 시에 점용료를 바쳐오며 자기 것처럼 아끼고 가꿔 농사를 지어왔으나 수년전부터 낮은 지대인 논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와 농사를 자주 망치게 돼, 시에 매립을 요구했으며 시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석재폐기물로 매립을 허가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매립이 진행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피해보상을 주장, 결국 석재폐기물 단체인 ‘석경회’로부터 각 리에 500만원씩이 지급됐으며 또한 공사마무리 약속에 대한 이행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슨 뇌물 운운하며 기사를 썼냐”는 것이었다.
사실 농사꾼으로서 20여년간 지어온 농지가 석재폐기물로 매립된다면 좋아할 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고 한다.
7000여평에 달하는 농지는 매년 물에 잠기고, 양질의 흙으로 메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전전긍긍 하던 차에 “지하 3~4m까지는 석분이나 무기성오니로 매립하면서 직접적으로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 1m는 양질의 흙으로 메우면 침수도 해결되고 농사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시 환경자원과의 제안은 귀가 솔깃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 환경과에서는 순수하게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석재부산물을 농지에 매립한 것일까.
시에서는 70여곳에 달하는 석재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석재부산물 처리는 힘든 일로 적법절차를 거쳐 매립을 허가한 것이라는데, 일단은 “도랑 치고 가재 잡았다”고 말하니 믿어보기로 하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천시에는 석재가공공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인근 양주시가 12곳, 동두천시가 5곳, 의정부시가 0곳에 비해 무허가까지 합치면 약 200여 곳이나 된다고 하니, 더 이상 허가를 막아야 할 것이며 기허가 난 곳도 차츰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상태로 가다간 제2, 제3의 ‘석경회’사건이 이어질 것이고 포천시 환경과는 석재공장 ‘뒤치다꺼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상기된 얼굴로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여 “기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저희들끼리 돈 벌어 먹기 위해 싸우는데 왜 주민들을 끼워 기사를 쓰느냐”고 따지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요즘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393번지 일대 11필지 총 2만5000여㎡의 농지에 석재가공 폐기물인 석분과 무기성오니를 매립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매립행위는 시에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 높이 5m로 매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업자간 서로의 이권을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싸움은 마치 정치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대방 헐뜯기는 물론이고 허가과정의 문제점과 비리 금품살포, 불법유인물 살포, 없는 말 만들기, 공사현장 감시 등 최대한 견제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 자신들의 치부까지 드러내며 발등을 찍는 일임에도 서슴지 않고 자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오가1·2·3리 이장이나 마을 대표들이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매립공사를 따내지 못한 업체 측의 고자질로 뇌물수수설이 거론되고 있어 요즘 심정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항변의 주요골자는 대충 이랬다.
20여년 전 마을에서는 시에 하천부지를 점유할 수 있는 허가를 득했고 엉망이었던 하천부지를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경지정리 한 후 그동안 꼬박꼬박 수십년간 시에 점용료를 바쳐오며 자기 것처럼 아끼고 가꿔 농사를 지어왔으나 수년전부터 낮은 지대인 논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와 농사를 자주 망치게 돼, 시에 매립을 요구했으며 시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석재폐기물로 매립을 허가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매립이 진행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피해보상을 주장, 결국 석재폐기물 단체인 ‘석경회’로부터 각 리에 500만원씩이 지급됐으며 또한 공사마무리 약속에 대한 이행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슨 뇌물 운운하며 기사를 썼냐”는 것이었다.
사실 농사꾼으로서 20여년간 지어온 농지가 석재폐기물로 매립된다면 좋아할 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고 한다.
7000여평에 달하는 농지는 매년 물에 잠기고, 양질의 흙으로 메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전전긍긍 하던 차에 “지하 3~4m까지는 석분이나 무기성오니로 매립하면서 직접적으로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 1m는 양질의 흙으로 메우면 침수도 해결되고 농사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시 환경자원과의 제안은 귀가 솔깃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 환경과에서는 순수하게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석재부산물을 농지에 매립한 것일까.
시에서는 70여곳에 달하는 석재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석재부산물 처리는 힘든 일로 적법절차를 거쳐 매립을 허가한 것이라는데, 일단은 “도랑 치고 가재 잡았다”고 말하니 믿어보기로 하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천시에는 석재가공공장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인근 양주시가 12곳, 동두천시가 5곳, 의정부시가 0곳에 비해 무허가까지 합치면 약 200여 곳이나 된다고 하니, 더 이상 허가를 막아야 할 것이며 기허가 난 곳도 차츰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상태로 가다간 제2, 제3의 ‘석경회’사건이 이어질 것이고 포천시 환경과는 석재공장 ‘뒤치다꺼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