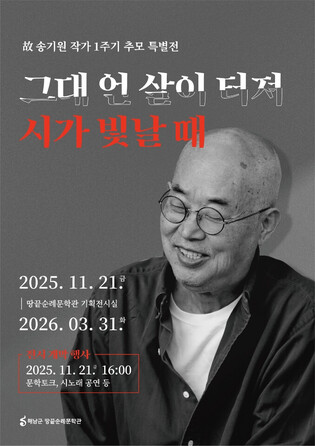“좌파 정권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우파들은 통쾌함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국가실패에 대한 우파의 성찰력 결함을 위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한국의 좌파들도 유능하지는 못했다.
한국에서 연이은 좌파정부의 등장은 우파의 국가 실패를 교정하려는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등장한 측면이 강하다.
멀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회자되던 1980년대 말엽의 뇌물로 움직이는 사회의 폐단, 1997년 IMF를 초래한 국가실패에 대한 자가 진단적 요청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위기가 불러온 정치적 파도를 타고 지난 10년간 사회 전반을 바꾸려고 하였다.
시간에 쫓기듯이.
국가조직에서부터 국정은 물론 사회 전반, 그리고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50년에 걸쳐 침전된 퇴락한 보수의 색채를 모두 떼내려고 하였다.
종말이 임박한 것을 안 사람처럼 주어진 시간 내에 왼쪽을 향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려고만 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도랑도 치기 전에 가재먼저 잡으려 했던 것이다.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마당에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법에서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려는 시대착오, 노조를 약자라며 법을 어겨도 좋다는 언술, 의회 과반수를 얻자마자 밀어부친 사학법 개정은 좌파의 조급증이 불러온 패착들이다.
그런 터에 기업들이 손해나는 장사를 할 리 있겠는가?
공장설립수가 2003년 9천개에서 작년에 8500개로 줄었다.
신설법인은 1만2천개에서 8천5백개로 급격히 줄었다.
1000대 기업이 돈을 싸놓고 있는 유보율이 2002년 232%에서 작년에 616%를 넘었다.
작년도 외국인의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은 49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0% 감소하면서 FDI 유치 순위도 전년의 27위에서 47위로 20계단 하락했다.
청년 10명 중 4명이 백수신세이다.
한국의 좌파는 조급했다.
한국의 권력이 DJ, 참여정부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다.
유구한 역사는 누구를 국가운영의 위임자로 선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뒤에 오는 좌파들은 계산하지 않았다.
성장과 분배의 모델, 좌파들의 신화를 제공한 스웨덴을 보라.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계기를 집권했던 스웨덴의 사민당은 자신들의 좌파전략을 펼치기까지에 40년을 인내했다.
“성급한 세금 폭탄을 퍼붓고, 비리 사학의 재단을 몰아내기 위해 사외이사를 지렛대로 삼는다”는 조급 전략을 폈다면 오늘의 스웨덴은 없었을 것이다.
규제와 징벌 성격의 세금을 짜내는 전략으로 국가정책, 산업정책을 펼쳤더라면 토종자본이라 한들 국내에 남아있었을까?
스웨덴 모델의 성공 뒤에는 기업들이 자유로이 파이를 키우도록 소유와 경영을 보장해준 데 있다.
1870년부터 1930년까지 스웨덴은 ‘작은 정부, 시장경제’를 지상명제로 삼고 수출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세계사에 보기 드문 고도성장을 거듭했고, 경제공황을 맞기 전에 이미 유럽의 부국으로 2만5천달러 수
준의 국민소득에 도달했다.
그게 분배의 원천이 된 것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신화속으로만 달려간 좌파의 조급성, 그게 좌파의 실책을 불러온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주장하면 우파들은 통쾌함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국가실패에 대한 우파의 성찰력 결함을 위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한국의 좌파들도 유능하지는 못했다.
한국에서 연이은 좌파정부의 등장은 우파의 국가 실패를 교정하려는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등장한 측면이 강하다.
멀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회자되던 1980년대 말엽의 뇌물로 움직이는 사회의 폐단, 1997년 IMF를 초래한 국가실패에 대한 자가 진단적 요청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위기가 불러온 정치적 파도를 타고 지난 10년간 사회 전반을 바꾸려고 하였다.
시간에 쫓기듯이.
국가조직에서부터 국정은 물론 사회 전반, 그리고 학교교육에 이르기까지 50년에 걸쳐 침전된 퇴락한 보수의 색채를 모두 떼내려고 하였다.
종말이 임박한 것을 안 사람처럼 주어진 시간 내에 왼쪽을 향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려고만 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도랑도 치기 전에 가재먼저 잡으려 했던 것이다.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된 마당에 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은행법에서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려는 시대착오, 노조를 약자라며 법을 어겨도 좋다는 언술, 의회 과반수를 얻자마자 밀어부친 사학법 개정은 좌파의 조급증이 불러온 패착들이다.
그런 터에 기업들이 손해나는 장사를 할 리 있겠는가?
공장설립수가 2003년 9천개에서 작년에 8500개로 줄었다.
신설법인은 1만2천개에서 8천5백개로 급격히 줄었다.
1000대 기업이 돈을 싸놓고 있는 유보율이 2002년 232%에서 작년에 616%를 넘었다.
작년도 외국인의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은 49억5000만달러로 전년대비 30% 감소하면서 FDI 유치 순위도 전년의 27위에서 47위로 20계단 하락했다.
청년 10명 중 4명이 백수신세이다.
한국의 좌파는 조급했다.
한국의 권력이 DJ, 참여정부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다.
유구한 역사는 누구를 국가운영의 위임자로 선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뒤에 오는 좌파들은 계산하지 않았다.
성장과 분배의 모델, 좌파들의 신화를 제공한 스웨덴을 보라.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계기를 집권했던 스웨덴의 사민당은 자신들의 좌파전략을 펼치기까지에 40년을 인내했다.
“성급한 세금 폭탄을 퍼붓고, 비리 사학의 재단을 몰아내기 위해 사외이사를 지렛대로 삼는다”는 조급 전략을 폈다면 오늘의 스웨덴은 없었을 것이다.
규제와 징벌 성격의 세금을 짜내는 전략으로 국가정책, 산업정책을 펼쳤더라면 토종자본이라 한들 국내에 남아있었을까?
스웨덴 모델의 성공 뒤에는 기업들이 자유로이 파이를 키우도록 소유와 경영을 보장해준 데 있다.
1870년부터 1930년까지 스웨덴은 ‘작은 정부, 시장경제’를 지상명제로 삼고 수출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세계사에 보기 드문 고도성장을 거듭했고, 경제공황을 맞기 전에 이미 유럽의 부국으로 2만5천달러 수
준의 국민소득에 도달했다.
그게 분배의 원천이 된 것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신화속으로만 달려간 좌파의 조급성, 그게 좌파의 실책을 불러온 원인이 아니었나?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