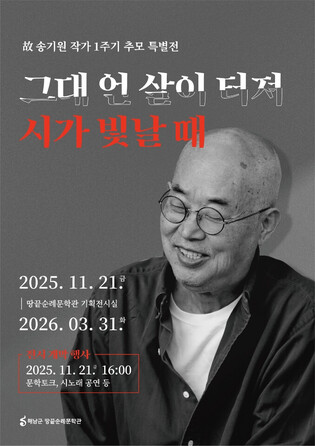-콤 켈러허,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김상윤 안성수 옮김, 2006 고려원북스) [원제목 ‘Brain Trust' 2004년]
-Sheldon Rampton and John Stauber, Mad Cow U.S.A. (Common Courage Press. 2004 ed.) [셀던 램턴 -존 스토버 공저, 미친 소 미국]
-Richard Rhodes, Deadly Feasts (1997, Simon and Schuster) [리차드 로즈, 죽음의 盛饌(성찬) (1997년)]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이명박 정부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 쇠고기가 절대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선 광우병 소가 몇 마리 발견됐지만, 사람이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라 부르는 변종 크로이펠츠 야콥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3명인데, 모두 영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금년 봄 버지니아에서 광우병 비슷한 증세로 사망한 젊은 여인은 사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기초해서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광우병에 관한 이 세 권의 책을 읽고 나면 “과연 미국이 광우병에서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더 나아가서 도무지 우리가 먹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모든 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
세 권의 책의 저자는 각기 배경이 다르다. 콤 켈러허는 생화학을 전공한 과학자이고, 셀던 램턴과 존 스토버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저술가이다. 리차드 로즈는 퓰리처 상을 탄 역사학자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전한 책을 많이 펴냈다. 과학자, 진보성향 저술가, 그리고 역사학자가 낸 이들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광우병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구 100만명 중 한 명 꼴로 발생하는 크로이펠트 야콥병이 광우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다호주의 한 지역에서는 크로이펠트 야콥병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켄터키 주에선 전통적인 다람쥐 음식을 먹은 주민 몇 사람이 함께 이 병에 걸려 죽었다. 자기가 잡은 야생 사슴을 즐겨 먹은 사냥꾼이 이 병에 걸려 죽기도 했다. 먹이사슬을 통해 크로이펠트 야콥병이 전염됨을 보여준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그렇다면 변종 크로이펠트 야콥병만 미친 소를 먹어서 걸리는 인간 광우병이라는 주장이 허물어지게 된다. 나이든 사람에 주로 생기는 크로이펠트 야콥병은 알츠하이머 병과 증상이 같아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육골분(肉骨粉) 사료를 소에게 먹이게 된 경위는 단순하다. 소가 빨리 성장하고, 또 젖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콩 같은 단백질 사료를 먹여야 한다. 미국에선 소와 돼지의 부위 중 먹지 않는 부분이 많다. 머리, 내장, 피 등 부속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미국엔 야생동물이 많다. 자동차에 치어 죽은 사슴 등 죽은 야생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그러자 도축장에서 나온 소 돼지의 부산물, 야생 동물의 사체를 통째로 갈아서 肉骨粉(육골분) 사료를 만들었다.
이 육골분 사료를 사슴, 밍크, 소, 돼지, 닭 등에 먹였는데,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다. 이 사료는 콩 보다 훨씬 싸서 축산농장에 좋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어 도축장에게도 좋았다. 야생동물 사체를 치워야 하는 주정부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자 처음에는 사육하던 밍크가 죽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다음에는 사슴 농장에서 미친 사슴이 발견됐다. 사람 사체를 먹은 뉴기니 부족에서 미친 증상이 발생하듯이, 자기 동족을 먹은 동물들이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육골부 사료를 금지시켰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광우병과 크로이펠트 야콥병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1980년대에 미친 소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하다가 1990년대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영국의 경우는 큰 교훈을 준다. 하지만 왜 영국에서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0여명에 불과한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책의 저자들은 광우병이 소멸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지 않는다. 저자들은 프리온 질병의 잠복기는 10년 정도로 보아서, 2010년을 전후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금년이 벌써 2008년이기 때문에 이 예측은 일단 어긋났다.
다니엘 가이두섹 박사가 뉴기니의 식인부족의 쿠루병이 식인습관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서 오늘날 광우병의 원인을 알게 됐다. 이 부족의 식인습관은 5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던 것인데, 왜 쿠루 병이 뒤늦게 어린 아이들 사이에 많이 발생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50년이란 간격이 오늘날의 상황에 시사점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 문제가 결코 미국 쇠고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프리온은 초식동물인 소와 사슴에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밍크, 돼지, 원숭이 등 모든 동물에 축적된다. 돼지는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도축해서 사람이 먹기 때문에 미친 돼지가 나오지 않을 뿐이다.
우리 국민은 뼈, 골, 피, 내장 등 소와 돼지의 모든 부분을 알뜰하게 먹는다. 야생 사슴이 자동차에 치어 죽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엔 소와 돼지를 알뜰하게 먹고 야생동물 사체가 없어서 국산 동물성 사료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광우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사슴이나 소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다.)
그렇게 때문에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오면, 소와 돼지의 모든 부분을 먹는 우리 국민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광우병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채식주의자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음도 이해할 만하다. 광우병 문제는 정치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우병 문제는 ‘육식 문명’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데, 그 점에서 위의 책을 읽기를 권하고자 한다.
-Sheldon Rampton and John Stauber, Mad Cow U.S.A. (Common Courage Press. 2004 ed.) [셀던 램턴 -존 스토버 공저, 미친 소 미국]
-Richard Rhodes, Deadly Feasts (1997, Simon and Schuster) [리차드 로즈, 죽음의 盛饌(성찬) (1997년)]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가 이명박 정부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 쇠고기가 절대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선 광우병 소가 몇 마리 발견됐지만, 사람이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라 부르는 변종 크로이펠츠 야콥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3명인데, 모두 영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금년 봄 버지니아에서 광우병 비슷한 증세로 사망한 젊은 여인은 사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기초해서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광우병에 관한 이 세 권의 책을 읽고 나면 “과연 미국이 광우병에서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더 나아가서 도무지 우리가 먹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모든 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
세 권의 책의 저자는 각기 배경이 다르다. 콤 켈러허는 생화학을 전공한 과학자이고, 셀던 램턴과 존 스토버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저술가이다. 리차드 로즈는 퓰리처 상을 탄 역사학자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전한 책을 많이 펴냈다. 과학자, 진보성향 저술가, 그리고 역사학자가 낸 이들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광우병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인구 100만명 중 한 명 꼴로 발생하는 크로이펠트 야콥병이 광우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다호주의 한 지역에서는 크로이펠트 야콥병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켄터키 주에선 전통적인 다람쥐 음식을 먹은 주민 몇 사람이 함께 이 병에 걸려 죽었다. 자기가 잡은 야생 사슴을 즐겨 먹은 사냥꾼이 이 병에 걸려 죽기도 했다. 먹이사슬을 통해 크로이펠트 야콥병이 전염됨을 보여준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그렇다면 변종 크로이펠트 야콥병만 미친 소를 먹어서 걸리는 인간 광우병이라는 주장이 허물어지게 된다. 나이든 사람에 주로 생기는 크로이펠트 야콥병은 알츠하이머 병과 증상이 같아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육골분(肉骨粉) 사료를 소에게 먹이게 된 경위는 단순하다. 소가 빨리 성장하고, 또 젖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콩 같은 단백질 사료를 먹여야 한다. 미국에선 소와 돼지의 부위 중 먹지 않는 부분이 많다. 머리, 내장, 피 등 부속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분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미국엔 야생동물이 많다. 자동차에 치어 죽은 사슴 등 죽은 야생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그러자 도축장에서 나온 소 돼지의 부산물, 야생 동물의 사체를 통째로 갈아서 肉骨粉(육골분) 사료를 만들었다.
이 육골분 사료를 사슴, 밍크, 소, 돼지, 닭 등에 먹였는데,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다. 이 사료는 콩 보다 훨씬 싸서 축산농장에 좋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어 도축장에게도 좋았다. 야생동물 사체를 치워야 하는 주정부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자 처음에는 사육하던 밍크가 죽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다음에는 사슴 농장에서 미친 사슴이 발견됐다. 사람 사체를 먹은 뉴기니 부족에서 미친 증상이 발생하듯이, 자기 동족을 먹은 동물들이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육골부 사료를 금지시켰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광우병과 크로이펠트 야콥병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1980년대에 미친 소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하다가 1990년대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영국의 경우는 큰 교훈을 준다. 하지만 왜 영국에서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0여명에 불과한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책의 저자들은 광우병이 소멸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지 않는다. 저자들은 프리온 질병의 잠복기는 10년 정도로 보아서, 2010년을 전후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금년이 벌써 2008년이기 때문에 이 예측은 일단 어긋났다.
다니엘 가이두섹 박사가 뉴기니의 식인부족의 쿠루병이 식인습관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서 오늘날 광우병의 원인을 알게 됐다. 이 부족의 식인습관은 5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던 것인데, 왜 쿠루 병이 뒤늦게 어린 아이들 사이에 많이 발생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50년이란 간격이 오늘날의 상황에 시사점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이 세 권의 책을 읽으면 문제가 결코 미국 쇠고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프리온은 초식동물인 소와 사슴에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밍크, 돼지, 원숭이 등 모든 동물에 축적된다. 돼지는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도축해서 사람이 먹기 때문에 미친 돼지가 나오지 않을 뿐이다.
우리 국민은 뼈, 골, 피, 내장 등 소와 돼지의 모든 부분을 알뜰하게 먹는다. 야생 사슴이 자동차에 치어 죽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엔 소와 돼지를 알뜰하게 먹고 야생동물 사체가 없어서 국산 동물성 사료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광우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사슴이나 소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다.)
그렇게 때문에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오면, 소와 돼지의 모든 부분을 먹는 우리 국민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광우병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채식주의자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음도 이해할 만하다. 광우병 문제는 정치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우병 문제는 ‘육식 문명’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데, 그 점에서 위의 책을 읽기를 권하고자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