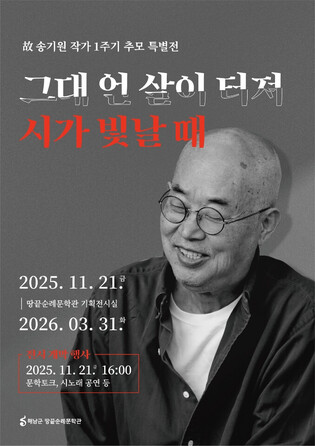(박정수 - 작가?미술칼럼니스트)
“발가락으로 그려도 이것보다는 낫게 그리겠다.”
“이게 그림이야? 근데 비싸긴 왜 이렇게 비싸.”
누구나 한번쯤은 해본 말일 것이다.
코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정말 못 그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잭슨 폴록은 어떤가.
장난치듯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저런 걸 예술 작품이라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림 같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떠받드는 이유가 몹시나 궁금하다.
하지만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
이런 작품들 값이 수백억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는 비아냥거리는 말도 더는 못하게 되었다.
그 정도라면 뭔가 대단한 물건이긴 한 모양인데, 어설픈 소리 했다가는 무식하단 지청구 들을지도 모른다.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차마 물어볼 수가 없다.
미술,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들다. 신경 쓰면서 살기는 귀찮고.
아예 관심 끊고 그냥 지나가? 그러자니 뭔가 귀중한 걸 빼놓고 가는 기분이다.
그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한번 부닥쳐 보자.
하지만 보아도 또 보아도 여전히 알 수 없다.
아름답다? 감동적이라? 그렇단다. 뭐가 ‘아름답다’고 뭐가 ‘감동스럽다’는 것인지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궁금증을 가슴에 안은 채 그림에 한번 다가가 보자.
사람을 볼 때도 얼굴만 보는 게 아니다.
잘생기고 예쁘면서도 솜씨 좋고 마음씨 곱고 맵시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가.
얼굴만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
뭔가 가슴에 울림이 오는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그것은 그림도 마찬가지다. 감
동에는 이유가 없다.
좋으니까 좋은 것이다.
[45만원의 감상 가치는 45억원]
그런데 미술품, 비싸도 너무 비싸다.
수천만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한다.
감동적이면 뭐 하나.
보통 사람은 묵묵히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강남의 수십억 하는 아파트가 내 것이 아니듯 45억짜리 박수근의 그림은 내 것이 아니다.
소장자의 것이다.
그러나 박수근의 45억짜리 작품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예술이 바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려는 대상이다.
마음에 들어 가슴에 품고 싶은 45만원짜리 그림과, 마음에 들어도 사지 못하는 45억 원짜리 그림은 그래서 가격이 같다.
그림은 부자들이나 살 수 있는 비싼 물건이다.
그러나 그림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산다.
45억짜리, 맨 처음 그 그림은 화폐 가치보다는 예술 가치로 먼저 팔린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45만원에 사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은 이미 팔려버린 그 예술이 갖고 싶어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다시 산다.
45만원에 산 예술을 45억에 사들이는 것이다.
45만원, 내가 설정한 합당하고도 원초적인 ‘착한’ 그림 값이다.
그 미술품이 45억이 된 까닭이 있다.
그 ‘45만원’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술로 감상하고 향유하고 있다면 그 값은 45억이다.
100억이 넘어가도 상관없다.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45만원짜리 예술이 많이 팔리게 된다.
(발품 팔아 화랑가를 다니다보면 30만원에 살 수 있는 예술이 많다. 여기에 가족 나들이 비용과 기타 교통비 등 15만원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내가 정한 원초적인 그림 값 45만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에만 관심을 둔다.
45만원짜리 그림이 갖고 있는 예술성에는 관심이 없고 45만원에만 관심이 있다.
재테크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소장 가치와 감상 가치를 무시한다.
투자 가치만 이야기한다.
돈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면 꺼내기 껄끄러운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비싼 그림 값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면 이 또한 다행스런 일이다.
정신 활동의 소산인 예술이 우리네 보통사람에게는 늘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 왔기 때문이다.
(얼마나 멀리 있었으면 2007년 6월에는 2009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부터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평가 방식이 현행 서열 기록식에서 3등급 절대 평가식으로 개편된다는 발표까지 나왔을까. 그러나 예술은 평가 기준이 아니라 수행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예술 과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료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정신 활동을 무시하고서는 새로운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은 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
투기나 투자 대상의 미술이건 아니건 미술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미술을 관람하는 정신 활동 또한 미술 재테크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왕열, 동행, 천에 먹,아크릴, 244*143 cm, 2006,
“발가락으로 그려도 이것보다는 낫게 그리겠다.”
“이게 그림이야? 근데 비싸긴 왜 이렇게 비싸.”
누구나 한번쯤은 해본 말일 것이다.
코도 이상하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정말 못 그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잭슨 폴록은 어떤가.
장난치듯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저런 걸 예술 작품이라니.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림 같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떠받드는 이유가 몹시나 궁금하다.
하지만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한다.
이런 작품들 값이 수백억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는 비아냥거리는 말도 더는 못하게 되었다.
그 정도라면 뭔가 대단한 물건이긴 한 모양인데, 어설픈 소리 했다가는 무식하단 지청구 들을지도 모른다.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차마 물어볼 수가 없다.
미술,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들다. 신경 쓰면서 살기는 귀찮고.
아예 관심 끊고 그냥 지나가? 그러자니 뭔가 귀중한 걸 빼놓고 가는 기분이다.
그래,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한번 부닥쳐 보자.
하지만 보아도 또 보아도 여전히 알 수 없다.
아름답다? 감동적이라? 그렇단다. 뭐가 ‘아름답다’고 뭐가 ‘감동스럽다’는 것인지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궁금증을 가슴에 안은 채 그림에 한번 다가가 보자.
사람을 볼 때도 얼굴만 보는 게 아니다.
잘생기고 예쁘면서도 솜씨 좋고 마음씨 곱고 맵시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가.
얼굴만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
뭔가 가슴에 울림이 오는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그것은 그림도 마찬가지다. 감
동에는 이유가 없다.
좋으니까 좋은 것이다.
[45만원의 감상 가치는 45억원]
그런데 미술품, 비싸도 너무 비싸다.
수천만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한다.
감동적이면 뭐 하나.
보통 사람은 묵묵히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강남의 수십억 하는 아파트가 내 것이 아니듯 45억짜리 박수근의 그림은 내 것이 아니다.
소장자의 것이다.
그러나 박수근의 45억짜리 작품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예술이 바로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하려는 대상이다.
마음에 들어 가슴에 품고 싶은 45만원짜리 그림과, 마음에 들어도 사지 못하는 45억 원짜리 그림은 그래서 가격이 같다.
그림은 부자들이나 살 수 있는 비싼 물건이다.
그러나 그림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산다.
45억짜리, 맨 처음 그 그림은 화폐 가치보다는 예술 가치로 먼저 팔린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45만원에 사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은 이미 팔려버린 그 예술이 갖고 싶어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다시 산다.
45만원에 산 예술을 45억에 사들이는 것이다.
45만원, 내가 설정한 합당하고도 원초적인 ‘착한’ 그림 값이다.
그 미술품이 45억이 된 까닭이 있다.
그 ‘45만원’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술로 감상하고 향유하고 있다면 그 값은 45억이다.
100억이 넘어가도 상관없다.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45만원짜리 예술이 많이 팔리게 된다.
(발품 팔아 화랑가를 다니다보면 30만원에 살 수 있는 예술이 많다. 여기에 가족 나들이 비용과 기타 교통비 등 15만원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내가 정한 원초적인 그림 값 45만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에만 관심을 둔다.
45만원짜리 그림이 갖고 있는 예술성에는 관심이 없고 45만원에만 관심이 있다.
재테크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소장 가치와 감상 가치를 무시한다.
투자 가치만 이야기한다.
돈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면 꺼내기 껄끄러운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비싼 그림 값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면 이 또한 다행스런 일이다.
정신 활동의 소산인 예술이 우리네 보통사람에게는 늘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 왔기 때문이다.
(얼마나 멀리 있었으면 2007년 6월에는 2009학년도 중·고교 신입생부터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평가 방식이 현행 서열 기록식에서 3등급 절대 평가식으로 개편된다는 발표까지 나왔을까. 그러나 예술은 평가 기준이 아니라 수행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예술 과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료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 정신 활동을 무시하고서는 새로운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은 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
투기나 투자 대상의 미술이건 아니건 미술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미술을 관람하는 정신 활동 또한 미술 재테크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왕열, 동행, 천에 먹,아크릴, 244*143 cm, 2006,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