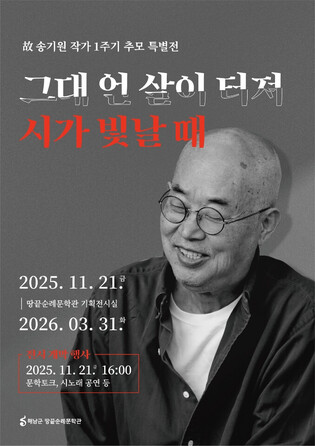(최재천 전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수도’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한강 르네상스’입니다.
한강 다리마다 전망대가 들어섰지요.
다리에서는 폭포가 쏟아집니다.
한강 시민공원에는 잔디와 흙 대신 돌과 시멘트가 식재됩니다.
쇳덩이로 만든 인공 섬이 ‘플로팅 아일랜드’란 이름으로 둥둥 떠 있습니다.
수천톤급 여객선을 한강에 띄우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한강 수심을 더 깊게 파고, 양화대교 교각 폭을 35m에서 50m로 확대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바야흐로 ‘한강 토목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환경에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시절 친환경을 그토록 강조했고, 선거 기간 내내 넥타이는 초록색이었습니다.
‘보라색’의 강금실 후보에 비해 ‘녹색’의 오세훈을 테마로 삼았었지요.
그래서 공약도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돼 있었습니다.
환경친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대기질 개선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약도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을 10만호나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영어 체험마을도 있었지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열린 한강 만들기라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한강에 나무를 심는데만도 100억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고, 자연생태체험 공간으로 한강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서울경쟁력강화를 위한 참공약 실천보고서)
조선일보 2월 10일자 1면 중간 기사는 ‘한강이 10년에서 15년만에 최악의 수질을 기록했다’는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12면은 거의 전면을 털어 ‘수질개선에 20조원을 썼는데 도루묵’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사는 없었습니다만, 중앙일보 11일자 두 번째 사설 제목은 ‘한강 수질 10년 전보다도 더 나빠졌다니’입니다.
(조선일보 2월 10일자, "맑아지나 싶더니… 한강물 또 비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2010021000155.html?srchCol=news&srchUrl=news2)
(중앙일보 2월 11일자 사설, "한강 수질 10년 전보다도 더 나빠졌다니",
http://news.joins.com/article/459/4009459.html?ctg=2001)
수돗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을 재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불편할 뿐입니다.
현재의 오염상태라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 기준에 비추어보아 아예 상수원수로 써서는 안 될 물’이라는 전문가의 코멘트까지 기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청계천 맑은 물이 한강으로 흘러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물론 청계천 물은 한강물이 모터로 끌어올려져 다시 순환되는 구조일 뿐입니다. 북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닙니다. 삼청동 계곡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느 학자는 청계천을 세계 최장의 분수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한강의 상류 중 하나인 왕숙천을 깨끗한 지천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기계중심, 토목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입니다.
신의 지배로부터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 르네상스는 어떠해야 할까요.
인간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연 중심이어야 합니다.
강의 본래 기능인 흐름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수질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함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 시장을 얘기했고, 한강 르네상스를 얘기했던 오 시장의 한강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많은 호수와 (강과) 대수층 같은 형태로 물이 존재하는 태양계의 행성 혹은 위성은 오직 지구뿐이다. 지구의 물은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재생되고 순환한다. 다채롭고 아름다운 지구의 경관과 생명체들은 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더 이상의 물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장래에 지구에 있을 물의 양과 같다.(샌드라 포스텔, 브라이언 릭터 지음, 최동진 옮김, 「생명의 강」)”
물은 생명의 기원이고, 이렇게 오염되고 나면 회복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는 강의 기본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강을 죽음의 강으로 몰아넣고 도대체 무슨 디자인입니까.
디자인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르네상스가 아닙니다. 중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세종시 논란 속에 한강 오염 문제가 묻혀갑니다.
한강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수도’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한강 르네상스’입니다.
한강 다리마다 전망대가 들어섰지요.
다리에서는 폭포가 쏟아집니다.
한강 시민공원에는 잔디와 흙 대신 돌과 시멘트가 식재됩니다.
쇳덩이로 만든 인공 섬이 ‘플로팅 아일랜드’란 이름으로 둥둥 떠 있습니다.
수천톤급 여객선을 한강에 띄우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한강 수심을 더 깊게 파고, 양화대교 교각 폭을 35m에서 50m로 확대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바야흐로 ‘한강 토목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환경에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시절 친환경을 그토록 강조했고, 선거 기간 내내 넥타이는 초록색이었습니다.
‘보라색’의 강금실 후보에 비해 ‘녹색’의 오세훈을 테마로 삼았었지요.
그래서 공약도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돼 있었습니다.
환경친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대기질 개선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약도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을 10만호나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영어 체험마을도 있었지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공약도 있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가 아니라, 열린 한강 만들기라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한강에 나무를 심는데만도 100억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고, 자연생태체험 공간으로 한강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서울경쟁력강화를 위한 참공약 실천보고서)
조선일보 2월 10일자 1면 중간 기사는 ‘한강이 10년에서 15년만에 최악의 수질을 기록했다’는 기사로 채워졌습니다.
12면은 거의 전면을 털어 ‘수질개선에 20조원을 썼는데 도루묵’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사는 없었습니다만, 중앙일보 11일자 두 번째 사설 제목은 ‘한강 수질 10년 전보다도 더 나빠졌다니’입니다.
(조선일보 2월 10일자, "맑아지나 싶더니… 한강물 또 비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0/2010021000155.html?srchCol=news&srchUrl=news2)
(중앙일보 2월 11일자 사설, "한강 수질 10년 전보다도 더 나빠졌다니",
http://news.joins.com/article/459/4009459.html?ctg=2001)
수돗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을 재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불편할 뿐입니다.
현재의 오염상태라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 기준에 비추어보아 아예 상수원수로 써서는 안 될 물’이라는 전문가의 코멘트까지 기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청계천 맑은 물이 한강으로 흘러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물론 청계천 물은 한강물이 모터로 끌어올려져 다시 순환되는 구조일 뿐입니다. 북한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닙니다. 삼청동 계곡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느 학자는 청계천을 세계 최장의 분수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한강의 상류 중 하나인 왕숙천을 깨끗한 지천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공약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르네상스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기계중심, 토목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입니다.
신의 지배로부터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 르네상스는 어떠해야 할까요.
인간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연 중심이어야 합니다.
강의 본래 기능인 흐름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수질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함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 시장을 얘기했고, 한강 르네상스를 얘기했던 오 시장의 한강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많은 호수와 (강과) 대수층 같은 형태로 물이 존재하는 태양계의 행성 혹은 위성은 오직 지구뿐이다. 지구의 물은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재생되고 순환한다. 다채롭고 아름다운 지구의 경관과 생명체들은 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더 이상의 물을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장래에 지구에 있을 물의 양과 같다.(샌드라 포스텔, 브라이언 릭터 지음, 최동진 옮김, 「생명의 강」)”
물은 생명의 기원이고, 이렇게 오염되고 나면 회복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는 강의 기본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한강을 죽음의 강으로 몰아넣고 도대체 무슨 디자인입니까.
디자인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르네상스가 아닙니다. 중세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세종시 논란 속에 한강 오염 문제가 묻혀갑니다.
한강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