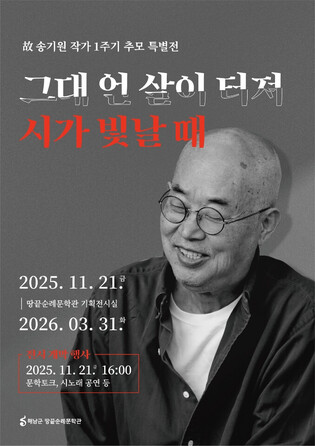|
||
이태근(서울우편집중국장)
7월4일 오늘은 서울우편집중국 개국 기념일이다. 1990년 문을 열었으니 오늘로 21번째 귀빠진 날을 맞았다. 그런데 마지막 생일이 되고 말았다. 용산 역세권 개발계획에서 국제업무단지로 지정되면서 지금의 터를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 서울우편집중국은 우정역사의 한 페이지에만 오롯이 남게 된다. 지금 서울우편집중국은 동서울·부천·안양우편집중국으로 업무를 분산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다소 무심하게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감회는 남다르다. 서울우편집중국의 시작을 준비했고 지금은 그 끝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에서일까? 그 동안의 역사를 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이렇게 펜을 들었다.
서울우편집중국은 대한민국 최초로 기계화된 우체국이다. 탄생배경을 이렇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과 정보화 사회의 가속화로 우편물이 급증했다. 당시 통계를 보면, 1989년 국내 총우편물량은 20억9천여만통으로 전년도에 비해 14.6%나 늘었다.
우체국마다 처리해야 할 우편자루가 차곡차곡 쌓여갔고 수(手)작업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성탄우편물과 연하장이 다음해 1월 중순에 배달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우편집중국 개국은 바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정(郵政)역사에 있어 우편물 분류 방식을 ‘수작업에서 기계화’로 바꾼 일대 전환점이자 변혁이었다.
작업방식의 변경은 편지문화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기계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격봉투와 우편번호 사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자연스러워진 이 두 가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조·홍보되기 시작했다.
철도우편체제의 마지막을 지켜본 것도 서울우편집중국 사람들이 손꼽는 추억거리다. 전국에 우편집중국이 건설되고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운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육로운송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 결과 서울우편집중국을 드나들던 열차는 2006년 5월 24일 그 운행을 멈췄다. 끝으로, 우정역사 상 직급이 4급인 기관장이 통솔하던 현업 우정관서가 문을 닫는 것은 처음이라는 사실도 적어두어야 할 듯싶다.
업무 분산이 예고된 2년 전부터 직원들 간에 정을 나누려는 동호회가 눈에 띄게 늘었다. 붓글씨 동호회인 집묵회는 전국의 우체국 직원들이 참여하는 문예대전을 주관할 정도로 성장했다. 사물놀이패인 ‘땅울림’은 초청공연을 받을 정도로 열정과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뜨개질 동호회도 생겨 작품을 만들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기증을 하거나 독거노인을 위한 목도리를 만들어 증정하기도 했다.
기계들을 다른 집중국으로 옮길 준비를 하며 마음이 부산하다. 하나 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애틋함도 커져만 간다. 그러나 필자는 믿는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