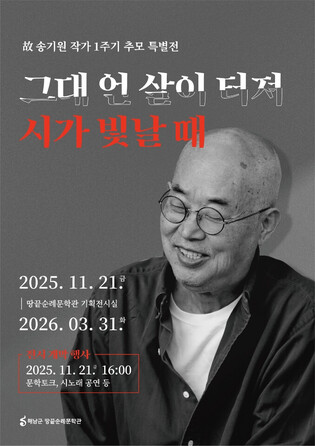|
||
임현정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한 사형수가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을 죽였다. 죽은 사람은 한 나라에서 영웅으로 대접받는 인물이었고 영웅을 잃은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사형수에게 공공연하게 살해 협박을 했다. 그 사형수는 의연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증오함에도 한 간수는 그의 의연함과 신념에 존경을 표하고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사형수의 형 집행 날짜가 정해지던 날, 그 간수는 사형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깊은 슬픔에 벽에 머리를 찧어 많은 피를 흘렸다. 사형수는 간수의 피를 닦아주며 글을 적어준다.‘爲國獻身 軍人本分’
사형수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을 입어보는 것이었다. 간수는 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거리적 한계로 인해 사형 집행일 이전에 그의 어머니가 지은 옷이 감옥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기로 한다. 딸에게 그의 어머니 대신 옷을 만들어 오라고 한 것이다. 그는 이 옷을 사형수의 어머니가 만든 옷이라며 사형수에게 전해주었다.
이 이야기는 1909년 10월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1910년 3월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와 당시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의 이야기이다. 당시 안의사의 신념과 결기는 간수였던 일본인마저 감동시킬 정도였다. 이후 지바 도시치는 귀국 후 일본의 대림사에 ‘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의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추모해왔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안의사의 영웅적 면모’가 심지어 침략의 주체이던 일본인조차 감동시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간수 지바 도시치가 일본 내에서 양심적인 소수자로써 얼마만큼의 핍박과 위협을 받았을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떨까?
일제강점의 역사에 관한 한 우리는 피해자 프레임 안에 있었다. 침략에 관해 일본은 나쁘고 우리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고 놀랍게도 그런 변화는 사회 지도층에서 나오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식민사관이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일제의 강점은 조선이 근대사회로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들이 가설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이 우리나라가 산업화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유명 국립대 교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간수의 선의의 거짓말에 속아 남이 만들어준 옷에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한목숨 바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도 순국 직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그리웠던 것이다. 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선택한 조국에 대해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이들의 주장과 사관을 침략시대의 일본에 존재하던 양심적인 세력과 같이 ‘진실’을 말하는 지성으로 보아야 할까? 과연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세대로 이행하는 역사에 대한 재인식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결국 그 답은 우리 개개인과 사회가 내려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