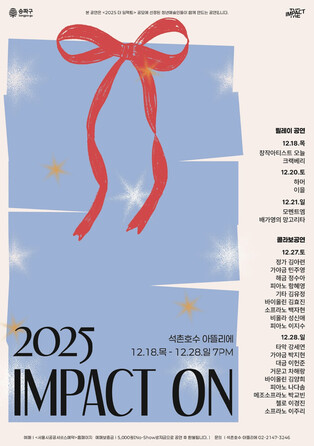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지난 15일 `공무원 금품수수는 소액이라도 엄단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공무원 징계기준안을 마련, 정부 부처에 배포해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16일 부방위와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부방위 주최로 열린 전국 자체감사관 회의에서 각 기관에 전달된 이 기준안은 당장 추석 `떡값’ 수수를 묶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공직부패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부방위가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공직비리척결을 본격화 하려는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부방위 기준안의 주요 특징은 경우에 따라 눈감아 주기도 했던 공무원의 소액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외없이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기준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이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100만원에 못미치는 금품·향응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이를 받고서 부당한 처분을 하면 정직·해임하고 ▲정당하게 처분하면 감봉·정직시키며 ▲의례적으로 받더라도 감봉·견책을 내리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안은 나아가 100만~500만원 사이의 금품·향응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모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대상에 올렸다.
5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 해임되도록 하고, 특히 1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파면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일정기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파면된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이 기준안을 받아들일지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한욱 부방위 법무관리관도 “징계란 기관별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기관의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며 “이 기준안은 절대적이지 않은 부방위의 권고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준안의 평균적인 징계 수위가 특별하게 강한 것도 아니다.
자체 징계기준이 느슨했던 기관에게는 이 기준안이 `충격적’일 수 있겠으나 10만~20만원을 받은 직원을 파면시키기도 했던 경찰 등 `고강도 징계’ 기관은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직사회는 노 대통령이 공직부패 척결을 최근 거듭 강조한 뒤 이 같은 기준안이 등장한데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금 100만원 수수 사실이 적발된 김주수 농림차관의 사표가 수리된 것도, 강동석 건설교통장관이 최근 “돈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직원들을 질책한 것도 이 기준안의 취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기준안이 좀 더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총리실의 한 간부는 “소액다건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와 고액으로 1회에 뇌물을 받는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한 과장은 “이대로라면 10만~20만원 받은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기관장이 악용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16일 부방위와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부방위 주최로 열린 전국 자체감사관 회의에서 각 기관에 전달된 이 기준안은 당장 추석 `떡값’ 수수를 묶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공직부패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부방위가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공직비리척결을 본격화 하려는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부방위 기준안의 주요 특징은 경우에 따라 눈감아 주기도 했던 공무원의 소액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외없이 징계 대상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기준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에 대해선 해당 기관장이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100만원에 못미치는 금품·향응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이를 받고서 부당한 처분을 하면 정직·해임하고 ▲정당하게 처분하면 감봉·정직시키며 ▲의례적으로 받더라도 감봉·견책을 내리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안은 나아가 100만~500만원 사이의 금품·향응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모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대상에 올렸다.
5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 해임되도록 하고, 특히 1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파면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일정기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고, 파면된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이 기준안을 받아들일지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한욱 부방위 법무관리관도 “징계란 기관별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기관의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며 “이 기준안은 절대적이지 않은 부방위의 권고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준안의 평균적인 징계 수위가 특별하게 강한 것도 아니다.
자체 징계기준이 느슨했던 기관에게는 이 기준안이 `충격적’일 수 있겠으나 10만~20만원을 받은 직원을 파면시키기도 했던 경찰 등 `고강도 징계’ 기관은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직사회는 노 대통령이 공직부패 척결을 최근 거듭 강조한 뒤 이 같은 기준안이 등장한데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현금 100만원 수수 사실이 적발된 김주수 농림차관의 사표가 수리된 것도, 강동석 건설교통장관이 최근 “돈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공무원을 그만두라”고 직원들을 질책한 것도 이 기준안의 취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기준안이 좀 더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총리실의 한 간부는 “소액다건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와 고액으로 1회에 뇌물을 받는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한 과장은 “이대로라면 10만~20만원 받은 공무원을 해임시킬 수도 있는데 이는 기관장이 악용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지혜 기자 wee@siminilbo.co.kr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