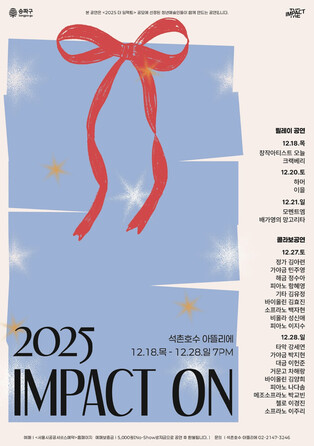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신봉승 극작가) 요즘 들어 부쩍 많이 쓰이고, 또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소통(疏通)이 아닌가 싶다. 소통의 중요성이 자주 되풀이 되는 것은,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나 다름이 없다.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도 타인과의 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이르면 선정(善政)과 폭정(暴政)을 가늠하는 지렛대가 되기도 한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소통이 끊어지면 정치가 부재하게 되고, 백성들의 고통은 하늘을 찌르게 된다.
조선시대는 다스리는 자(임금 혹은 조정)와 다스림을 받는 자(백성들)의 소통은 상소문(上疏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은 대개 상소문으로 적혀서 승정원에 올려지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격인 승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접수된 상소문의 글귀를 고치거나 내용을 압축할 수가 없다.
접수된 상소문은 원문 그대로 임금에게 올려지고, 임금은 밤을 새워서라도 상소문을 세세히 살펴야 한다. 또 상소문을 읽은 임금은 상소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비답(批答)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 그것이 선정의 도리라면 임금과 백성간의 옳은 소통이 선정의 첩경임을 잘 말해주고 있음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올린 청원서나 건의서를 해당부서로 멋대로 이송하고, 또 내용을 읽기 쉽게 간추려서 대통령에게 올린다. 이런 방식으로서는 국민의 뜻이 대통령에게 바로 전해질 까닭이 없다. 이같은 현실에서 소통을 선정의 길잡이로 삼겠다는 선언은 자가당착이나 다름이 없다.
얼마 전, 정부 중요부처에서 강연요청이 있었다. 강연 현장에 도착하였더니 담당 공무원이 간곡히 청하였다.
“근자 우리 부처의 긴급 화두가 소통입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나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했다. 우리 고위공직자가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은 겨우 남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불만을 들어보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통은 상대의 불만을 파악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지, 불만 그 자체를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욱 단세포적인 논리는 현직 장관들이 텔레비전 광고방송(CF)에 출연하여 해당부처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소통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통부 장관이 영업택시의 운전석에 앉아서 “정지선을 지키면 더 빨리 갑니다”라는 식의 어색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이 소통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소통의 개념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알고도 남게 된다. 그것이 어디 교통장관님 뿐인가. 복지부장관님, 교과부 장관님도 상업CF에 출연하여 어색하기 그지없는 연기를 펼쳐 보이면서 국민들의 입 초사에 오르고, 또 그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수준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국민들과의 소통은 선정의 기본이다. 소통의 근본은 다스리는 자가 국민들의 가까이로 다가가서 국민들의 고통을 확인하는 일이며, 또 그 아픔을 덜어주는 일이다. 만만치 않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아무 실효도 없는 상업CF에 출연하고 있는 장관님들은 서둘러 그 잘못된 관념에서 뛰쳐나와 생업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곁으로 달려가 그들의 고충을 함께 체험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길이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