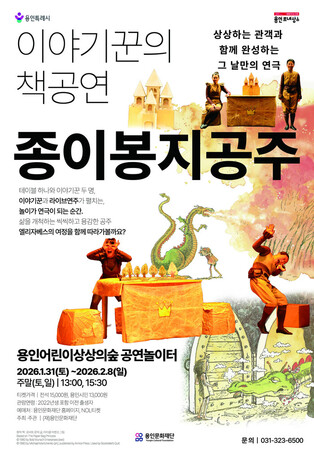|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채용돼 국가공무원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인 선관위 공무원은 대개 서기관(4급)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지방 공무원이 서기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따라서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이라면 민주노총에만 있는 줄 알았던 ‘고용세습’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관리 조직 고위직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실이었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전남 선관위의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9급에 채용됐다. 당시 박 사무총장은 사무차장 신분이었다. 박 사무총장의 딸은 현재 전남 강진 선관위로 발령을 받아 근무 중이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도 충남 보령시에서 근무하다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모에 지원해 8급으로 채용됐다. 송 사무차장의 딸은 충북 단양 선관위로 발령 났고, 현재는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딸 채용 당시 송 사무차장은 선관위 기획국장을 지낸 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연수 중이었다.
앞서 지난해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도 2020년 인천 선관위로 이직하고, 6개월 뒤에 7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었다.
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은 물론 치열하게 밤잠 설치며 스펙 쌓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극도의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선관위 측은 “경력직에 채용되면 원거리 지역에 배치돼 인기가 높지 않다. 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아버지들이 영향을 미친 건 전혀 없다”라고 ‘고용세습’ 논란을 일축했지만, 선관위의 해명에 수긍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지방 공무원은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만, 국가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인 탓이다. 국가공무원은 동급 지방 공무원보다 한 직급 높은 자리로 인식되는 게 공직 사회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기가 없다는 선관위 측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채용이 ‘고용세습’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따라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자체 감찰만으로도 안 된다. 감찰로 면피하려 했다가는 당장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사실 선관위 고위직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선관위가 북한 정찰총국을 포함해 총 8건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대체 북한이 왜 선관위 해킹을 시도했을까?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 사회의 부정 선거 논란을 겨냥한 것인가? 그런데 선관위는 왜 국정원의 권고를 거부했을까?
정말 숱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보안점거 권고를 거부하고 있다.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면, 특히 북한의 해킹 위험이 있다면, 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게 정상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치외법권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어디 그뿐인가.
전국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치 현수막'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기간에 현수막을 무제한 게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여론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처럼 경력직 채용을 포장해 고용세습을 일삼고, 북한 해킹에 대한 보안점검도 무시해버리는 선관위, 여론에 역행하는 선관위가 과연 국가의 주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선관위를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 다만 개혁의 방향과 폭 등은 국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하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