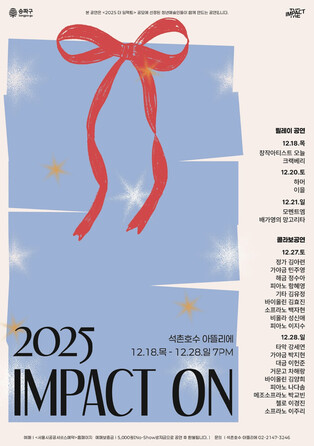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또 남북간에 포성이 울렸다.
앞으로도 신경전이 계속 될 것 같다.
남북간의 대화와 평화는 정말 요원한 것이냐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이런 걱정을 뒤로 하고, 경남의 통영에 내려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충렬사와 세병관(洗兵館)을 방문해 향을 피워 기도를 올렸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충렬사의 동백꽃은 매우 풍성한 겨울꽃을 뽐내고 있었다.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 주위의 나무들도 수백 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품이 넘쳐났다.
참 신기하구나. 명당에 자리잡고 있어서인가. 이순신 장군의 넋이 보살피기 때문인가 하고 두리번 거리는데, 나뭇잎이 반짝였다.
한심하고 무능한 조정, 군인들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는 상관들의 독선과 오만, 백성들의 참혹한 주검, 기아에 허덕이는 현실, 그리고 왜적의 침탈에 유린되는 산하의 참상과 같은 틈새에서 수많은 고뇌를 거듭했을 이순신의 척지를 되새겨볼 때마다 참으로 백성을 어여삐 여기고 살 길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우선적으로 대처해나간 공의 선택이 더욱 값져보였다.
하지만 이런 만고에 찾기 어려운 훌륭한 인간, 뚜렷한 임진왜란 승전의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영과 한산도에는 그저 그런 흔한 기념관이 서있을 뿐이었다.
우리시대의 수준과 양식이 이런 정도인가.
조선시대에는 충(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국민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제영이 있었던 통영과 남해안 일원에 좀더 제대로 된 임진왜란 해전 전시관을 세워 모든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방문하도록 했어야 했다.
중국광주를 방문했을 때 아편전쟁 당시를 재현해놓은 장대한 전시관과 상해의 노신기념관을 보고, 필자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어린이들과 국민들이 생생한 역사교육을 받고 결코 그 치욕스런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또 노신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풍부한 자신을 흡수한다고 생각하니 우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던 것이다.
그래서 충렬사의 박형균 이사장께 세계 전사에 가장 뛰어난 해전이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누구라도 와서 보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명전투 해전 전시관을 꼭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나눴다.
그런데 충렬사와 3도수군 통제사들의 지휘소였던 세병관에서 필자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6년 후인 1604년(선조 37년)에 덕천막부와 평화회담이 진행중이던 상황에서 벌어진 당포해전을 기록한 승전비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이 승전 전적비는 당시 3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경준(李慶濬) 장군의 승전비이다.
어디로 갔을까?
그게 이상해서 세병관과 충렬사 관계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을 보면, 일제 강점기 때에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이 있는데 이 당포승전비도 그때 없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쨌든 비석 전체가 현재 통영일대에 없다면 파괴되었거나 어디엔가 묻혀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일본에 반출되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제까지 모호한 채로 있다는 점이다.
덕천막부가 왜 캄보디아에 군병력을 파견했고, 캄보디아 내전에서 상당한 전공을 세워 그 보상으로 막대한 황금을 싣고 오다가 조선수군에 격침당한 사건이라면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 전투가 이후 조-일간의 평화회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때 포로가 된 일본인과 서양인들의 경우 명나라의 요청으로 북경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의 행로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수군이 나포한 포로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명의 요구에 따라 북경으로 보내는 임란 이후의 조선조정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한심한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경준 통제사의 후손인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기 이를 데 없다.
반드시 다시 찾거나 복구해 역사의 기록을 보존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또 남북간에 포성이 울렸다.
앞으로도 신경전이 계속 될 것 같다.
남북간의 대화와 평화는 정말 요원한 것이냐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이런 걱정을 뒤로 하고, 경남의 통영에 내려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충렬사와 세병관(洗兵館)을 방문해 향을 피워 기도를 올렸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충렬사의 동백꽃은 매우 풍성한 겨울꽃을 뽐내고 있었다.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 주위의 나무들도 수백 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품이 넘쳐났다.
참 신기하구나. 명당에 자리잡고 있어서인가. 이순신 장군의 넋이 보살피기 때문인가 하고 두리번 거리는데, 나뭇잎이 반짝였다.
한심하고 무능한 조정, 군인들의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는 상관들의 독선과 오만, 백성들의 참혹한 주검, 기아에 허덕이는 현실, 그리고 왜적의 침탈에 유린되는 산하의 참상과 같은 틈새에서 수많은 고뇌를 거듭했을 이순신의 척지를 되새겨볼 때마다 참으로 백성을 어여삐 여기고 살 길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우선적으로 대처해나간 공의 선택이 더욱 값져보였다.
하지만 이런 만고에 찾기 어려운 훌륭한 인간, 뚜렷한 임진왜란 승전의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영과 한산도에는 그저 그런 흔한 기념관이 서있을 뿐이었다.
우리시대의 수준과 양식이 이런 정도인가.
조선시대에는 충(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국민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제영이 있었던 통영과 남해안 일원에 좀더 제대로 된 임진왜란 해전 전시관을 세워 모든 국민들과 외국인들이 방문하도록 했어야 했다.
중국광주를 방문했을 때 아편전쟁 당시를 재현해놓은 장대한 전시관과 상해의 노신기념관을 보고, 필자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어린이들과 국민들이 생생한 역사교육을 받고 결코 그 치욕스런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또 노신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풍부한 자신을 흡수한다고 생각하니 우리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던 것이다.
그래서 충렬사의 박형균 이사장께 세계 전사에 가장 뛰어난 해전이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누구라도 와서 보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명전투 해전 전시관을 꼭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나눴다.
그런데 충렬사와 3도수군 통제사들의 지휘소였던 세병관에서 필자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6년 후인 1604년(선조 37년)에 덕천막부와 평화회담이 진행중이던 상황에서 벌어진 당포해전을 기록한 승전비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이 승전 전적비는 당시 3도 수군 통제사였던 이경준(李慶濬) 장군의 승전비이다.
어디로 갔을까?
그게 이상해서 세병관과 충렬사 관계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을 보면, 일제 강점기 때에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이 있는데 이 당포승전비도 그때 없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어쨌든 비석 전체가 현재 통영일대에 없다면 파괴되었거나 어디엔가 묻혀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일본에 반출되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제까지 모호한 채로 있다는 점이다.
덕천막부가 왜 캄보디아에 군병력을 파견했고, 캄보디아 내전에서 상당한 전공을 세워 그 보상으로 막대한 황금을 싣고 오다가 조선수군에 격침당한 사건이라면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 전투가 이후 조-일간의 평화회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때 포로가 된 일본인과 서양인들의 경우 명나라의 요청으로 북경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후의 행로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수군이 나포한 포로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명의 요구에 따라 북경으로 보내는 임란 이후의 조선조정의 태도를 보면, 참으로 한심한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경준 통제사의 후손인 한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기 이를 데 없다.
반드시 다시 찾거나 복구해 역사의 기록을 보존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