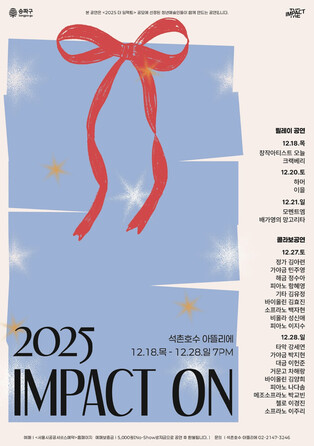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노예해방을 규정한 헌법수정안은 현재의 수백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백만을 위한 것이오.”
영화 ‘링컨’에서 링컨이 말한 한 대목이다.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 때마다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대통령이다. 말그대로 이런 대통령 링컨을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 '링컨'은 헌법수정안의 하원의결을 앞두고 자신의 참모들조차 자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자 링컨(다니엘 데이 루이스)은 이런 맥락을 말을 성토한다.
영화 ‘링컨’은 노예해방을 규정한 헌법수정안이 하원의결을 앞둔 상황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주로 부족한 찬성 투표자를 확보하려는 링컨과 참모들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링컨의 리더십은 화해와 포용이다. 적과도 연대하고 소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같은 공화당 내에서 최고의 경쟁자였던 윌리엄 슈어드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그 이유는 더 엘리트이고 공직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쟁자라도 능력이 있으면 중용을 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반대자들을 의식하여 남부의 대표들이 북부에 온 것을 숨기면서 남부와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
그는 타협도 마다하지 않았다. 노예해방을 반대하는 이들이 백인과 흑인이 자연적으로 동등하다는 견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자, 자연적으로는 동등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동등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정치적 상대자들의 입장을 인정해준 것이다. 하지만 대전제이자 원칙적인 가치인 노예해방은 포기하지 않았다.
백인과 흑인은 자연적으로 동등하다고 수십 년 동안 주장한 당내의 급진파 태디언스 스티븐스를 설득하기도 한다.
그가 자연적으로 백인과 흑인이 등등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동등하다는 발언을 하게 하여 노예해방 찬성표를 이끌어내려는 심산이었다.
스티븐슨도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노예해방을 규정하는 헌법 수정안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만다. 그래서 그는 수십년동안 백인과 흑인은 동등하다라는 주장을 굽힌다.
링컨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심지어 백악관을 개방하여 언제든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들도 들여보냈다. 하지만 대전제와 근본 목표는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는 적절한 지점에 자신의 경험과 일화를 통해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바꾸도록 했다.
근본적인 목표를 위해서라면 다른 하위 수단의 변용은 개의치 않았다. 예를 들면 부족한 표를 얻기 위해 반대하는 의원들을 매수하는 일도 용인하였다.
결국, 이 때문에 2표차로 하원 의회를 통과하였고 미국의 노예 특히 흑인들은 해방되었다. 현재의 수백만만이 아니라 미래의 수백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해방된 것이다.
하지만 그 법안이 통과된 과정은 결코 아름답거나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자신의 소신과 가치를 접고 야합을 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통해 찬성표를 얻으려고 했다.
그때 내건 것은 수백만, 그 이상의 미래 희생을 더 이상 늘어나게 해서는 안된다는‘절박함’이라는 명분이었다.
2010년 CNN은 오피니언리서치와 미국 성인남녀 1천2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재임할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대답이 71%였다.
2009년 조사 때는 65%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에게 다 드러낼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다. 하지만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진정 무엇인지 동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겠다.
많은 정치인들이 미국의 링컨을 자신의 이상적인 대통령 모델로 언급하고는 한다. 화합과 소통, 포용의 리더십을 통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존경을 받는 링컨의 정치적 결과물들은 아름다운 수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링컨과 같이 노예해방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수도 방조하거나 조장해야 한다는 말일까.
얼마든지 링컨의 예를 들어 합리화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링컨’을 감동적인 영화이거나 그의 모든 행동을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견강부회에 머문다면 더욱 그렇다. 명분과 결과가 아름답다고 하여 과정의 추악함이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