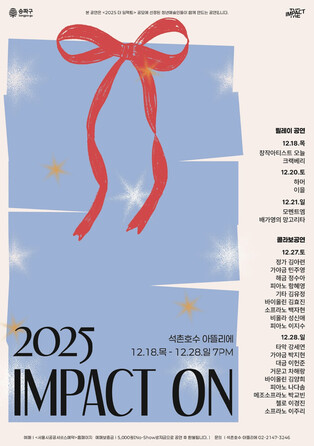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 ▲ 전지명 동국대 겸임교수 | ||
먼저 세금이란 말과 관련 있는 재미 나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이글을 열어본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歸天)'이란 시의 마지막 연이다.
이 시제는 서울 인사동 골목길에 있는 전통찻집 겸 주점의 상호가 되어 있기도 한데 하늘나라로 돌아간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귀천’이란 주점을 차려놓고 문우들과 술잔을 나누며 여전히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그의 세금 거두기는 평생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그로서는 용돈 내지 술값 정도로 지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었는데, 워낙 당당한 태도로 받아내는 것이어서 우스갯소리로 ‘세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는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방귀세금, 죄악세’ 란 것을 부과하는 국가도 있기도 하고 또 논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즉 덴마크, 뉴질랜드 등 유럽의 낙농국가들 사이에서는 소, 양과 같은 가축들의 방귀나 트림을 통해 나오는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기 위한 명목으로 환경오염 부담금 같은 ‘가축 방귀세’인 이른바 ‘죄악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에스토니아는 몇 년 전 부터 소를 키우는 농가에 죄악세 성격의 가축 방귀세(fart tax)를 부과해 오고 있다. 이 죄악세(sin-tax)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술, 담배, 도박, 공해나 소음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세금이다.
세금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좋거나 싫거나 한 나라의 국민 된 도리로서 모든 국민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또 세금은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만큼 과세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와 공평과세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는 조세평등, 과세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과세 성역이 있다. 바로 어마어마한 기부금에 파묻혔고, 세금의 의무가 완전 면제되고 교황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면 되는 중세의 ‘템플기사단’처럼 우리나라의 종교인과 종교 단체, 종교법인도 이에 속한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 인데, 납세의무가 없다면 어떻게 국민으로서 의무와 자격을 말 할 수 있겠는가.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현행 세법 어디에도 없으며, 관례상 세금을 물리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40년간 무풍지대처럼 납세 회피의 성역으로 자리 잡아 온 셈이다.
물론 종교인 과세문제는 간혹 논의는 있어 왔지만, 주요 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나 살피고, 표심을 의식해 외면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사정은 있다. 그리하여 역대 어느 정부도 종교인 비과세 성역을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나 종교인과 종교 단체에 과세하지 않은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 형평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이 투명해지는 이런 차제에 더 이상 과세 사각지대, 비과세 특권을 그대로 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여론이고, 더 나아가 개세주의 앞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 이다.
다행히 정부가 2015년부터 종교인의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안을 이미 확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조세저항에 양보하여 수정안으로 대체하듯이 혹여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종교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유독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하고 있는데,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비과세이고 기부금(헌금 등)을 낸 사람은 일정금액 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는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이중 세액 공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검토 되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싶다.
이제 종교인도 납세 의무를 져야만 한다는 대다수 국민 정서에 부응하여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정책을 과감하게 적용 하고 추진해만 할 것이다. 교회나 사찰이 정성어린 헌금이나 시주 등에 의해 운영되듯 한 국가도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 운영되지 않은가.
그래야만 조세 정의 실현이 가능하고 또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