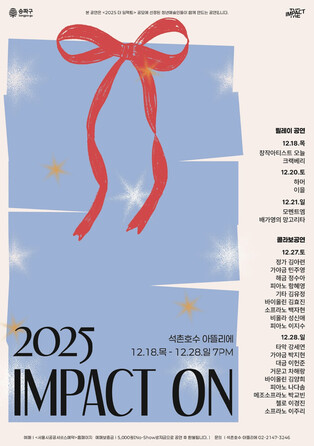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 ▲ 전지명 동국대 겸임교수 | ||
생지옥이 따로 없다. 그곳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는 천리 만길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
760만 명의 주민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에다 47만 명의 영·유아들이 심각한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
온 가족이 한집에서 굶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특히 아사(餓死)선상에 놓여 있는 그곳 아이들의 심각한 기아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한다.
휑한 눈만 끔뻑이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쫄쫄 배를 곯으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야 하는가.
물론 굶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극심한 배고픔에 신음하기는 그곳 어른들도 매 한가지다. 호의호식하는 특권 계층의 살찐 그 비만과는 대조적으로 거의 피골상련(皮骨相連)인 형국이다.
그곳은 2000년 초에도 굶주림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금은 식량난 사정이 더욱더 나빠져 아시아 34개국 가운데 기아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런 반증이 바로 그곳을 탈출한 어느 여성이 A방송에 출연해 들려준 생생한 증언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고 열흘을 굶으니까 아무것도 안보였다. 그 때 나이가 20세였는데 체중이 25kg 미만이었고 뼈만 앙상했다면서 탈북은 배가 고파서였지 절대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서러움과 울분이 교차하느라 목이 메이는 듯 울먹이면서 떨리고 있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는 그 곳은 다름이 아니라 곧 북한이다.
여기서 필자는 1917년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러시아 북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를 유유히 흐르는 네바강 10월의 밤을 떠올렸다. 그날 밤은 독재, 전란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과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이심전심으로 로마노프 왕조 시대의 막을 내리게 한 역사적인 밤이다.
‘북부의 베니스’라고 칭해졌던 제정(帝政)러시아의 수도였던 이곳은 혁명의 도시, 위대한 시인 푸쉬킨의 고향으로 그는 이곳을 ‘유럽으로 열리는 창’이라 칭송했다.
자본주의 경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 날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던 칼 마르크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후발 러시아, 레닌과 푸쉬킨의 고향이기도 한 그곳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짜르(러시아어로 황제칭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정치행위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제정러시아. 민중의 인권과 자유를 위한 그 어떤 변화도 철저히 억압당했다. 민중봉기나 반란은 인정사정없이 무자비하게 대포로 진압되었다.
그런데 10월의 그날 밤, 네바강에 정박해 있던 전함 오로라호(아브로라호)에서 굉음과 함께 발사된 대포 한 발에 임시정부 청사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 궁전’이 별 저항 없이 무혈점령된다. 볼셰비키의 무혈 혁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발은 실탄이 아니라 한 발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공포탄 이었다고 한다.
300여 년 동안 제정러시아를 통치 해 온 로마노프 왕정체제도 이 공포탄 한 발에 그 이전에 발트함대가 침몰되었듯이 역사 속으로 침몰 된 것이다. ‘대포’진압으로 민심을 잃은 그 왕정이 결국 ‘대포’한 발 소리에 최후 비극의 역설을 맞는다. 세습 니콜라이 2세 황제도 그 다음해에 가족과 함께 잔혹하게 처형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필경 그 공포탄은 제정러시아 치하에서 ‘빵을 달라, 짜르 타도!’를 외치던 굶주림에 분노한 민중들의 상징적인 저항이자 피맺힌 함성이었기에 단번에 항복하게 된 것이다.
언젠가는 북한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헐벗고 굶주려 온 성난 민중들에 의해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던 발트함대와 같이 막강하던 짜르 체제도 마침내 붕괴되었다. 이는 ‘민심이 곧 천심이다’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백성을 굶주리게 한 그 어떤 왕조도 활화산처럼 폭발한 민중들의 원성에 의해 다 무너졌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政府)의 힘으로도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을 굶주리게 만들거나 전제(專制)정치를 펴나가는 독재 정권은 종국에 가서는 자멸을 초래할 뿐이다.
뭐니 뭐니 해도 북한 정권이 살길은 오로지 굶주림에서의 해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엄혹한 현실 앞에서 상생과 민족공영의 길이 과연 무엇인가를 심각히 모색되어야만 한다. 역사를 뒤바꿔 놓은 오로라호의 공포탄 한 발이 준 교훈도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