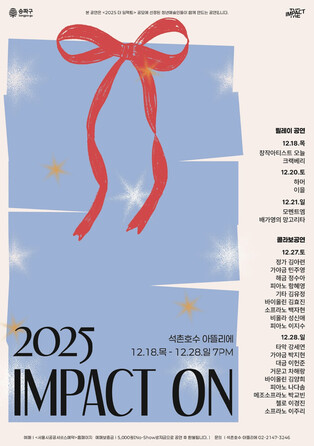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 ▲ 오현세 객원기자 | ||
그런데 이러한 진화나 변화가 발전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발전이라면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바뀜을 의미하는 듯 싶은데 인간이 옛날보다 발전했고 또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기어 다니다가 똑바로 서서 뛰어다닌다고 발전했다고 말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기어 다니는 것과 뛰어다니는 것은 행동의 유형이지 우열을 나타내는 가늠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뱀이 사자보다 못한 동물이다”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지요. 결국 인간의 발전이라면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정신,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이 발전한다고 믿는데 거부감을 느낍니다. 만약 인간이 대를 이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존재라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육체적인 면 뿐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전혀 새로운 종이 되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연 어떤 점에서 과거의 인간보다 발전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찾기 힘듭니다.
걸어 다니던 인간이 바퀴를 발명하고 나아가 날틀을 만들었으니 인간이 발전했다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이 발전한 것이지요. 인간이 발전된 수단을 만들었다고 인간의 정신이 발전했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3만 년 전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보다 지금의 화가들 그림이 더 감동을 준다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옛날 원시인들의 음악보다 바흐의 음악이 더 감동스럽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발전했다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4대 성인의 자리가 왜 아직도 교체되지 않고 있는 지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인간이 발전했다면 만인이 공감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벌써 밝혀졌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깜깜 어둠 속을 헤매며 신적 존재에 의지하고 있는 그 한 가지만 보아도 인간이 발전했고 또 발전해 나아간다는 이론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생각을 되돌아보게 하는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얼마 전 바둑 프로기사인 김지석 9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세돌 9단이라면 신에게 선으로 승부가 될 것이다. 두 점을 접힌다면 아마 이기지 않을까.” 바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나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저는 조그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발전을 증명하는 상당한 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인간이 즐기는 최고의 정신적 게임으로 체스와 바둑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서양에서는 체스를 최고의 게임으로 칩니다. 그러나 체스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체스는 바둑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체스와 바둑은 거의 유한과 무한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체스는 1997년 세계챔피언인 가리 카스파로프가 슈퍼컴퓨터 딥 블루에 패배한 이래 컴퓨터와의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바둑의 프로기사를 이길 수 있는 컴퓨터는 언제 등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알고리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데까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체스는 인간이 만든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다. 그러나 바둑은 신이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간 두뇌를 시험하는데 바둑만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신을 바둑을 매개로 연결해 인간 정신의 발전을 가늠해 보면 어떨까요?
물리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면 인간과 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한다면 신은 아무리 먼 거리도 출발과 동시에 골인할 것입니다. 골프도 매번 18타로 경기를 끝낼 것입니다. 핸디고 뭐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둑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한 수씩 교대로 둔다는 규칙 때문에 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신이 치사하게 인간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반외작전은 절대 안 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럼 인간은 신에게 몇 점으로 승부를 할 수 있을까요? 김지석 프로 말대로 두 점이면 할 만 할까요?
인간 최고수와 신과는 몇 점 치수인가는 오래 전부터 심심파적 삼아 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과 승부를 한다면 살아있는 기성 오청원은 넉 점, 그 제자 린하이펑은 석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린 9단도 목을 건다면 넉 점이라고 한 점 물러섰습니다. 후지사와 9단도 한국의 서봉수 9단도 같은 견해였습니다. 이때가 80년대입니다. 일본 바둑의 전성기였지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 한국의 조훈현, 이창호 사제가 세계를 평정하면서 기사들의 견해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세계기전을 휩쓸고 있는 이창호 9단에게 같은 질문을 중국기자가 던졌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이창호9단을 바둑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바둑의 신에게 진짜 신과의 치수를 물은 것이지요. 그의 대답은 “넉 점이면 그럭저럭 둬볼만 할 겁니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창호 본인의 말이고 서봉수 9단은 “이창호라면 신과 두 점과 정선 사이의 치수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지석 9단이 현 최고수인 이세돌 9단이라면 정선, 목을 건다 해도 두 점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30여년 사이에 신과 인간 최고수와의 차이가 두 점이나 줄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둑의 프로세계에서 두 점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 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박영훈 9단이 세계타이틀을 따자 질문을 했습니다.
신과 둔다면 몇 점으로 승부를 하겠냐고. 박 9단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두 점을 놓고 둔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항상’ 이길 수 있느냐.” 고 바꿔 물었습니다. 박 9단은 망설이지 않고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두 점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기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오청원 선생의 넉 점에서 이창호, 이세돌 9단의 두 점까지 인간이 두 점이나 신에게 다가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1일 폐막한 제27차 세계수학자대회에서도 바둑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인간 지성을 대표하는 수학자들도 바둑을 통한 수학의 발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때를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바둑이 등장하는 영화까지 등장해 일반인들의 바둑에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인류의 지능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보면 적어도 인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는 생각에 위안이 됩니다. 바둑은 아이큐가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 정신으로 두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세계바둑계에서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한국 바둑이 중국의 맹추격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둑계의 재도약을 기원합니다.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