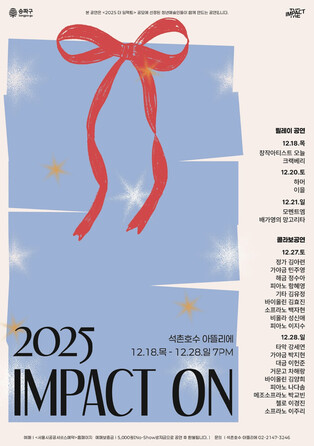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 ▲ 이기문 변호사 | ||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해 가는 것이 한마디로 정치이다. 대화와 타협의 수단이 없으면 정치가 없는 셈이 된다.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 우리는 불통의 정치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정치의 장에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치는 어떠한가? 자신의 주장만 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안중에도 없다. 소통하는 모습을 도대체 볼 수 없다. 소통이라는 것은 설령 상대방과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담을 넘거나 뚫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때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담이 가로막혀 있을 때 아예 그 담을 넘거나 뚫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과는 대화와 타협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포기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치의 모습이다. 그래서 한국에는 정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우리 앞에 담이 놓여져 있으면, 담장 넘어엔 무엇이 있을까를 궁금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담장을 올라가 상대방의 동정을 살펴보려는 생각을 가졌다. 궁금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궁금해야 상대방을 알아보게 되고,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가져야 할까? 당연히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가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상대방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외쳤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 내겠다.’고 다짐했다.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그녀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는 그녀의 약속은 내팽개쳐졌고, 사람이 핵심이라는 창조경제는 알 수 없는 구호로 바뀌고 말았다.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던 그녀의 취임사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여올 뿐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실규명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여당대표에게 말을 던져야 할텐데 요즘은 아예 세월호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녀의 약속도 불통의 모습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국민행복은 꽃 피울 수 있다던 그녀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세월호가족들 앞에서 울면서 약속했던 그녀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종만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대통령과 야당국회의원 사이에 가로 막혀 있는 저 높은 담벼락을 과연 무엇으로 넘거나 뚫어야 할까? 국민이 뚫어야 하나? 야당국회의원이 뚫어야 하나?
정치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불통의 담벼락을 대통령이 뚫어야 한다. 대통령이 소통에 나서야 한다. 왜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일까?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그럴까? 대통령 스스로 낮추는 모습으로 내려오면 안되는 것일까? 권력은 결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처절한 심정으로 대통령이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