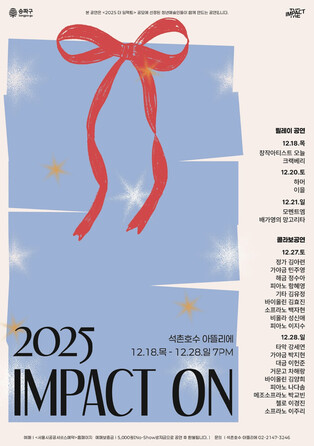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 ||
영어론 심플하게 spring colds. 좀 더 현학적인 표현이 the last cold snap. 몇해 전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꽃샘을 floral envy로 번역했는데 좀 어색했다. 꽃시샘을 말그대로 번역한거다.
바람이나 추위가 꽃을 시샘하는 것인데 꽃이 시샘하는 느낌이다. 한자로는 화투풍(花妬風). 꽃을 질투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결과인 추위를 강조했다면 중국은 원인인 바람을 강조한거다. 투는 시기와 질투의 투다. 이를 합쳐서 시집에서 쫓겨 났다던 7거지악의 네번째인 투기(妬忌)다. 시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불순구고가 으뜸이고 무자, 음행, 투기, 악질, 구설, 절도 중 투기도 네 번째 순위로 높았다. 시샘은 남녀 모두에게 있거늘 투기와 질투는 돌에 女변을 달아 여성 것으로 특화했다. 수다스럽다는 구설(口舌)도 같은 경우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와 출퇴근길에 투덜거리지만 봄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만큼 반갑다. 하도 이상기온이니 지구온난화니 이상기후설로 인류의 장래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호들갑이라 오던 것이 그대로 오면 좀 춥더라도 괜찮다. 한겨울 한강이 꽁꽁 얼어 스케이트 타던 때가 70년대로 끝났다. 86 서울 아시안게임,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변정비후엔 못 봤으니까. 겨울 추위는 비슷한 거 같은데 한강에 얼음 어는 기간도 짧아졌고 두께도 얇아 스케이트는커녕 강변쪽 얕은 곳의 얼음에도 올라서기가 무섭다. 한강변에 체육시설이 생기고 자전거길이 생겨 바깥은 친숙해졌지만 한강 안에 들어가본 건 꽤 오래전이다. 낙시꾼이나 하류에 고기 잡는 전업어부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지만.
꽃샘추위만이 아니라 겨울철 특징인 삼한사온(三寒四溫)도 없어진 것 같다. 아무리 매서운겨울 추워도 며칠 있으면 풀린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요즘은 추우면 한창 춥고 난동(暖冬)이면 가을 날씨 같다. 한반도도 점차 온대에서 아열대로 바뀐다고 한다. 먼저 생태환경이 바뀐다. 찬 과일인 사과가 경주 대구지방을 넘어 덕유산 중턱인 전북의 진안, 장수나 월악산, 소백산록인 충주 장호원 쪽에서 잘된다.
남쪽 과일인 감도 전통적 따바리, 뾰조리감이 주산지였던 영덕 안동 상주 영동 연산 동상 등 중부벨트를 벗어나 점차 북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왜감인 단감이나 개량종인 대봉시는 아직 울산 진영 하동 구례 광양등 남쪽에서 잘 되지만 감의 북방한계선은 서울 이북으로 올라가 양양 속초등 추운지방에도 노오란 가을 홍시가 나뭇가지에 달려있는걸 볼 수 있다.
바다에도 더운 바다 고기들이 몰려온다. 게르치라는 못생기고 넓적하게 큰 바닷고기가 남해안서 잡힌다. 참치라는 고기는 없고 가다랑어와 참다랑어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에 나오는 열대바다의 흑새치, 돛새치등 새치류를 넣고 방어등 좀 작은 등푸른 생선등을 아울러 참치류라고 한다. 우리 연근해 최고의 어류도감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가다랑어밖에 안 나온다.
약전이 유배생활하던 19세기 초까지는 서해 최남단인 흑산도에 난류어인 참다랑어는 없었다는 거다. 근데 요즘 바다가 더워져 여름에 제주근해서 여수 앞바다까지 참치가 올라온다.
남쪽 거문도등 다도해서 삼치, 방어어장이 줄어 큰 배들을 없앴다가 참치잡이로 다시 배값이 올랐단다. 사조 동원산업 등 원양어선에서 잡은 냉동 참치를 해동해서 먹던 것이 이제 여수앞바다서 잡으니 참치 값이 조금 싸졌다.
물론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이 소개한 참치 스시에 맛을 들여 먹기 시작하는 바람에 들어 참치의 국제시세가 올랐다.
꽃샘추위에도 먼 남쪽 봄바람은 살랑 불어온다. 내입엔 감치는 참치회 맛보다 향긋한 도다리 쑥국이 더 댕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