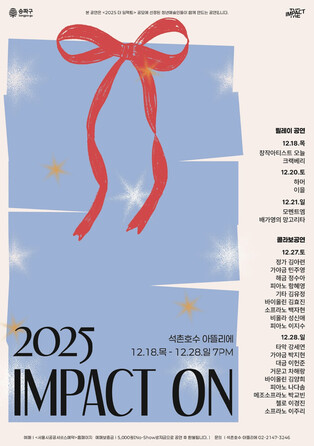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 ||
이번 모디총리의 한국어 통역과 일정관리를 담당했던 부산외대의 알록 로이교수를 모디총리가 떠나던 19일 저녁에 만났다. 80년대초 유네스코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에 매료돼 한국에서 공부하고 부산에서 직장을 잡고 한국인과 결혼해 지난45년간 교편을 잡은 그였지만 이번 모디총리의 방한 환대에 고무돼 있어보였다. 그간 몇번 인도총리가 한국을 다녀갔지만 이번처럼 환대를 받을 일이 없었다. 그만치 인도가 뜨고 있고 이제 우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이어 인도가 달려오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를 살려준 건 중국에의 수출이다. 연간 10% 가까이 성장해온 중국에 공장을 지어 싼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의 소비시장을 석권하던 것이 지난 10여년 우리 경제의 활력이었다.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으로 물꼬를 틀고 88년 서울 올림픽에 이어 92년 중국 수교등 정신없이 양국을 오갔다. 중국은 등소평 집권 당시 막 개방을 시작한 때여서 한국인을 만나기만 하면 중국에 투자해달라고 조르던 시기였다.
적어도 88년이후 국제통화기금(IMF)에 달러 구조요청을 했던 97년까지 10년간이 우리 역사에서 중국에 대해 큰 소리를 치던 유일한 때가 아닐까 싶다. 산동반도의 칭타오, 엔타이, 위하이엔 한국 관광객들이 몰려다녔고 골프장에서 한국말로 해도 다 통할 정도로 거들먹거리던 시절이었다. 같은 시절 노태우대통령때 북방외교로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의 이자를 못내 러시아가 무기등 국방관련 물자로 갚겠다고 우리에게 굽신거리던 것도 우리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대러시아 ‘거만외교’행태가 아니었을까?
중국보다 1억명정도 적은 12억5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가 우리로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등 아세안국가를 거쳐 우리의 미래 투자처가 된다. 미국 중국등과는 이미 관세면제협정(FTA)을 체결한 상태지만 인도와는 경제내용이 달라 특별동반자관계로 격상했다. 현대자동차가 98년 수도 델리가 아닌 동쪽 해변의 첸나이(구 마드라스)에 공장을 세워 연 12만대를 생산하던 것이 지난해 68만대로 늘었고 이제 공장을 증축해 내년에는 75만대를 생산할 예정이니 앞으로 우리와의 경제협력은 긴밀할 수 밖에 없다.
하기야 IMF이후 도산한 쌍룡자동차를 중국에 이어 다시 인도의 마힌드라그룹이 인수해 살려가고 있느니 우리와의 경제 관계를 실감할 수 있다. 알록교수는 지난 20년간 한국이 인도에 투자한 돈보다 지난6년간 인도가 한국에 투자한 돈이 더 많다며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속에 이번에는 어느때보다 모디총리가 환대를 받았다. 더구나 처음으로 인도와 한국의 옛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띄웠다.
모디총리는 18일 오후 청와대 만찬장에서 한 인도간의 ‘각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2000년전 가야국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왕비 허왕후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허왕후 기록을 시집을 보낸 친정가족이 ‘인도의 아요디아공주 허황옥(인도명 슈리라트라)’이라고 확인해준 셈이다. 모디총리는 더 나가 한국인들중에 적어도 10%정도는 인도와 연관된 혈통이라는 주장도 폈다. 지금도 김해지방에서는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남방계 ‘거문이’라고 라고 놀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모디총리는 개인적으로 자기의 지역구인 베나라스가 통일신라와 당나라시대 4년간 인도여행을 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둔황의 막고굴에 남긴 혜초스님(704-787)이 다녀간 곳이라는 인연도 강조했다. 이런 인연에 더해 지금 인도인들은 ‘한국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한국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한국 컴퓨터를 키고 한국 TV로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인들의 일상에 한국에 그만치 깊게 들어와 있어 한국도 인도를 더 가깝게 해달라는 주문이었을 것이다.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 인천 양천 허씨의 시조인 허왕후. 장남은 아버지성인 김해김씨가 됐고 차남 삼남은 엄마성을 따랐다는 것만 봐도 허왕후의 존재가 특별했던 모양이다. 800여만명으로 한국성씨중 최대인 김해김씨가 아직도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의 양천허씨등과 통혼을 안하는 것만봐도 적어도 인구의 5분1정도는 지난 2000년동안 이 전설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허왕후가 인도에서 시집왔다는 기록에 대해 반론도 꽤 있다. 김수로왕이 허왕후가 바다로 왔을 때 환영나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혼사가 오갔다는 것이고 이는 인도가 아닌 가까운 중국쪽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김해의 장유사를 세운 장유화상이 허왕후와 함께온 오빠라는데 집안이 함께 왔다는 것은 망명객이나 표류만이 아니었을까하는 반론이다. 어쨋든 불교의 발상지로 우리 정신문화의 원류인 인도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