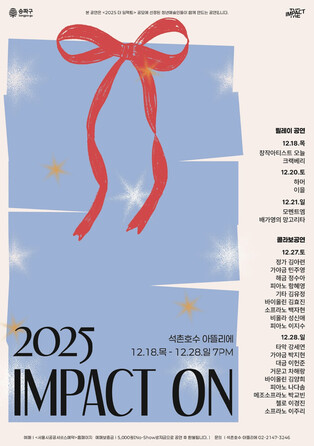|
||
| ▲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 ||
이미 여름이 왔다. 우리는 보통 3,4,5월을 봄으로 아는데 양력 5월초인 6일이 입하였으니 초여름인 것이다. 5월 하순 서울의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것도 이상기온이라 하기 어렵다. 21일은 8번째 절기인 소만(小滿). 기온이 더워지면서 산과 들의 모든 만물이 쑥쑥자라 녹음이 짙어진다는 뜻이다. 그래도 아침저녁으론 추워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입하물에 써래싣고 나온다“는 빨리 논모내기 준비를 하라는 속담이 있지만 ”소만바람에 설늙은이 얼어죽는다“는 어른들의 건강조심 경구도 있다.
경기지방의 농요인 농가월령가 4월령(음력)은 “4월이라 맹하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떡갈잎 펴질 때에 뻐꾹새 자주 울고 보리이삭 피어나니 꾀꼬리 소리한다”고 읊었다. 요즘 숲이 우거져 뻐꾸기 우는 소리는 어디서나 자주 듣는다. 그러나 5월초 중국남부 베트남 등지에서 날아오는 여름 철새인 꾀꼬리는 송충이 메뚜기 매미유충등 먹이가 농약오염 등으로 줄어들면서 ‘꾀꼬리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졌다.
농가월령가에는 이즈음 농촌의 바쁜 모양을 “남녀노소 골몰하여 집에 있을 틈이 없고 적막한 대사립을 녹음에 닫았도다” 라고 읊었다. 보리가 익으면 6월6일 망동(芒種)전에 베어야하고 여기에 물대어 벼농사를 지어야한다. 망종이란 말자체가 볍씨로 모를 키워 모내기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충청 호남 영남 소위 ‘삼남지방’의 북쪽인 경기지방부터는 겨울 추위에 보리, 밀농사를 잘안돼 논물을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4월령에도 보리농사나 ‘보릿고개’에 대한 언급이 적다. 대신 면화 수수 녹두 참깨심기 누에치기 벌통분가 등을 권했다.
지난25일 석가탄신일 연휴에 고향인 충북 영동을 다녀왔다. 오랜만에 고향의 봄을 맞았다. 5월 하순이라 초등학교때 황간집에서 보던 모내기를 구경할 기대를 했다. 근데 이젠 논밖 양쪽에서 노끈과 새끼줄을 늘여잡고 “어여이! 다음..”하던 두레 모내기는 없어졌다. 논이 반듯반듯 직사각형으로 정리돼 어떤 논은 이미 모가 심어져 있다. 4월령에 “갈대꺾어 거름할제 풀베어 섞어하소. 무논을 써을이고 이른 모 내어보세”는 이제 트랙터 혼자 다한다. 써래질부터 모심기도 트랙터 운전사 혼자 다 한다.
새벽 어스름 5시반쯤 일어났는데 멀리서 기계소리가 들렸다. 경운기 소리려니 하고 나가 보니 논에서 트랙터가 돌아다녔다. 어릴 적 봤던 물댄 논에 쇠창살 같은 써래로 바닥을 고르던 작업이다. 트랙터가 논에서 뒤에 큰 써래를 달고 왔다 갔다 한다. 30분정도에 큰 논이 가지런히 정리됐다. 이제 경운기는 작은 밭일이나 농작물의 이동수단 정도로만 이용하고 논농사는 트랙터 주인과 연간 계약해 모내기부터 농약치기, 추수까지 해서 햅쌀로 받는다.
놀라왔다. 초등학교때는 집논에 모내기를 하는 날엔 아침부터 돼지나 닭 오리 등을 잡아 마당가 가마솥에 얼큰하게 매운탕을 끓였다. 여기에 산초 후추등 양념을 많이 해서인지 탕에서 나는 센 김에서 고춧가루냄새보다 좀 더 매캐한 후추냄새가 풍겼다. 수업중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릴 리가 만무. 빨리 끝나고 모내기 줄 잡아주고 싶어 안달이었다. 모내기철에는 하루 이틀 학교를 쉬기도 했고 단체로 지원나가기도 했다. 배고픈 보릿고개시절 논두렁에서 얻어 먹던 국수나 보리밥등 ‘새참’맛이 꿀맛이었다.
방과후 빨리 집에 돌아와 가방을 마루에 던져놓고 우리 논으로 달렸다. 오후 3시경 엄마가 가져오시는 매운탕 새참을 먹고파 열심히 줄을 들었다 놨다 했다. 그때 먹었던 뻘건 국밥을 우리는 모두 ‘개장국’이라 했다. 개고기건 돼지고기건 우리 집에서 키우던 거위를 잡든 모두 벌겋게 끓여 무슨 고기인지도 몰랐다. 고기같이 잘근잘근 씹히던 것이 토란줄기 말린 거였다는 것을 대학 때 고향에 가서야 처음 알았다.
어릴 때는 토란은 뿌리가 아니라 줄기만 먹는 줄 알았다. 중학 때부터 서울에 유학와 5월 단오께 친구집서 밥을 먹을 때 국에 감자같이 생겼는데 미끌미끌한 것이 입에 설어 친구에게 뭐냐고 물었더니 토란뿌리란다. 달콤한 고구마도 아닌 것이 실팍한 감자도 아닌 것이 참 요상하게 생겼다. 어쩜 시골 담벼락에서 자라던 돼지감자에 가까웠다. 돼지감자 줄기가 감자보다 훨씬 키가 크다는 것도 서울에 와서 알았다. ‘서울촌놈’이 된 것이다.
기계농이라 돈만 있으면 논농사는 쉽다. 쌀은 별로 돈도 안된다. 대신 돈 되는 밭작물이 손이 많이 간다. 고향 영동엔 전통 곶감과 호두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포도가 주산물이다. 한창 블루메리가 유행하고 있지만 아직 상품화는 힘들고 오히려 옥천의 묘목장사가 큰 돈을 벌었단다. 절대농지였던 평지의 논이 절반정도 포도밭으로 바뀌고 산록의 자갈밭은 인삼을 많이 심는다. 이번에는 친척집 포도밭에 일손이 달려 도와주러 갔다. 포도순이 한창이어 한 나무에 2,3개 달린 포도열매의 어린 떨기중 하나만 남기고 다른 열매를 솎아주는 일이다.
이게 쉽지 않았다. 보통 제일 먼저 나온 포도떨기만 살리고 나머지는 ‘눈물을 머금고’ 잘라냈다. 60년대 처음 포도밭이 생길때는 미국종인 캠벨이 한 나무에 5-6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미역감다가 한두송이 포도서리를 해도 표가 안났다. 이젠 와인용으로 당도가 높고 송이도 큰 머루포도(MBA:머스킷 베일리 A)를 심어 한 송이만 남기는 것이다. 전에는 먹기도 어려웠는데 이젠 와인용으로 한 송이만 남기다니. 그 한 송이도 제일 먼저난 순이 굵어진 ‘육손이’도 잘라낸다. 햇볕을 많이받은 육손이가 본가지보다 더 굵은 것도 있다. 똑똑한 놈 하나 얻으려고 다른 곁가지들은 다 쳐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